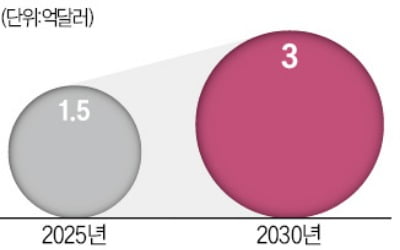[취재여록] 짧지만 인상깊은 사업설명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바이엘세원"이란 회사의 출범식이 최근 부산 호텔롯데에서 열렸다.
세계적인 화학업체 바이엘이 국내의 세원기업을 인수한 뒤 새출발을 다짐하는 행사였다.
바이엘세원은 방음벽 방탄유리 등의 재료인 폴리카보네이트 시트를 만드는 업체.
행사장에는 바이엘의 본거지인 독일의 기업인을 비롯해 이탈리아 일본 그리고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처 대표 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
저녁 7시 정각이 되자 하영준 바이엘세원 사장의 간단한 인사말이 있었다.
이어 마르코스 고메즈 바이엘코리아 사장과 독일에서 온 칼 하인즈 비부쉬 바이엘그룹 플라스틱 사업책임자의 강연이 있었다.
이런 출범식에서는 전형적인 인사말이 있게 마련이다.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선 기술개발과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어..." 등등.
하지만 바이엘 관계자들의 강연은 달랐다.
대형화면에 투시된 도표를 통해 사업내용과 목표를 설명했다.
이사회 구성과 사업분야, 비즈니스지역 등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전세계에 2백30개 기업과 12만명의 종업원을 두고 1만개 품목을 생산하는 바이엘이 왜 한국의 조그만 업체인 세원기업을 인수했는지도 설명했다.
이들 2명이 바이엘의 세계전략과 사업계획, 한국에서의 사업구상을 설명하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20분.
국내외 거래업체들은 이 시간안에 바이엘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
간단 명료한 프리젠테이션의 전형이었다.
이런 형태의 설명은 바이엘뿐 아니라 다국적기업이나 선진국 관료들의 애용 수법.
지난해 중소기업국제회의(ISBC)가 열린 토론토에서도 캐나다 상공부장관은 1천여명의 각국 대표를 모아놓고 의례적인 환영인사를 생략한 채 짧은 시간안에 자국의 중소기업지원제도, 외국인투자시 유인책 등을 명쾌하게 설명해 갈채를 받았다.
반면 한국 중국 등 아시아권 국가에서는 갈수록 행사는 길고 연설내용은 두루뭉수리다.
연설자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한다.
듣는 사람은 오랜 시간 경청해도 정작 중요한 사업내용과 방향은 알 수 없다.
국제경쟁력의 격차는 이런 작은 차이에서부터 벌어지는게 아닐까.
김낙훈 벤처중기부 기자 nhk@hankyung.com
세계적인 화학업체 바이엘이 국내의 세원기업을 인수한 뒤 새출발을 다짐하는 행사였다.
바이엘세원은 방음벽 방탄유리 등의 재료인 폴리카보네이트 시트를 만드는 업체.
행사장에는 바이엘의 본거지인 독일의 기업인을 비롯해 이탈리아 일본 그리고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처 대표 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
저녁 7시 정각이 되자 하영준 바이엘세원 사장의 간단한 인사말이 있었다.
이어 마르코스 고메즈 바이엘코리아 사장과 독일에서 온 칼 하인즈 비부쉬 바이엘그룹 플라스틱 사업책임자의 강연이 있었다.
이런 출범식에서는 전형적인 인사말이 있게 마련이다.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선 기술개발과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어..." 등등.
하지만 바이엘 관계자들의 강연은 달랐다.
대형화면에 투시된 도표를 통해 사업내용과 목표를 설명했다.
이사회 구성과 사업분야, 비즈니스지역 등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전세계에 2백30개 기업과 12만명의 종업원을 두고 1만개 품목을 생산하는 바이엘이 왜 한국의 조그만 업체인 세원기업을 인수했는지도 설명했다.
이들 2명이 바이엘의 세계전략과 사업계획, 한국에서의 사업구상을 설명하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20분.
국내외 거래업체들은 이 시간안에 바이엘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
간단 명료한 프리젠테이션의 전형이었다.
이런 형태의 설명은 바이엘뿐 아니라 다국적기업이나 선진국 관료들의 애용 수법.
지난해 중소기업국제회의(ISBC)가 열린 토론토에서도 캐나다 상공부장관은 1천여명의 각국 대표를 모아놓고 의례적인 환영인사를 생략한 채 짧은 시간안에 자국의 중소기업지원제도, 외국인투자시 유인책 등을 명쾌하게 설명해 갈채를 받았다.
반면 한국 중국 등 아시아권 국가에서는 갈수록 행사는 길고 연설내용은 두루뭉수리다.
연설자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한다.
듣는 사람은 오랜 시간 경청해도 정작 중요한 사업내용과 방향은 알 수 없다.
국제경쟁력의 격차는 이런 작은 차이에서부터 벌어지는게 아닐까.
김낙훈 벤처중기부 기자 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