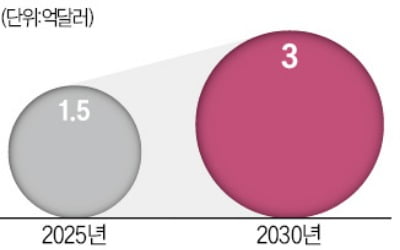[특파원코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인터넷 은행"들의 몰락 인터넷은행들이 몰락하고 있다.
이들의 강력한 도전에 직면한 기존 "대형은행(Big Brother)"들이 설자리를 잃고 무너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었다.
하지만 3년도 못돼 그같은 시나리오가 환상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깡통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인터넷은행들은 기존은행에 붙어 더부살이를 하거나 아니면 경쟁력이 있는 부문(niche)을 새롭게 파고들어,꺼져가는 목숨을 부지해야하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해가고 있다.
온라인으로 묶여있는 이 인터넷은행들의 최대 장점은 지점을 둘 필요가 없다는 점이었다.
지점이 없으면 건물,직원,시설 비용이 필요없다.
여기서 생기는 여유자금으로 고객들의 예금이자를 높여주거나 대출이자를 깎아주면 고객은 저절로 생길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희망이었다.
그러나 고객들은 예상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고 장사가 머리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었다.
넷뱅크(Net.Bank Inc)는 설립초기 광고비로 무려 7백만달러를 쏟아 부었다.
하지만 넷뱅크가 확보한 고객은 10만4천명에 불과했다.
미국의 대표적 은행의 하나인 뱅크원은 윙스팬(Wingspan)이라는 온라인 은행을 설립했지만 끌어들인 구좌는 14만4천개에 그쳤다.
대부분의 미국은행들은 고객들이 컴퓨터로 자기계정을 관리할 수 있는 이른바 PC뱅킹 체제를 갖추고 있다.
웰스파고은행의 자체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고객은 2백만에 이르고 뱅크원의 자체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고객 숫자도 50만에 이르는 것에 비하면 인터넷은행의 실상은 속빈강정에 불과하다.
인터넷은행들이 기존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제시하는데도 손님이 꼬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대답은 간단하다.
인터넷은행들은 고객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기때문이다.
은행거래를 하다 문제가 생기면 기존은행 고객들은 지점을 찾으면 그만이었다.
그렇지만 인터넷은행 고객들은 컴퓨터를 상대해야 한다.
컴퓨터의 문제해결속도가 빠를 때도 있지만 고객에 따라 천차만별인 문제를 컴퓨터가 모두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당연한 귀결이지만 인터넷은행을 자기의 주거래 은행으로 생각하고 있는 고객은 1%도 안된다.
목석같은 컴퓨터를 상대하는 것만큼 맥빠지고 재미없는 일도 없다.
컴퓨터는 똑같은 우편물을 보내고 또 보내기도 한다.
USA뱅크셰어즈닷컴(USABancShares.com)의 한 고객은 예금쪽지를 받는데 무려 4개월이나 걸렸다고 불평하고 있다.
고객 E메일이 유실되거나 함흥차사가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결국 고객들은 높은 이자대신 질 좋은 서비스를 포기해야 한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인식이 고객의 머리속에 자리잡는다.
이런 상황을 반영,대표적 온라인은행의 하나인 텔레뱅크는 지난 1월 깃발을 내리고 E*트레이드에 합병됐다.
텔레뱅크를 사면서 E*트레이드는 현금자동지급기(ATM)를 8천개나 사들였다.
지점망을 보완하자는 취지였다.
또 다른 인터넷은행인 엑스닷컴(X.com)은 지난 4월 페이팔닷컴(PayPal.com)에 합병되면서 은행업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송금업무만 취급하기로 전략을 바꿨다.
컴퓨뱅크(CompuBank)는 아예 은행이 아닌 GE등과의 제휴를 시도하고 있다.
살아남기 위해 광고비를 삭감하고 있으며 예금이자도 크게 내려 지급하고 있다.
반면 설 땅이 없을 거라던 기존 은행들의 입지는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업무제휴를 하자며 손을 내미는 곳도 많다.
2천3백만의 고객을 가진 아메리카온라인(AOL)이 시티그룹과 손을 잡았고,e베이는 웰스파고은행와 제휴했다.
세상의 모든 물건에는 다 제 값이 있는 모양이다.
워싱턴 특파원 양봉진 www.bjGlobal.com
이들의 강력한 도전에 직면한 기존 "대형은행(Big Brother)"들이 설자리를 잃고 무너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었다.
하지만 3년도 못돼 그같은 시나리오가 환상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깡통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인터넷은행들은 기존은행에 붙어 더부살이를 하거나 아니면 경쟁력이 있는 부문(niche)을 새롭게 파고들어,꺼져가는 목숨을 부지해야하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해가고 있다.
온라인으로 묶여있는 이 인터넷은행들의 최대 장점은 지점을 둘 필요가 없다는 점이었다.
지점이 없으면 건물,직원,시설 비용이 필요없다.
여기서 생기는 여유자금으로 고객들의 예금이자를 높여주거나 대출이자를 깎아주면 고객은 저절로 생길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희망이었다.
그러나 고객들은 예상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고 장사가 머리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었다.
넷뱅크(Net.Bank Inc)는 설립초기 광고비로 무려 7백만달러를 쏟아 부었다.
하지만 넷뱅크가 확보한 고객은 10만4천명에 불과했다.
미국의 대표적 은행의 하나인 뱅크원은 윙스팬(Wingspan)이라는 온라인 은행을 설립했지만 끌어들인 구좌는 14만4천개에 그쳤다.
대부분의 미국은행들은 고객들이 컴퓨터로 자기계정을 관리할 수 있는 이른바 PC뱅킹 체제를 갖추고 있다.
웰스파고은행의 자체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고객은 2백만에 이르고 뱅크원의 자체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고객 숫자도 50만에 이르는 것에 비하면 인터넷은행의 실상은 속빈강정에 불과하다.
인터넷은행들이 기존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제시하는데도 손님이 꼬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대답은 간단하다.
인터넷은행들은 고객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기때문이다.
은행거래를 하다 문제가 생기면 기존은행 고객들은 지점을 찾으면 그만이었다.
그렇지만 인터넷은행 고객들은 컴퓨터를 상대해야 한다.
컴퓨터의 문제해결속도가 빠를 때도 있지만 고객에 따라 천차만별인 문제를 컴퓨터가 모두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당연한 귀결이지만 인터넷은행을 자기의 주거래 은행으로 생각하고 있는 고객은 1%도 안된다.
목석같은 컴퓨터를 상대하는 것만큼 맥빠지고 재미없는 일도 없다.
컴퓨터는 똑같은 우편물을 보내고 또 보내기도 한다.
USA뱅크셰어즈닷컴(USABancShares.com)의 한 고객은 예금쪽지를 받는데 무려 4개월이나 걸렸다고 불평하고 있다.
고객 E메일이 유실되거나 함흥차사가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결국 고객들은 높은 이자대신 질 좋은 서비스를 포기해야 한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인식이 고객의 머리속에 자리잡는다.
이런 상황을 반영,대표적 온라인은행의 하나인 텔레뱅크는 지난 1월 깃발을 내리고 E*트레이드에 합병됐다.
텔레뱅크를 사면서 E*트레이드는 현금자동지급기(ATM)를 8천개나 사들였다.
지점망을 보완하자는 취지였다.
또 다른 인터넷은행인 엑스닷컴(X.com)은 지난 4월 페이팔닷컴(PayPal.com)에 합병되면서 은행업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송금업무만 취급하기로 전략을 바꿨다.
컴퓨뱅크(CompuBank)는 아예 은행이 아닌 GE등과의 제휴를 시도하고 있다.
살아남기 위해 광고비를 삭감하고 있으며 예금이자도 크게 내려 지급하고 있다.
반면 설 땅이 없을 거라던 기존 은행들의 입지는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업무제휴를 하자며 손을 내미는 곳도 많다.
2천3백만의 고객을 가진 아메리카온라인(AOL)이 시티그룹과 손을 잡았고,e베이는 웰스파고은행와 제휴했다.
세상의 모든 물건에는 다 제 값이 있는 모양이다.
워싱턴 특파원 양봉진 www.bjGlob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