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 '민둥산'] 억새 누운자리 은빛물결 '출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선길은 두번째다.
지난 여름 산행을 위해 다녀갔다.
길가 풍경이 많이 달라졌다.
계곡의 드셌던 녹음은 기운을 잃었다.
뭉턱뭉턱 단풍이 번지고 있다.
수직의 검은 암벽에 매달린 넝쿨은 유난히 빨간색을 뽐내고 있다.
오대천 래프팅족의 기합소리는 뒤늦은 가을걷이의 분주함과 기계음으로 바뀌었다.
눈부신 가을햇살,정선으로 향하는 길은 계절의 그 영근 속살을 내보였다.
일행도 달라졌다.
유치원 다니는 꼬맹이 둘도 함께 했다.
모처럼만의 가족산행."깊은 산 속"에 간다며 내내 조잘대는 두 아이의 목소리가 차창밖 공기만큼이나 싱그러웠다.
정선 남면의 민둥산.억새로 유명한 해발 1천1백18m의 고지.가족산행에 안성맞춤이라지만 아이들이 그 높이를 감당할수 있을까.
어른도 버거워한다는 깔딱고개가 있는 증산초등학교쪽 들머리는 제껴두었다.
대신 능전마을에서 윗발구덕까지 차로 올랐다.
왕복 1차선의 시멘트포장길.맞은편 차를 맞닥뜨리면 당황할 정도로 좁지만 서로 비켜줄 공간을 두어 불가능한 오름길은 아니다.
야채박스를 실은 5t트럭을 내려보내며 한참을 돌아 닿은 윗발구덕 마을의 주차장.초로의 숙모와 함께 마실거리며 요기거리를 파는 김명순씨가 웃는 낯으로 맞았다.
"애들도 문제없어요" 산행안내판에는 해발 8백50m,정상까지 35분이라고 적혀있다.
들머리의 붉은 땅은 가을걷이가 끝난 배추밭.크게 움푹 패인 "구뎅이"(구덩이)비탈의 배추밭이 신기했다.
발구덕이란 이름도 생소했다.
"민둥산 기슭엔 윗발구덕마을 같은 큰 구뎅이가 여덟개나 있어요.
팔구뎅이지요. 여덟팔이 "발"로 발음됐고 구뎅이의 "구덕"이 합해져 발구덕이라 부르게 됐답니다"(민둥산억새풀축제추진위원회 나원랑 사무국장) 이쪽 산행로는 말대로 수월했다.
내내 오르막이어서 숨이 찰법도 한데 아이들이 저만치 앞섰다.
정상 50m 전쯤.산의 모습이 확 달라졌다.
몸을 가려주던 나무 자리를 억새가 대신했다.
산불감시초소가 서 있는 정상에서 본 풍광은 경이로웠다.
증산초등학교쪽 능선,반대편의 지억산쪽 능선 저 너머까지 억새의 누릇한 은빛 색채로 물결쳤다.
억새 대롱끝 솜털부분에 부딪쳐 잘게 부서진 오후의 햇살은 눈이 부실지경이었다.
민둥산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은 아직 검푸른 상태.은빛 갑옷을 고집하는 민둥산만이 유난히 튀었다.
돌연변이 아니면 "미운 오리새끼"쯤으로 여길수 밖에 없는 모습이었다.
화전민들이 해마다 불을 질러서,산에 형성된 거대한 굴 때문에 정상부근 땅의 온도가 낮아져 큰 나무가 자랄수 없다는 등의 설명은 어느새 머리밖으로 밀려나 있었다.
오직 느낌만으로 풍족했다.
가리마를 탄 것 처럼 오솔길이 잘 나 있는 증산초등학교쪽 능선으로 발을 내디뎠다.
이 편의 억새가 으뜸이다.
어른키만한 억새가 몰려 있는 곳 마다 둥그런 자리가 나 있었다.
젊은 연인들이 밀어를 나눈 곳인 듯 했다.
하도 미끄러워 몇번쯤 엉덩방아를 찧었을게 틀림없었을 것이란 생각에 묘한 웃음이 밀려왔다.
가수 고복수가 불렀던 노래 "짝사랑"이 생각났다.
바람이 없어 그 노랫말속의 "으악새"(억새의 경기도 사투리)는 보지 못했다.
다시 정상으로 발을 옮겼다.
정상표석 앞에서 아이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야호~" 오는 길에 정선아리랑의 발생지라는 거칠현마을을 거쳐 아우라지에 들렸다.
지난해부터 줄배의 줄을 잡았다는 이강산씨.물이 불어 만나지 못한 채 뗏목타고 한양 간 님을 기다리다 강물에 뛰어든 수줍은 처녀,그 뒤로 배만 띄우면 뒤집어 졌다는 얘기를 술술 풀어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뭐든 물어보라는 이씨에게 청하기만 하면 정선아리랑 한대목을 들을수 있을 것 같았다.
글=김재일 기자 kjil@hankyung.com
지난 여름 산행을 위해 다녀갔다.
길가 풍경이 많이 달라졌다.
계곡의 드셌던 녹음은 기운을 잃었다.
뭉턱뭉턱 단풍이 번지고 있다.
수직의 검은 암벽에 매달린 넝쿨은 유난히 빨간색을 뽐내고 있다.
오대천 래프팅족의 기합소리는 뒤늦은 가을걷이의 분주함과 기계음으로 바뀌었다.
눈부신 가을햇살,정선으로 향하는 길은 계절의 그 영근 속살을 내보였다.
일행도 달라졌다.
유치원 다니는 꼬맹이 둘도 함께 했다.
모처럼만의 가족산행."깊은 산 속"에 간다며 내내 조잘대는 두 아이의 목소리가 차창밖 공기만큼이나 싱그러웠다.
정선 남면의 민둥산.억새로 유명한 해발 1천1백18m의 고지.가족산행에 안성맞춤이라지만 아이들이 그 높이를 감당할수 있을까.
어른도 버거워한다는 깔딱고개가 있는 증산초등학교쪽 들머리는 제껴두었다.
대신 능전마을에서 윗발구덕까지 차로 올랐다.
왕복 1차선의 시멘트포장길.맞은편 차를 맞닥뜨리면 당황할 정도로 좁지만 서로 비켜줄 공간을 두어 불가능한 오름길은 아니다.
야채박스를 실은 5t트럭을 내려보내며 한참을 돌아 닿은 윗발구덕 마을의 주차장.초로의 숙모와 함께 마실거리며 요기거리를 파는 김명순씨가 웃는 낯으로 맞았다.
"애들도 문제없어요" 산행안내판에는 해발 8백50m,정상까지 35분이라고 적혀있다.
들머리의 붉은 땅은 가을걷이가 끝난 배추밭.크게 움푹 패인 "구뎅이"(구덩이)비탈의 배추밭이 신기했다.
발구덕이란 이름도 생소했다.
"민둥산 기슭엔 윗발구덕마을 같은 큰 구뎅이가 여덟개나 있어요.
팔구뎅이지요. 여덟팔이 "발"로 발음됐고 구뎅이의 "구덕"이 합해져 발구덕이라 부르게 됐답니다"(민둥산억새풀축제추진위원회 나원랑 사무국장) 이쪽 산행로는 말대로 수월했다.
내내 오르막이어서 숨이 찰법도 한데 아이들이 저만치 앞섰다.
정상 50m 전쯤.산의 모습이 확 달라졌다.
몸을 가려주던 나무 자리를 억새가 대신했다.
산불감시초소가 서 있는 정상에서 본 풍광은 경이로웠다.
증산초등학교쪽 능선,반대편의 지억산쪽 능선 저 너머까지 억새의 누릇한 은빛 색채로 물결쳤다.
억새 대롱끝 솜털부분에 부딪쳐 잘게 부서진 오후의 햇살은 눈이 부실지경이었다.
민둥산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은 아직 검푸른 상태.은빛 갑옷을 고집하는 민둥산만이 유난히 튀었다.
돌연변이 아니면 "미운 오리새끼"쯤으로 여길수 밖에 없는 모습이었다.
화전민들이 해마다 불을 질러서,산에 형성된 거대한 굴 때문에 정상부근 땅의 온도가 낮아져 큰 나무가 자랄수 없다는 등의 설명은 어느새 머리밖으로 밀려나 있었다.
오직 느낌만으로 풍족했다.
가리마를 탄 것 처럼 오솔길이 잘 나 있는 증산초등학교쪽 능선으로 발을 내디뎠다.
이 편의 억새가 으뜸이다.
어른키만한 억새가 몰려 있는 곳 마다 둥그런 자리가 나 있었다.
젊은 연인들이 밀어를 나눈 곳인 듯 했다.
하도 미끄러워 몇번쯤 엉덩방아를 찧었을게 틀림없었을 것이란 생각에 묘한 웃음이 밀려왔다.
가수 고복수가 불렀던 노래 "짝사랑"이 생각났다.
바람이 없어 그 노랫말속의 "으악새"(억새의 경기도 사투리)는 보지 못했다.
다시 정상으로 발을 옮겼다.
정상표석 앞에서 아이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야호~" 오는 길에 정선아리랑의 발생지라는 거칠현마을을 거쳐 아우라지에 들렸다.
지난해부터 줄배의 줄을 잡았다는 이강산씨.물이 불어 만나지 못한 채 뗏목타고 한양 간 님을 기다리다 강물에 뛰어든 수줍은 처녀,그 뒤로 배만 띄우면 뒤집어 졌다는 얘기를 술술 풀어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뭐든 물어보라는 이씨에게 청하기만 하면 정선아리랑 한대목을 들을수 있을 것 같았다.
글=김재일 기자 kjil@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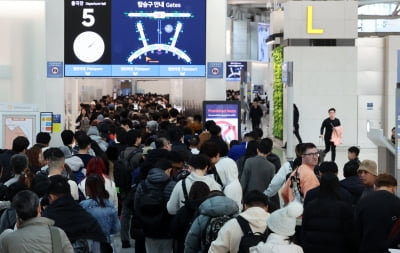
![[포토] '제31회 대관령눈꽃축제' 개막](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1.39317796.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