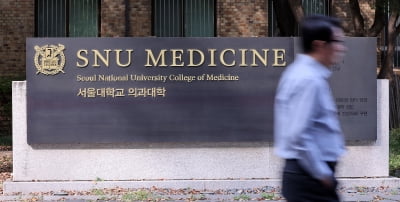보험은 이제까지 연고에 따라 마지못해 가입하는 상품쯤으로 여겨져왔던게 사실이다.
아직도 그같은 경향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보험가입은 늘지만 상품을 제대로 알고 가입하는 계약자는 30%에 불과하다는 얘기도 나왔다.
그러나 최근들어선 보험을 토털 재무설계의 한 수단으로 간주하는 분위기도 싹트고 있다.
달라진 모습이다.
계약자가 노트북을 든 설계사를 만나 재무설계를 하는 광경은 더이상 새롭지 않다.
보험을 불의의 위험에 대비한 미래의 안전장치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그 덕분일까.
보험을 들었다가 1년도 안돼 해약하는 사태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계약자들이 보험가입후 1년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를 보여주는 13회차 계약유지율의 경우 1998 회계연도에 54%였다가 지난해엔 63.9%로 껑충 뛰었다.
생명보험회사들도 계약자들의 이같은 인식 변화에 맞춰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인게 종신보험이다.
선진국의 경우 종신보험은 평생 재무설계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상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종의 맞춤형 상품이다.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가정의 가치가 부각될수록 선호받는 상품이다.
그럼에도 한국에선 그동안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푸르덴셜 ING 메트라이프생명 등 일부 외국계 생보사들이 전유물처럼 팔아왔다.
보험료도 비쌌기 때문에 서민들은 선뜻 가입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지난 4월 보험가격 자유화가 시행된 이후 삼성 대한 등 국내 생보사들이 보험료를 인하한 종신보험 상품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이 상품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국내 생보사들은 기존 설계사 조직을 통해서도 종신보험을 파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펴고 있다.
월 보험료 10만원 미만의 저렴한 상품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종신보험의 대중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질병보험에 대한 관심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한때는 암보험이 유행을 탔지만 암뿐만 아니라 뇌졸중 등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함께 보장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질병보험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사망원인 통계가 있는 21개국과 비교할 경우 한국의 호흡기 결핵은 가장 높고 간암은 일본 다음으로 높다.
질병보험의 인기는 갈수록 높아지는 건강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암에는 돈이 약"이라는 모 생보사의 광고카피도 있듯이 질병위험은 미리 방어하는게 중요하다.
또 다른 형태의 재무설계가 필요한 까닭이다.
이같은 분위기에 맞춰 질병보험 상품도 점차 세분화되고 있다.
일부 생보사들은 건강한 사람 및 비흡연자에 대한 우대특약을 신설,보험료를 20~30% 깎아주기도 한다.
또 일부 질병만이 아니라 모든 질병을 보장해 주는 상품도 나왔다.
종신보험과 질병보험 외에 요즘 주목을 받는 상품으로는 저축성 보험이 있다.
사실 저축성 보험은 뒷전으로 밀려있다시피 했지만 금융환경이 급변하면서 다시 인기몰이에 나서고 있다.
저축성 보험상품엔 뭉칫돈들이 유입되고 있다.
2000 회계연도 1분기인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석달동안 생보사들은 일시납 방식으로 2조8천8백5억원의 저축성 보험료를 거둬들였다.
이는 이 기간에 생보사들의 전체 수입보험료 11조2천9백90억원의 25.2%에 해당하는 규모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회피하려는 자금들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기 5년 이상 저축성보험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상품들이 보험계약자들의 니즈를 모두 충족해 주는 것은 아니다.
갈수록 자산운용에 대한 욕구가 커지지만 보험사엔 아직 이를 수용할 마땅한 상품이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달라질 것 같다.
내년초엔 투자형 보험상품인 변액보험이 선보인다.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투자.운용된 성과를 계약자의 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보험으로 회사의 투자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하는 상품.
인플레이션에 대비해 보험금의 실질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변액보험까지 나오면 보험계약자들은 지금에 비해 보다 충실하게 재무설계를 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보장 저축 투자를 모두 염두에 두고 보험상품을 고르는게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생활필수품처럼 돼버린 보험.
이제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만 남았다.
이성태.오상헌 기자 steel@hankyung.com


![300억 투자하더니…"운전 너무 편해" 비장의 무기 내세운 車 [신차털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8862437.3.gif)




![[르포] '윤석열' 지우는 대구 서문시장…"尹 욕하는게 싫어 사진 뗐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ZK.38878876.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