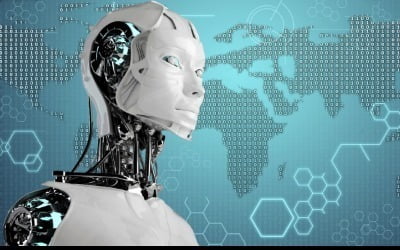그리고 어느 신문에서는 총 활동 계좌가 8백만 남짓하다는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난다.
한 사람이 여러 계좌를 가진 경우가 있어 두 수치에 차이가 있는 듯 싶다.
그러면 지난 20여 년간 방치, 폐쇄된 것들까지 다 합하면 총 몇 계좌나 될까?
지금 활동 중인 게 8백만이니 누적으로는 천만 개는 족히 될 것이다.
그런데 열이면 여덟, 아홉이 잃었다 하니 계좌마다 평균적으로 마이너스임이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계좌당 평균 손실액은 과연 얼마나 될까?
개인, 법인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지만 5백만원으로 한 번 잡아 보자.
만일 실제 그 정도라면 총 주식투자 손실액이 5십조(兆)라는 말이다.
5백만원 곱하기 천만 계좌 하면 5십조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순간, 투자자들은 눈이 휘둥그레진다.
연이어 나오는 질문이 그러면 그 많은 돈이 다 어디로 갔느냐?
종합지수는 80년에 비해 다섯 배 올랐고, 코스닥은 96년에 비해 20%밖에 안 빠졌으니 평균적으로 벌었어야 맞는 것 아니냐?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는 것이다.
오늘은 간단한 모델을 통해 이 수수께끼를 풀어 드리려 한다.
A와 B 두 회사가 있다.
3년 전에 둘 다 공히 자본금 50억원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각각 액면가 5천원짜리 주식 백만 주씩을 발행해서 말이다.
그리고 마침 이 때부터 주가지수 산출이 시작돼 시가총액 1백억원에 지수는 100이었다.
1년 후, 각 회사 주가가 두 배로 올라 시가총액은 2백억원, 지수는 200이 됐다.
그런데 이 때 자본금 1천억원의 C 회사 주식이 상장됐다.
액면가 5천원에 주수는 2천만 주다.
따라서 지수는 여전히 200인 반면, 시가총액은 1천 2백억원으로 늘었다.
이로부터 1년, A와 B는 주가 변동이 없었는데 C는 주가가 1만1천원이 됐다.
따라서 시가총액이 1천 2백억원에서 2천 4백억원으로 증가해 지수는 200에서 400으로 뛰었다.
그런데 이 때 C 회사가 9천원에 100%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따라서 증시에는 1천 8백억원이 더 들어왔고, C의 주가는 1만1천원에서 1천원이 권리락 돼 1만원이 됐다.
결국 지수는 여전히 400인데 시가총액은 4천 2백억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 1년 사이, A의 주가는 그대로인데 B는 부도가 났고, C는 액면가로 되돌아왔다.
B는 가치가 제로, A는 여전히 1백억원, 그리고 C는 2천억원이 됐다는 말이다.
따라서 시가총액이 2천1백억원으로 반 토막 나면서 지수는 400에서 200으로 빠졌다.
자, 이제 지난 3년을 되돌아보자.
지수는 100에서 200으로 두 배 올랐다.
그런데 그간 주식시장에 갖다 넣은 돈은 총 얼마인가?
A, B 회사에 각각 50억원씩 합이 1백억원이고, C 회사에는 증자까지 합해서 2천 8백억원이다.
총 2천 9백억원이다.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은 얼마인가?
2천1백억원이다.
따라서 지수가 두 배로 뛰는 와중에 총 8백억원의 손실이 난 것이다.
2천 9백억원 투자해서 8백억원 잃었으니 수익률은 계좌당 평균 마이너스 27.6%다.
이제 지수가 상승해도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수수께끼가 풀린 것이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별로 한 번 보자.
이익 난 A 회사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그래도 조금 벌었다.
빠지는 C 회사 주식을 처분한 사람은 고가에 증자를 받았어도 대충 본전은 했다.
투자습관이 올바로 배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누가 다 잃었나?
미련이 남아 추락하는 B 회사 주식을 끝가지 들고 있던 사람, 바닥을 외치면서 내리는 C 회사 주식을 잡은 사람들이다.
투자습관이 잘못 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주식은 지식이나 정보의 싸움이 아니라 투자습관의 싸움인 것이다.
< 김지민 한경머니자문위원.현대증권투자클리닉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