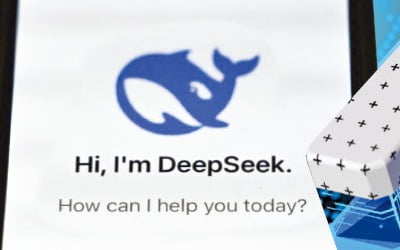['공기업' 이래서 부실 커진다] 33곳 빚만 400兆..개혁은 말로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기업 개혁이 외형적인 실적 맞추기에 급급, 총체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민영화 과정에서 노사간 이면합의가 횡행하는가 하면 인력감축 목표를 맞추기 위해 일정기간뒤 재취업을 보장하면서 명예퇴직을 실시하는 공기업들이 적지 않다.
"노(勞)만 있고 사(使)는 없는 지배구조가 문제"라는 비판은 이래서 나온다.
정치권은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를 ''낙하산''으로 내려보내 공기업 구조개혁을 무색케 하고 있다.
가스공사 같은 공기업에서 공모형식으로 사장을 선임했지만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앞둔 은행을 비롯한 민간기업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정부의 신뢰도도 땅에 떨어지고 있다.
정부가 정한 민영화 대상 11개 공기업 가운데 6일 현재 민영화가 끝난 곳은 포철 국정교과서 KTB네트워크 대한송유관공사 등 네 곳뿐이다.
그나마도 포철을 제외하면 규모가 작은 기업들로 한국전력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한국중공업 등 ''빅6''는 아직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가 공기업개혁의 3대 방향으로 내세운 △민영화 △인력감축 △운영시스템(제도) 개선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인력감축도 형식적으로 흐른다는 지적이다.
기획예산처 집계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 말 현재 공공부문 인력감축은 1만8천명으로 연간 목표치 2만3천명의 80% 가량을 달성했다.
그러나 최근 직원 5백여명을 감축한 담배인삼공사에서 이들에게 1년 후 재고용하거나 자녀들을 대신 취업시켜 주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연말까지 2천명의 감축을 추진중인 한국통신도 지난달부터 희망퇴직을 신청받는 과정에서 퇴직위로금을 높여 달라는 직원들의 요구로 진통을 겪고 있다.
운영시스템을 개선하는 일도 답보상태다.
20개 주요 공기업 1급(처.실장) 1천73자리중 20%를 지난 9월까지 개방형으로 임용케 하겠다던 정부의 방침을 시행한 곳은 아직 없다.
책임지지 않는 경영풍토 때문이다.
공기업들이 방만한 경영으로 적자를 내면 결국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국민들이 부담을 져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가 출자하거나 투자한 33개 주요 공기업이 안고 있는 빚(6월말 현재)은 올해 정부 전체 예산의 4배에 육박하는 3백99조6천억원으로 불어났다.
퇴직금누진제 역시 기획예산처의 독려로 대부분 공기업이 철폐했으나 임금이나 호봉을 올려주는 등으로 뒤에서 보상, 제도도입 취지를 퇴색케 했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한전은 퇴직금누진제를 개선하면서 향후 5년간 미실현 이익에 근거, 3천억원을 사내복지기금으로 출연했다.
퇴직금누진제 개선 대가로 사내복지기금을 출연했거나 개인연금 효도휴가비 등을 지급한 공기업은 28곳에 이른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
민영화 과정에서 노사간 이면합의가 횡행하는가 하면 인력감축 목표를 맞추기 위해 일정기간뒤 재취업을 보장하면서 명예퇴직을 실시하는 공기업들이 적지 않다.
"노(勞)만 있고 사(使)는 없는 지배구조가 문제"라는 비판은 이래서 나온다.
정치권은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를 ''낙하산''으로 내려보내 공기업 구조개혁을 무색케 하고 있다.
가스공사 같은 공기업에서 공모형식으로 사장을 선임했지만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앞둔 은행을 비롯한 민간기업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정부의 신뢰도도 땅에 떨어지고 있다.
정부가 정한 민영화 대상 11개 공기업 가운데 6일 현재 민영화가 끝난 곳은 포철 국정교과서 KTB네트워크 대한송유관공사 등 네 곳뿐이다.
그나마도 포철을 제외하면 규모가 작은 기업들로 한국전력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한국중공업 등 ''빅6''는 아직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가 공기업개혁의 3대 방향으로 내세운 △민영화 △인력감축 △운영시스템(제도) 개선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인력감축도 형식적으로 흐른다는 지적이다.
기획예산처 집계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 말 현재 공공부문 인력감축은 1만8천명으로 연간 목표치 2만3천명의 80% 가량을 달성했다.
그러나 최근 직원 5백여명을 감축한 담배인삼공사에서 이들에게 1년 후 재고용하거나 자녀들을 대신 취업시켜 주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연말까지 2천명의 감축을 추진중인 한국통신도 지난달부터 희망퇴직을 신청받는 과정에서 퇴직위로금을 높여 달라는 직원들의 요구로 진통을 겪고 있다.
운영시스템을 개선하는 일도 답보상태다.
20개 주요 공기업 1급(처.실장) 1천73자리중 20%를 지난 9월까지 개방형으로 임용케 하겠다던 정부의 방침을 시행한 곳은 아직 없다.
책임지지 않는 경영풍토 때문이다.
공기업들이 방만한 경영으로 적자를 내면 결국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국민들이 부담을 져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가 출자하거나 투자한 33개 주요 공기업이 안고 있는 빚(6월말 현재)은 올해 정부 전체 예산의 4배에 육박하는 3백99조6천억원으로 불어났다.
퇴직금누진제 역시 기획예산처의 독려로 대부분 공기업이 철폐했으나 임금이나 호봉을 올려주는 등으로 뒤에서 보상, 제도도입 취지를 퇴색케 했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한전은 퇴직금누진제를 개선하면서 향후 5년간 미실현 이익에 근거, 3천억원을 사내복지기금으로 출연했다.
퇴직금누진제 개선 대가로 사내복지기금을 출연했거나 개인연금 효도휴가비 등을 지급한 공기업은 28곳에 이른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