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한경 소비자 대상 (2)] '불황기 日 소비 트렌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일본경제는 10년째 연 평균 1% 성장이라는 기록적인 장기불황의 늪에 빠져 있다.
2차 대전후 73년 오일쇼크 이전까지 연 평균 9%, 이후 90년대 초까지 5% 내외의 안정 성장이 지속된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저성장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제조기업들이 적자로 전락하는가 하면 다수의 금융기관들은 부도 또는 합병의 아픔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불황의 그늘 속에서도 견실한 흑자경영을 지속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
이들 기업이 만들어낸 히트 상품수 또한 만만치 않다.
이들 기업을 분석해 보면 역으로 불황기 일본의 소비 트렌드를 읽을 수 있다.
첫째, 불황기에 소비자들이 저가 제품으로 기우는 현상이 예외없이 나타났지만 소비자들이 단순히 저가 제품만을 선호한 것은 아니었다.
다이소(大倉)가 운영하는 1백엔숍이 대표적인 사례다.
1백엔숍은 탄생 초기 상품구색과 점포운영 면에서 소비자들에게 크게 어필하지 못했다.
값은 싸지만 제품이 조악하다는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다이소는 90년대 중반 이후 1백만~2백만개 단위의 대량발주에 의해 원가를 절감하고 원가 절감분을 양질의 제품 확대에 투입했다.
또 점포 대형화를 통해 쇼핑의 즐거움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5백엔이면 30분 동안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비즈니스 컨셉이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게 된 것이다.
둘째, 소비자들이 부가가치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물건을 구입한다는 점이다.
가전 자동차 등 비교적 고가의 내구소비재인 경우 가격이 다소 높더라도 새로운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제품이면 인기를 끌었다.
소니의 노트북 컴퓨터 "VAIO"는 대표적 히트 상품.
기존 제품에 없는 참신한 디자인, 획기적인 기능이 없으면 아무리 저가라도 외면당하기 십상이다.
셋째, 소비 계층의 다양화를 들 수 있다.
경제의 성숙화와 인구의 고령화가 동시에 진전되면서 각 소비계층에 적합한 상품 개발이 기업의 과제로 등장했다.
도요타가 최근 20~30대 여성을 타깃으로 내놓은 "윌비", 20~30대 남성을 타깃으로 한 소형 왜건 "비비"는 목표고객을 정확히 겨냥해 성공한 구체적인 사례다.
"포케몬(포켓몬스터)" "키티" 등 캐릭터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한 키즈산업 역시 불황 속에서도 호황을 누렸다.
키즈산업 호황의 비결은 이른바 "6포켓 효과"로 설명된다.
고령화, 핵가족화로 어린이들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3대의 포켓으로부터 나온 돈을 배경으로 왕성한 소비계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욕구가 더욱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가지 예로 지역밀착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호신용금고를 들 수 있다.
신용금고의 영업사원들은 집집마다 방문, 적금을 수령하고 예금증서를 나누어 준다.
예금자들이 신용금고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것이다.
신용금고가 그나마 살아남은 것은 이같은 철저한 서비스 정신과 고객관리에 있었다.
이제 일본의 소비자들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제품의 효용을 따지는 자세로 변화하고 있다.
고도성장기 때처럼 막연히 물건을 만들어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일본기업들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존의 제품을 뛰어 넘는 이단자 같은 기업,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끊임없이 제공하는 시장창조형 기업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 크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구축함 만들겠다"…美 급한 불 떨어지자 벌어진 깜짝 결과 [이슈+]](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7156045.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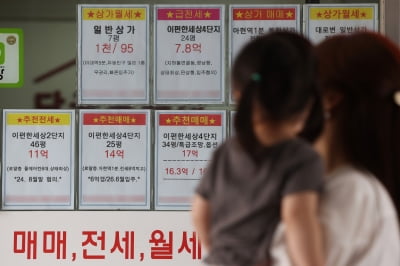


![분기 말 차익 실현에 하락…나스닥 0.71%↓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01.3678403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