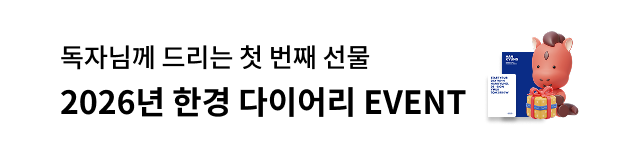왜 하필이면 묘지일까?
서울 주변에 그리도 갈 곳이 없었던가?
아니다.
현충탑이 가르치는 바, "여기는 민족의 열이 서린 곳/조국과 함께 영원히 가는 아들/해와 달이 이 언덕을 보호하리라".
그래서 간다.
그리고 혼란스럽다.
아들이 목숨 바쳐 싸웠던 적들은 또 누구인가?
그들은 적이면서 동족이고 어떤 이유에서건 희생자들이란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렇다고 그들을 두둔할 수도 없다.
만약 그런 식이라면 남은 가족들은 꿈에도 잊지 못할 통한을 어찌 새길 수 있을까 보냐.
이제는 미제의 용병이란 수모로까지 감히 표현되고 있는 월남전 전몰용사들의 넋은 또 뭐란 말인가?
문득 최근 읽은 권정생 선생의 "애국자가 없는 세상"이란 시의 몇 구절이 떠오른다.
"이 세상 그 어는 나라에도/애국 애족자가 없다면/세상은 평화로울 것이다/젊은이들은 나라를 위해/동족을 위해/총을 메고 전쟁터로 가지 않을테고/ (중략) 국방의 의무란 것도/군대훈련소 같은 데도 없을테고/그래서/어머니들은 자식을 전쟁으로/잃지 않아도 될테고 (하략)"
온통 자그마한 비석으로 뒤덮이다시피 한 병사들의 묘역을 지나간다.
육군 이병 이정규의 묘.
1951년 11월21일 금화에서 전사.
육군 상병 정동영의 묘.
1952년 10월14일 금화지구에서 전사...
이병, 상병, 그들이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
애국? 애족? 이념?
할 말을 잃는다.
동행한 아내의 말은 더욱 가슴을 친다.
"학창 시절에는 여기와서 봉사활동도 하고 그랬지만 별다른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 아들을 군대에 보낸 지금은 이곳에 서 있기조차 힘드네요. 우리 빨리 여기서 나갑시다"
풍수를 공부하는 나는 여기서도 조그만 개달음을 얻는다.
내가 고교시절 처음 무덤을 찾았을 때, 목적은 나의 열등감을 죽은 자에 비기면서 심적 안정을 얻자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남의 불행이 나의 위로"라는 지극히 이기적인 발상에서 무덤 순례가 시작된 셈인데, 지금 아내의 말을 듣다 보니 바로 그 때의 내 생각이 아닌가?
내 자식이 군인이 되니 이제서야 국립묘지 병사들의 죽음이 실감으로 다가서더라는 사실은 얼마나 인간에 대한 모욕인가?
"중생이 아프기에 나도 아프다"는 유마거사의 말씀은 시대와 나라를 떠나서 인간의 금과옥조가 될 만하다.
하지만 속단은 아직 이르다.
젊은 그들이 정말 애국의 마음없이 목숨을 걸 수 있었을까?
내 경험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단언할 수 있다.
대학 시절 나는 월남에 파병되기 위하여 해병대 시험을 치렀다가 신체검사에서 두번이나 떨어진 경험이 있고, 그 당시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 나이 또래의 치기만만한 심정대로 전쟁을 경험하고 싶다는 욕망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전자가 더 큰 작용을 했다고 믿는다.
공작봉을 바라보며 잘 닦인 포장도로를 따라 산 위를 향한다.
위쪽에 있는 장군묘역은 크기와 위치에서 풍기는 분위기부터 다르다.
우선 음울함이 적다.
어느 장군의 묘비에 새겨진 글.
"길이 살리라/저들, 해와/달과 별과 또 여기/고히 잠든 산 넋들과 더불어/이 땅에/그대 또한 길이 살리라"
병사와 장군 묘역의 차이가 더욱 마음을 산란케 한다.
이제는 모두 한점 흙으로 돌아갔을 그 분들에게 계급이 무슨 소용 있으랴.
하지만 남아 있는 가족에게는 그렇지가 않을 것이다.
모두 같이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소심한 내 성격 탓일까?
역시 모르겠다.
43만평 대지 위에 모두 16만여 위가 묻혀 있는 곳.
현충탑 내부 위패 봉안관에는 10만2천여 위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고 중앙 지하 유골함에는 5천7백여 위의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무명용사의 유골함이 모셔져 있다고 한다.
저 산하 어딘가에 시신은 조각나 흙에 덮이고 그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무명용사들.
지금 우리는 살아 있다.
그들을 생각한다면 무엇이 두려울까?
그렇게 떠난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못 살게 된 신세 한탄이나 하고 있을 수 있겠는가?
국립묘지가 있는 이곳 동작동은 본래 인근 강변에 검붉은 구리빛 색깔을 띤 돌이 많이 있어서 "동재기"라 붙여진 지명이 한자음화하면서 지어진 것이라고 한다.
한가지 신기한 것은 지금의 이수로터리에서 사당 방면에 있던 정금마을의 유래가 심상치 않다는 것이다.
정씨 성을 가진 감사가 이곳에 살았다 하여 정감몰이 되고 그것이 변하여 정금마을이 되었다는 것이 통설이나, 일설에는 조선 후기에 포방터(사격장)가 이곳에 있었고 여기서 훈련을 마친 후 나루를 건너기 전에 인원과 장비를 점검했다 해서 점검마을이라 했던 것이 정금마을로 음전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포성과 포연 속에서 사투를 벌이다 끝내 숨을 거둔 분들이 묻힌 곳이 하필이면 사격장 옆이라니, "땅에도 팔자가 있다"는 옛말이 헛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에 해 본 소리다.
이곳이 명당이란 주장은 유명한 지관 지창룡씨의 저서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과연 명당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국립묘지(당시는 국군묘지)의 터잡기에 풍수가 동원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꺼낸 얘기다.
그의 책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당시의 후보지로 물망에 오른 고장이 우이동, 덕소, 말죽거리, 소사, 팔당댐 주변 등이었는데, 전국의 유능한 풍수지리학자가 동원되었으나 필자가 세밀한 풍수학적 고찰, 거리상 여건 등을 참고하여 동작동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이 주장은 국립현충원이 발간한 "민족의 얼(제4집)"에 나오는 국군묘지 후보지 선정을 위한 답사지와 상당부분 일치한다.
즉 우이동, 부평, 시흥, 안양, 용산, 성동구, 한강 주변 등이 답사되었고 1953년 9월 이승만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동작동으로 확정되었다는 기록이 그것이다.
지씨의 주장은 이곳의 명당 형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국립묘지 전체의 형국은 공작새가 아름다운 날개를 쭉 펴고 있는 형국의 공작장익형(孔雀張翼形)이요, 현편으로는 장군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앉은 듯한 형상이 장군대좌형(將軍大坐刑)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승만 전 대통령의 묘소는 목마른 거북이가 물을 바라보고 내려가는 영구음수형(靈龜飮水刑)이며 육영수 여사의 묘소는 공작새가 알을 품고 있는 공작포란형(孔雀抱卵刑)이라 하였는데 위에서 언급한 "민족의 얼"이란 책에서 이곳 지세를 설명할 때도 비슷하게 한 것을 보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주장인 듯하다.
한가지 이상한 것은 당대 최고수 지관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 분의 형국론적 설명이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는 점이다.
대체적인 윤곽만으로 단정해서는 안되는 것이 풍수 형국론의 원칙으로, 유명한 풍수서인 설심부(雪心賦)에서는 이를 경계하여 이르기를 "호랑이는 사자와 비슷하고 기러기는 봉황과 다르지 않게 보이지만 만일 조그마한 차이가 있어도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우기는 우를 범하는 꼴이니, 모두 한덩어리로 되어 구별이 없으면 지렁이를 뱀으로 안다"고 하였는 바, 국립묘지라는 동일한 대상을 공작장익형으로도 혹은 장군대좌형으로도 본 것은 원칙에 어긋나기에 해 본 소리다.
하지만 고수의 큰 뜻을 알 수 없으니 더 이상의 언급은 실익이 없다.
무엇보다 이런 곳에 와서 명당론을 들먹이는 나 자신이 가엾게 느껴지니 말해 무엇하랴.
이 문제는 재론하겠다.
[ 본사 객원편집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