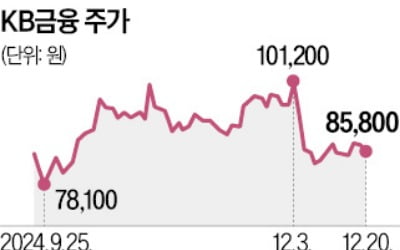[2000 증시결산] (코스닥) (1) '천당에서 지옥으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올해 코스닥시장은 말그대로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졌다.
코스닥지수는 3월10일 283.44(종가기준)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내림세로 기울었다.
간간이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긴 했으나 기울어진 대세를 돌려놓지는 못했다.
하락세를 지속해온 코스닥지수는 결국 폐장일인 26일 52.58로 사상 최저를 기록하며 올해를 마감했다.
주가폭락에 따라 투자자들의 가슴을 부풀게 했던 ''대박''의 꿈은 ''쪽박''의 아픔으로 바뀌었다.
1월의 급락세를 딛고 일어서 3월의 사상 최고치까지 상승가도를 달릴 때만해도 많은 투자자들은 올해를 ''코스닥의 해''로 여겼다.
투자자들은 대박의 꿈을 안고 경쟁적으로 코스닥시장으로 몰려들었다.
하지만 그 때가 정점이었다.
지옥의 고통은 길었다.
''주가는 인간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오르고 상상하는 이하로 떨어진다''는 어느 증시 전문가의 지적처럼 코스닥시장에는 바닥이 없었다.
처음에는 모두들 지수 200이 바닥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200선은 너무도 허망하게 무너졌다(4월4일).급기야 지수는 50선까지 떨어졌다.
IMF 경제위기 때도 60선은 지켰었다.
그 사이 코스닥시장의 시가총액 69조원이 허공속으로 사라졌다.
투자자들의 재산은 10분의 1, 20분의 1로 줄어들었다.
그나마 아직 버티고 있는 투자자는 다행이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미 깡통을 차고 증시를 떠났다.
코스닥주가의 폭락은 ''거품 붕괴''에서 1차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투자자들은 인터넷이 제시하는 장밋빛 세계에 너무 심취해 있었다.
너도나도 인터넷 주식을 사모았고,주당 3백만∼4백만원짜리 황제주가 속출했다.
10만원,20만원짜리 주식은 명함도 내밀기 힘들 정도였다.
애널리스트나 펀드매니저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들은 주당 1천만원짜리 주식이 곧 나올 것이라는 주장을 서슴지 않으면서 거품 형성에 한몫했다.
마침 코스닥시장의 바로미터인 미국 나스닥시장도 기술주 열풍에 한껏 달아오른 상태였다.
그러나 기술주들은 주가 수준에 비해 너무 초라한 실적을 보여줬고,주가는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공급과잉도 주가 하락에 일조했다.
올해 코스닥시장에는 10조원이 넘는 주식이 새로 공급됐다.
유상증자는 모두 2백건 5조4천1백32억원으로 지난해 증자규모(3조8백44억원)에 비해 76%나 늘어났다.
사채발행에 의한 자금조달 실적은 2조4천3백54억원으로 지난해 1조5천6백19억원에 비해 56% 증가했다.
신규등록기업의 공모자금은 2조5천4백5억원을 기록했다.
코스닥기업들이 경쟁적으로 투자자 자금을 훑어감에 따라 시장체력은 급속히 고갈됐다.
결국 새로운 천년의 출발인 2000년 증시는 ''천장 3일,바닥 1백일''이란 증시격언과 거품의 후유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되새겨준 1년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코스닥지수는 3월10일 283.44(종가기준)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내림세로 기울었다.
간간이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긴 했으나 기울어진 대세를 돌려놓지는 못했다.
하락세를 지속해온 코스닥지수는 결국 폐장일인 26일 52.58로 사상 최저를 기록하며 올해를 마감했다.
주가폭락에 따라 투자자들의 가슴을 부풀게 했던 ''대박''의 꿈은 ''쪽박''의 아픔으로 바뀌었다.
1월의 급락세를 딛고 일어서 3월의 사상 최고치까지 상승가도를 달릴 때만해도 많은 투자자들은 올해를 ''코스닥의 해''로 여겼다.
투자자들은 대박의 꿈을 안고 경쟁적으로 코스닥시장으로 몰려들었다.
하지만 그 때가 정점이었다.
지옥의 고통은 길었다.
''주가는 인간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오르고 상상하는 이하로 떨어진다''는 어느 증시 전문가의 지적처럼 코스닥시장에는 바닥이 없었다.
처음에는 모두들 지수 200이 바닥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200선은 너무도 허망하게 무너졌다(4월4일).급기야 지수는 50선까지 떨어졌다.
IMF 경제위기 때도 60선은 지켰었다.
그 사이 코스닥시장의 시가총액 69조원이 허공속으로 사라졌다.
투자자들의 재산은 10분의 1, 20분의 1로 줄어들었다.
그나마 아직 버티고 있는 투자자는 다행이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미 깡통을 차고 증시를 떠났다.
코스닥주가의 폭락은 ''거품 붕괴''에서 1차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투자자들은 인터넷이 제시하는 장밋빛 세계에 너무 심취해 있었다.
너도나도 인터넷 주식을 사모았고,주당 3백만∼4백만원짜리 황제주가 속출했다.
10만원,20만원짜리 주식은 명함도 내밀기 힘들 정도였다.
애널리스트나 펀드매니저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들은 주당 1천만원짜리 주식이 곧 나올 것이라는 주장을 서슴지 않으면서 거품 형성에 한몫했다.
마침 코스닥시장의 바로미터인 미국 나스닥시장도 기술주 열풍에 한껏 달아오른 상태였다.
그러나 기술주들은 주가 수준에 비해 너무 초라한 실적을 보여줬고,주가는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공급과잉도 주가 하락에 일조했다.
올해 코스닥시장에는 10조원이 넘는 주식이 새로 공급됐다.
유상증자는 모두 2백건 5조4천1백32억원으로 지난해 증자규모(3조8백44억원)에 비해 76%나 늘어났다.
사채발행에 의한 자금조달 실적은 2조4천3백54억원으로 지난해 1조5천6백19억원에 비해 56% 증가했다.
신규등록기업의 공모자금은 2조5천4백5억원을 기록했다.
코스닥기업들이 경쟁적으로 투자자 자금을 훑어감에 따라 시장체력은 급속히 고갈됐다.
결국 새로운 천년의 출발인 2000년 증시는 ''천장 3일,바닥 1백일''이란 증시격언과 거품의 후유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되새겨준 1년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