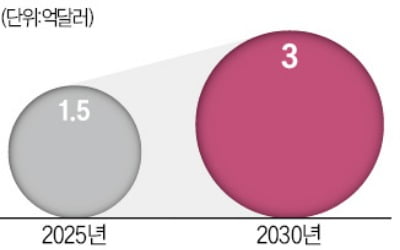다시 서는 벤처...사람이 경쟁력 .. '인력자원관리 전략'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 양재동에 있는 중견 네트워크 장비업체 H사 P사장은 요즘 후회가 막심하다.
그는 쥐꼬리만한 월급에 야근을 밥먹듯 하는 직원들에게 스톡옵션 등의 인센티브를 주지 않았다.
그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모두 함께 힘든 이 시기를 넘기자"며 "벤처가 다 그런 것 아니냐. 코스닥등록 때까지만 참자"고 다그치기만 했다.
이같은 분위기 조성전략의 효력은 오래가지 못했다.
결국 핵심 엔지니어들은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면 함께 사표를 내겠다"고 실력(?)행사를 했고 P사장은 그 요구의 대부분을 받아들여만 했다.
직원얼굴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관계가 어색해진 것은 더 아픈 손실이었다.
서울테헤란밸리의 인터넷 포털 K사.
이 회사 L사장은 "우수 인력은 절대로 빼앗기면 안된다"고 믿고 나름대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스톡옵션은 물론 기회가 되면 보너스도 두둑히 챙겨 줬다.
그런데 최근 핵심 인력들이 사표를 들고 왔다.
"이만하면 섭섭지 않은 대우인데 왜 떠나려고 하느냐"고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문제는 L사장의 경영 방식에 있었다.
그는 엔지니어출신이 아니었지만 기술개발과 관련된 의사결정까지 도맡았다.
개발자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나를 따르라"는 식으로 밀어붙였다.
자연히 권위적인 분위기는 형성됐고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직원들은 하나 둘 떠나기 시작한 것이다.
벤처기업에서 인적 자원이 가지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
지식기반 경제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경쟁력"이라는 말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느낀다는 벤처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IT(정보기술)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이 주도하는 뉴밀레니엄 시대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력이 바로 경쟁력의 핵심이다.
단순한 관리형 인력 수십명이 못하는 일을 단 한 명의 "튀는" 인재가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벤처기업들은 인적자원관리(HRM)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5월 멀티데이타시스템이라는 벤처기업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동쟁의조정신청을 내는 등 노사마찰이 일어나 경각심을 일깨워준 적은 있었다.
그러나 때마침 고개를 든 벤처위기론에 밀려 크게 공론화되지는 못 했다.
"자금난 등 어려워진 여건이 인적자원 관리를 등한시하게 만들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신재욱 PWC HRM컨설턴트)
그렇다면 어떤 전략을 세우고 실천하는게 바람직할까.
"먼저 직원들을 지적 자산인 "동반자(파트너)"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고 LG경제연구원 장성근 연구원은 강조한다.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보상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
보상은 꼭 금전적인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신바람나게 일을 할 수 있는 기업문화와 조직운영 방식 등을 마련해 주는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단순한 성과주의(Incentive-providing)보다 성공 공유주의(Success-sharing)가 더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아울러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과 개인 생활까지 배려하는 맞춤식 관리는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이직 전직 등 일자리 이동이 보편화된 최근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도 필요하다.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한다는 좁은 개념을 벗어나 미래를 내다보는 인력관리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
가령 영업인력을 늘려야 될 땐 관리부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지 또는 프리랜서를 쓸 수 있는지 등의 대안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성급한 인력확충은 회사 사정이 나빠질 때 큰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
사람을 줄일 때도 장기적인 수급 사정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불황기를 우수 인력을 스카우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기는 경쟁 업체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
벤처기업은 그 속성상 인적자원에 절대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벤처캐피털리스트들도 투자결정시 최고경영자와 직원 자질을 가장 먼저 따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벤처컨설팅 전문업체인 인터젠의 박용찬 사장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인적자원관리 전략을 세워 실행에 들어가야 한다"며 "불황기를 이겨내기 위한 전략으로서의 인적자원 관리는 연구개발 마케팅 등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그는 쥐꼬리만한 월급에 야근을 밥먹듯 하는 직원들에게 스톡옵션 등의 인센티브를 주지 않았다.
그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모두 함께 힘든 이 시기를 넘기자"며 "벤처가 다 그런 것 아니냐. 코스닥등록 때까지만 참자"고 다그치기만 했다.
이같은 분위기 조성전략의 효력은 오래가지 못했다.
결국 핵심 엔지니어들은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면 함께 사표를 내겠다"고 실력(?)행사를 했고 P사장은 그 요구의 대부분을 받아들여만 했다.
직원얼굴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관계가 어색해진 것은 더 아픈 손실이었다.
서울테헤란밸리의 인터넷 포털 K사.
이 회사 L사장은 "우수 인력은 절대로 빼앗기면 안된다"고 믿고 나름대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스톡옵션은 물론 기회가 되면 보너스도 두둑히 챙겨 줬다.
그런데 최근 핵심 인력들이 사표를 들고 왔다.
"이만하면 섭섭지 않은 대우인데 왜 떠나려고 하느냐"고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문제는 L사장의 경영 방식에 있었다.
그는 엔지니어출신이 아니었지만 기술개발과 관련된 의사결정까지 도맡았다.
개발자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나를 따르라"는 식으로 밀어붙였다.
자연히 권위적인 분위기는 형성됐고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직원들은 하나 둘 떠나기 시작한 것이다.
벤처기업에서 인적 자원이 가지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
지식기반 경제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경쟁력"이라는 말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느낀다는 벤처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IT(정보기술)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이 주도하는 뉴밀레니엄 시대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력이 바로 경쟁력의 핵심이다.
단순한 관리형 인력 수십명이 못하는 일을 단 한 명의 "튀는" 인재가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벤처기업들은 인적자원관리(HRM)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5월 멀티데이타시스템이라는 벤처기업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동쟁의조정신청을 내는 등 노사마찰이 일어나 경각심을 일깨워준 적은 있었다.
그러나 때마침 고개를 든 벤처위기론에 밀려 크게 공론화되지는 못 했다.
"자금난 등 어려워진 여건이 인적자원 관리를 등한시하게 만들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신재욱 PWC HRM컨설턴트)
그렇다면 어떤 전략을 세우고 실천하는게 바람직할까.
"먼저 직원들을 지적 자산인 "동반자(파트너)"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고 LG경제연구원 장성근 연구원은 강조한다.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보상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
보상은 꼭 금전적인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신바람나게 일을 할 수 있는 기업문화와 조직운영 방식 등을 마련해 주는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단순한 성과주의(Incentive-providing)보다 성공 공유주의(Success-sharing)가 더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아울러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과 개인 생활까지 배려하는 맞춤식 관리는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이직 전직 등 일자리 이동이 보편화된 최근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도 필요하다.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한다는 좁은 개념을 벗어나 미래를 내다보는 인력관리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
가령 영업인력을 늘려야 될 땐 관리부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지 또는 프리랜서를 쓸 수 있는지 등의 대안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성급한 인력확충은 회사 사정이 나빠질 때 큰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
사람을 줄일 때도 장기적인 수급 사정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불황기를 우수 인력을 스카우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기는 경쟁 업체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
벤처기업은 그 속성상 인적자원에 절대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벤처캐피털리스트들도 투자결정시 최고경영자와 직원 자질을 가장 먼저 따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벤처컨설팅 전문업체인 인터젠의 박용찬 사장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인적자원관리 전략을 세워 실행에 들어가야 한다"며 "불황기를 이겨내기 위한 전략으로서의 인적자원 관리는 연구개발 마케팅 등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