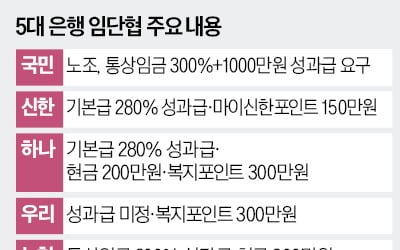[취재여록] 대한주택보증 부실 땜질처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한주택보증의 부실화 문제가 여론의 도마위에 다시 올랐다.
지난해말 현재 자본금이 마이너스 1조1천1백68억원을 기록해 사실상 분양보증 중단 상태에 빠졌다.
주택업체들의 잇단 부도로 1999년 6월 1조4천6백억원의 자본금으로 새 출발한지 1년6개월만에 2조7천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부실이 생긴 것이다.
건설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은 다급한 나머지 정관개정을 추진중이다.
건교부는 정부에서 대한주택보증에 2조원을 지원키로 결정했고 5월까지는 자금투입이 이뤄지기 때문에 분양보증의 중단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5월까지 2조원의 자금이 투입되면 대한주택보증 부실은 완전 치유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주택 분양보증시장 규모가 58조원이고 자기자본의 70배까지로 정한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한도를 감안하면 2조원만 지원하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청사진은 언제 허물어질지 모른다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정부는 주택업체들이 또 쓰러지기 시작하면 대한주택보증이 언제든지 부실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주택업체들의 부도가 잇따라 대한주택보증이 대신 물어주는 대위변제금이 급증하고 있다.
IMF 경제위기 이후 지난해말까지의 대위변제금은 2조5천억원.
반면 이 기간동안 부도업체나 연대보증업체로부터 회수한 돈은 전체의 10%인 3천억원에 그쳤다.
주택업체들에 빌려준 융자금 회수전망이 불투명한 것도 문제다.
이 회사가 현재 정상적인 업체에 빌려 준 돈은 전체 융자금 2조3천9백1억원의 40%에도 못미치는 9천5백75억원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회수율이 2∼3%인 워크아웃, 화의, 법정관리,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회사들에 물려 있다.
내년 6월부터 융자금 상환이 시작되지만 대그룹 소속 건설사를 제외하곤 대부분 갚을 능력이 없다는게 업계의 지적이다.
설상가상으로 주택업계 사정은 갈수록 악화되는 추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교부는 번번이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처방을 내리는데 급급하다.
근본적인 부실방지책을 바란다면 과욕일까.
유대형 건설부동산부 기자 yoodh@hankyung.com
지난해말 현재 자본금이 마이너스 1조1천1백68억원을 기록해 사실상 분양보증 중단 상태에 빠졌다.
주택업체들의 잇단 부도로 1999년 6월 1조4천6백억원의 자본금으로 새 출발한지 1년6개월만에 2조7천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부실이 생긴 것이다.
건설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은 다급한 나머지 정관개정을 추진중이다.
건교부는 정부에서 대한주택보증에 2조원을 지원키로 결정했고 5월까지는 자금투입이 이뤄지기 때문에 분양보증의 중단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5월까지 2조원의 자금이 투입되면 대한주택보증 부실은 완전 치유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주택 분양보증시장 규모가 58조원이고 자기자본의 70배까지로 정한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한도를 감안하면 2조원만 지원하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청사진은 언제 허물어질지 모른다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정부는 주택업체들이 또 쓰러지기 시작하면 대한주택보증이 언제든지 부실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주택업체들의 부도가 잇따라 대한주택보증이 대신 물어주는 대위변제금이 급증하고 있다.
IMF 경제위기 이후 지난해말까지의 대위변제금은 2조5천억원.
반면 이 기간동안 부도업체나 연대보증업체로부터 회수한 돈은 전체의 10%인 3천억원에 그쳤다.
주택업체들에 빌려준 융자금 회수전망이 불투명한 것도 문제다.
이 회사가 현재 정상적인 업체에 빌려 준 돈은 전체 융자금 2조3천9백1억원의 40%에도 못미치는 9천5백75억원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회수율이 2∼3%인 워크아웃, 화의, 법정관리,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회사들에 물려 있다.
내년 6월부터 융자금 상환이 시작되지만 대그룹 소속 건설사를 제외하곤 대부분 갚을 능력이 없다는게 업계의 지적이다.
설상가상으로 주택업계 사정은 갈수록 악화되는 추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교부는 번번이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처방을 내리는데 급급하다.
근본적인 부실방지책을 바란다면 과욕일까.
유대형 건설부동산부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