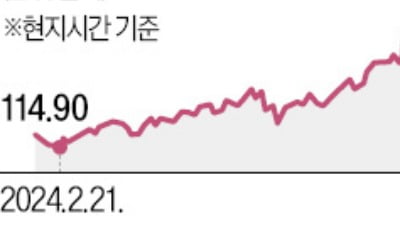[이슈 따라잡기] '감세정책'..부시 감세법안 美國서도 논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감세정책에 대한 논란은 미국에서 먼저 달아올랐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개인소득세율을 낮추고 상속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향후 10년간 1조6천억달러의 세금을 덜 걷겠다는 획기적인 감세안을 공약하면서 논란은 시작됐다.
부시 당선 이후 미국인의 눈길은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는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에게로 쏠렸다.
그린스펀 의장은 그동안에는 감세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었다.
그러나 지난 1월25일(현지시간) 상원 예산위원회에 출석,세간의 예상을 뒤집고 부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는 "최근 미국 경제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면서 "경제가 지금보다 더 나빠진다면 감세정책을 취하는 것이 정당화될 것"이라고 증언했다.
로버트 루빈 전 재무장관과 폴 볼커 전 FRB 의장을 필두로 한 반대파는 감세정책이 오히려 경기침체를 장기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루빈 전 장관은 지난 2월11일자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감세정책으로 인해 미국은 지난 80년대와 90년대 초기의 천문학적인 적자 상황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며 결국 침체의 늪으로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예산적자가 쌓이면 금리는 올라갈 것이고 이는 기업 의지를 꺾고 소비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떻든 미 하원은 지난 9일 감세정책의 핵심 부분인 9천5백80억달러 규모의 소득세 감면법안을 2백30대 1백98로 여유있게 통과시켰다.
그러나 상원에서는 일부 온건파 공화당 의원이 감세 규모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통과 전망이 불투명하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개인소득세율을 낮추고 상속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향후 10년간 1조6천억달러의 세금을 덜 걷겠다는 획기적인 감세안을 공약하면서 논란은 시작됐다.
부시 당선 이후 미국인의 눈길은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는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에게로 쏠렸다.
그린스펀 의장은 그동안에는 감세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었다.
그러나 지난 1월25일(현지시간) 상원 예산위원회에 출석,세간의 예상을 뒤집고 부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는 "최근 미국 경제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면서 "경제가 지금보다 더 나빠진다면 감세정책을 취하는 것이 정당화될 것"이라고 증언했다.
로버트 루빈 전 재무장관과 폴 볼커 전 FRB 의장을 필두로 한 반대파는 감세정책이 오히려 경기침체를 장기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루빈 전 장관은 지난 2월11일자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감세정책으로 인해 미국은 지난 80년대와 90년대 초기의 천문학적인 적자 상황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며 결국 침체의 늪으로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예산적자가 쌓이면 금리는 올라갈 것이고 이는 기업 의지를 꺾고 소비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떻든 미 하원은 지난 9일 감세정책의 핵심 부분인 9천5백80억달러 규모의 소득세 감면법안을 2백30대 1백98로 여유있게 통과시켰다.
그러나 상원에서는 일부 온건파 공화당 의원이 감세 규모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통과 전망이 불투명하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