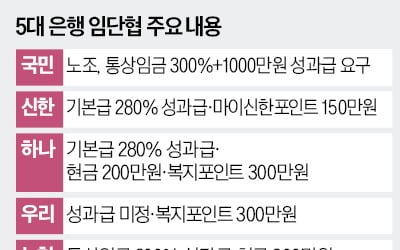[취재여록] 짜맞추기式 은행 합병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1일 오후 8시30분.
서울 여의도 대우증권빌딩 7층에 있는 국민 주택은행 합병추진위원회는 양 은행 관계자와 기자들로 북적거렸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최범수 합추위 대변인은 두 은행간 합병본계약에 담길 내용이 전격 타결됐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하지만 합추위 발표 내용을 찬찬히 뜯어보면서 하나같이 절묘한 절충안이란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두 은행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존속법인 문제는 "신설법인 설립"이라는 안으로 대체됐다.
신설법인 설립이 어렵다고 두 은행이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국민은행으로 한다는 단서조항도 달았다.
또 합병은행 이름은 국민은행으로 하되 존속법인이 국민은행으로 결정되면 주택은행을 합병은행 이름으로 사용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이쯤이면 합병본계약에 담을 내용으로 확정된 것은 사실상 두 은행의 주식교환비율 말고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산실사나 시장규모 주가수준 비교 등 객관적인 지표를 토대로 결정돼야 할 핵심사안은 "서로 하나씩 나눠 갖는" 식이 되고 말았다.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하나씩 사이좋게 가져가면 물론 두 은행의 자존심, 특히 김상훈 김정태 두 은행장의 자존심은 괜찮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다.
본계약 내용을 타결하기까지 보여준 두 은행의 행보를 보면 "한몸 만들기"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서로 감정의 골만 더욱 깊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두 은행이 합병을 위해 공식기구로 만들었던 합추위의 결의사항에 따르지 않아 "자율합병"이란 취지마저 무색해졌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이 두 은행장을 불러다 놓고 설득과 중재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같은 지적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합병 본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쟁점사항은 이렇게 해서 해결됐다.
그러나 오는 11월 초대형은행으로 재출범하게 될 두 은행을 바라보는 금융계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두 은행 합병이 한국 금융구조 개혁의 빛나는 열매가 될지, 실패한 합병사례가 될지는 이제 두 은행의 임직원에 달려 있다.
김준현 금융부 기자 kimjh@hankyung.com
서울 여의도 대우증권빌딩 7층에 있는 국민 주택은행 합병추진위원회는 양 은행 관계자와 기자들로 북적거렸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최범수 합추위 대변인은 두 은행간 합병본계약에 담길 내용이 전격 타결됐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하지만 합추위 발표 내용을 찬찬히 뜯어보면서 하나같이 절묘한 절충안이란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두 은행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존속법인 문제는 "신설법인 설립"이라는 안으로 대체됐다.
신설법인 설립이 어렵다고 두 은행이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국민은행으로 한다는 단서조항도 달았다.
또 합병은행 이름은 국민은행으로 하되 존속법인이 국민은행으로 결정되면 주택은행을 합병은행 이름으로 사용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이쯤이면 합병본계약에 담을 내용으로 확정된 것은 사실상 두 은행의 주식교환비율 말고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산실사나 시장규모 주가수준 비교 등 객관적인 지표를 토대로 결정돼야 할 핵심사안은 "서로 하나씩 나눠 갖는" 식이 되고 말았다.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하나씩 사이좋게 가져가면 물론 두 은행의 자존심, 특히 김상훈 김정태 두 은행장의 자존심은 괜찮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다.
본계약 내용을 타결하기까지 보여준 두 은행의 행보를 보면 "한몸 만들기"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서로 감정의 골만 더욱 깊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두 은행이 합병을 위해 공식기구로 만들었던 합추위의 결의사항에 따르지 않아 "자율합병"이란 취지마저 무색해졌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이 두 은행장을 불러다 놓고 설득과 중재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같은 지적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합병 본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쟁점사항은 이렇게 해서 해결됐다.
그러나 오는 11월 초대형은행으로 재출범하게 될 두 은행을 바라보는 금융계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두 은행 합병이 한국 금융구조 개혁의 빛나는 열매가 될지, 실패한 합병사례가 될지는 이제 두 은행의 임직원에 달려 있다.
김준현 금융부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