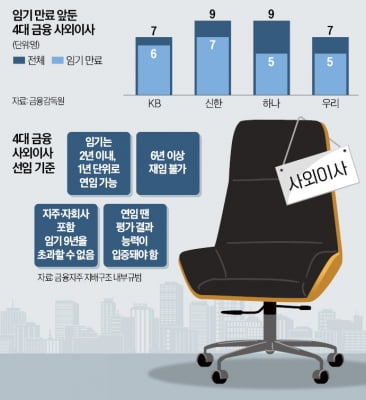"중견기업 부럽지 않네" .. 매출 1천억.직원 200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제 중견기업이라 불러달라"
벤처.중소기업중 매출액이 1천억원을 웃도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IMF 위기 직후 3년여동안 고속성장해 규모나 인원, 조직 등이 중견기업에 못지 않은 회사들도 있다.
특히 회사 직원이 2백명에 달해 벤처기업으로 분류되는 것이 어색한 회사들도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이들중 일부는 지나치게 빨리 성장한 까닭에 중견기업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회사도 있다.
매출액 1천억원이 벤처.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나누는 잣대는 아니지만 회사가 달라져야 할 분기점이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업종에 따라 또는 회사 사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매출액 1천억원을 돌파하면서 성장률이 급속히 낮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때부터는 성장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성장 정체에 대비하고 수익구조를 확고히 다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탈(脫)벤처.중소기업을 꿈꾸는 회사는 =이런 회사는 IT(정보기술) 분야에서 그다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동통신 장비를 생산하는 에스피컴텍과 단암전자통신, 무선전화기와 컴퓨터 마더보드를 만드는 미래통신 등은 지난해에 이미 1천억원을 웃돌았다.
이 회사들은 올해 1천5백억원 이상의 매출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디지털셋톱박스를 생산하는 휴맥스는 지난해 외형이 1천4백25억원에 달했으며 올 1.4분기엔 5백56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CTI(컴퓨터통신통합) 분야의 로커스와 네트워크통합업체인 코리아링크, 셋톱박스 제조업체인 한단정보통신도 올해 1천억원의 매출이 가능하다고 자신하고 있다.
비(非)IT업종 중에선 삼영열기와 쌈지가 중견기업으로의 발돋움을 준비하고 있다.
성장 정체에 대비해야 =텔슨전자는 중견기업으로의 이미지를 굳히는데 실패한 회사중 하나로 꼽힌다.
매출액이 지난 98년 7백47억원에서 99년 3천9백95억원으로 점프했으나 지난해엔 2천8백74억원으로 미끄러졌다.
올 1.4분기엔 3백84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주력품목인 휴대폰 단말기 시장이 단말기 보조금 중지 등으로 크게 위축된데다 주거래처인 모토로라의 주문이 끊겼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기술진입 장벽이 그다지 높지 않은 사업구조 하나만으론 중견기업으로의 도약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 인터넷 반도체 등 첨단업종일수록 부침이 심하다.
한 우물을 팔 경우엔 고도의 기술을 갖춰 일가(一家)를 이루는 길이 최선이다.
수익구조를 다져야 =케이엠더블유는 지난해 2백%가 넘는 성장을 통해 매출액이 1천7백53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순이익은 1백48억원에서 10억원으로 떨어졌다.
금융비용과 외환손실, 유가증권 처분손실 등이 요인이다.
반도체 PCB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자랑하는 심텍은 지난해 6백87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2백4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 적자로 전환됐다.
무리한 주식투자가 화를 불렀다.
매출액이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관리에도 상당한 신경을 써야 한다.
기술개발과 영업만이 전부인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회사가 일정규모에 이르면 전문경영인 영입을 고려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코아의 유광윤 사장은 "벤처기업의 경우 오너가 회사경영을 고집하다보면 성장정체 수익성저하 기업가치 감소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 사장은 자회사인 미래통신의 매출액이 1천억원을 돌파한 지난해말 전문경영인을 스카우트해 미래통신의 경영을 맡겼다.
지난해 1천1백40억원의 매출을 올린 미래통신은 올들어 5월까지 7백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며 고속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몰락한 세계 2차 대전 요새…다시 일으킬 열쇠는? [K조선 인사이드]](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ZA.39328023.3.jpg)
!["중국인 반응 폭발"…'6000만원 車' 보름 만에 13만대 팔렸다 [테슬람 X랩]](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1.39333104.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