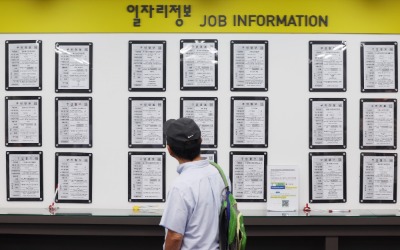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는 "만약 우리가 죽은 사람을 추억하며 기뻐할 수 없다면 차라리 죽은 사람들을 혼자 내버려두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했다.
꽃을 보내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도 검정옷을 입고 슬픈 표정을 지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괴이한 짓이라는 글도 남겼다.
하지만 사람들은 죽음의 신비에는 꼼짝 못하고 죽은 자를 보내는 성대하고 엄숙한 장례의식을 종교를 통해 발전시켜왔다.
뉴욕타임스가 암에 걸려 죽음을 앞두고 있는 한 전직 교사(65세)의 생전 고별식을 새 장례문화의 사례로 보도해 세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초청된 친지 1백명이 멀지 않아 고인이 될 사람과 추억을 나누고 죽음을 당당하게 맞는 교훈도 얻은 훌륭한 마무리였다는 평가도 나왔다. 무엇보다 죽음에 직면한 당사자의 용기가 감동적이다.
전통사회에서는 한국인 만큼 죽음을 자연스럽게 여기고 오랫동안 철저하게 준비한 민족은 없었다.
우리에게 죽음은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 사고가 아니라 자연스런 삶의 한 과정이었을 뿐이다.
60대가 장수한 노인층이었던 과거에는 환갑이 되면 재산을 아들에게 넘겨주고 뒷전으로 은퇴했다.
'살아 있지만 죽은 조상'이 되는 시기가 환갑이다.
환갑잔치를 '산(生)제사'라고 불렀고 환갑날부터는 '남의 나이를 먹는다'거나 '세상을 두 번 산다'고 했던 것이 그 증거다.
노인들은 결혼식을 준비하는 처녀처럼 관과 수의를 마련했다.
묘자리도 미리 만들어 놓고 언제 올지 모를 죽음을 기다리며 자손들과 죽은 뒤의 일도 상의했다.
시대에 따른 신앙이나 예속(禮俗)의 변천은 필연적이지만 전통이 붕괴된 현재의 상황은 과거와는 사뭇 다르다.
수명이 길어진 요즘 세상에 죽음을 자연스런 삶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상업적인 병원 장의사와 종교집단이 도맡아 버린 장례는 죽은이보다 물질과 기능만이 강조되고 있다.
장례의식도 유교 불교 천주교 개신교식이 뒤섞여 혼란스럽기만 하다.
호사스런 장례식보다 우리의 '산제사'격인 '생전 고별식'으로 생을 마무리짓는 것도 괜찮은 것은 아닐까.
- 글자크기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글자행간
-
- 1단계
- 2단계
- 3단계
공유하기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토요칼럼] 딥테크 시대, 기초과학 강국 일본과 협력을](https://img.hankyung.com/photo/202502/07.34201788.3.jpg)

![[취재수첩] 트럼프 2기 탄소포집 시장 오히려 커진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502/07.25714224.3.jpg)

![[단독] "손 꼭 잡고 다니던 부부"…알고보니 100억 사기꾼](https://img.hankyung.com/photo/202502/01.39490611.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