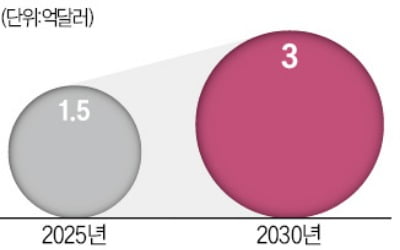[대우패망 '秘史'] (12) '무너지는 모래성 (上)'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마가 쫓기고 있었다.
패착에 패착이 더해갔다.
GM으로부터 50억달러 외자유치, 대통령과의 독대, 삼성차-대우전자 빅딜 등 일련의 승부수들이 모두 실패로 돌아간 다음이었다.
이제 금융기관들의 대우 여신 회수가 본격화됐다.
당국은 대우 부도를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김우중 회장은 역전의 실마리를 잡기 위해 최후의 노력을 쏟아부었다.
바둑에서조차 한번 판세가 기울면 좀체 역전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워지는 법이었다.
김 회장은 한때 한국기원 이사장까지 지낼 만큼 바둑을 좋아했다.
타고난 낙천주의자였던 김 회장의 눈에도 이제 대마가 살아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였다.
삼성그룹의 금융계열사들이 먼저 움직였지만 한번 둑이 무너지자 누구라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대우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다.
● 삼성이 움직인다
대우 자금줄에 본격적으로 이상 징후가 생긴 것은 98년 말부터였다.
당국이 회사채와 CP(기업어음) 한도제를 도입하면서 봉쇄가 시작됐고 투신사들은 이제 대우채를 팔아야 했다.
신탁재산의 15%로 조정된 보유한도를 초과한 물량만도 수조원에 달했다.
삼성캐피탈이 먼저였다.
삼성캐피탈은 어음 할인한도를 없애는 방식으로 대우 여신을 빠르게 회수해갔다.
삼성생명 삼성화재는 98년 말부터 회수에 나서 99년 1?4분기엔 대우 여신을 사실상 제로로 만들었다.
삼성투신은 99년 들어 5천억원을 회수했다.
대우사람들은 삼성계열사들이 99년 4월까지 거둬간 대우 여신을 1조원 정도로 추산했다.
김 회장이 3월23일 승지원으로 이건희 삼성 회장을 찾아간 이유는 빅딜 담판도 담판이었지만 여신 회수를 중단시키는 것이 더욱 다급해서였다.
시장에서는 "삼성이 움직인다(회수한다)"는 소문이 퍼져 나갔다.
97년 기아자동차 때도 그랬다.
삼성의 정보력, 관리능력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였다.
이제 군중심리가 고개를 들었다.
김정태 행장이 지휘하는 주택은행의 자회사인 주은투신도 대우여신을 털어내는데 적극적이었다.
국내외 은행 차입은 이미 98년부터 막혔고 2금융권에서마저 돈줄이 막혀갔다.
● 상계처리의 함정
해외은행들의 대우 여신 회수는 98년 하반기부터 구체화됐다.
10월 노무라보고서 파문 직후부터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주요 해외은행들은 대우 현지법인들의 '데포뱅크'(외화당좌거래은행)라는 우월적 지위를 십분 활용했다.
해외은행들은 대우가 수출대금을 받아 입금하는 족족 자신들의 채권과 상계시켜 나갔다.
이것으로도 모자랐다.
세계경영의 거대한 후폭풍이 대우의 해외 네트워크 전체를 뒤흔들었다.
대우는 국내에서 회사채로 조달한 자금으로 해외빚부터 갚느라 불법이건 합법이건 가리지 않고 해외로 해외로 자금을 내보내야 했다.
최근 1심 재판이 끝난 20조원이 넘는 외화밀반출은 이렇게 이루어졌다.
● 녹음을 하란 말이야
99년 2월 어느날 저녁 서울투신 채권팀장이 전화를 받았다.
놀랍게도 전화를 건 사람은 김 회장이었다.
서울투신 관계자가 말하는 김 회장과의 통화내용.
"사장과 임원이 연락이 안된다. 오늘 대우채를 매입해 주지 않으면 대우그룹은 부도난다.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도 안된다고 버틴다.
대우가 부도나면 20만∼30만명의 실업자가 생기니 어떻든 오늘은 넘기고 보자"
천하의 김우중이 계열사 팀장에게 직접 전화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놀라운 사건이었다.
그만큼 다급했다.
채권팀장은 하는 수 없이 대우채를 사들였고 대우는 부도를 넘겼다.
서울투신이 아니었다면 대우사태는 7월이 아니라 넉달 전인 이해 3월께 터져나왔을 터였다.
당시 서울투신 사장과 임원들은 대우의 사후문책이 두려워 고의로 연락두절 상태로 만들어 놓는 일이 많았다.
서울투신 실무자들은 다음날부터 대우관련 통화 내용을 모두 녹음하기 시작했다.
금감원 등 당국에서 걸려오는 전화도 마찬가지였다.
다른 투신사 S임원의 증언.
"서울투신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다 그랬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녹음을 하라고 권하곤 했습니다. 대우가 해외부채를 갚기 위해 엄청난 회사채를 발행한 사실을 알고 있는 터에 잠인들 왔겠습니까"
● 엇갈린 행보
물론 모든 투신사들이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일부 투신사들은 지뢰밭에서의 위험한 수익률 곡예를 벌이기도 했다.
한국 대한 현대 등 3대 투신사는 한쪽으로는 정부의 압력, 다른 쪽으로는 수익률 제고라는 압박 속에 오히려 대우채 보유액을 늘려갔다.
한투의 한 전직 펀드매니저는 "금리를 2∼3%포인트 더 얹어주는 대우채를 외면하기 어려웠다"고 실토하기도 했다.
이들은 후에 공적자금을 수혈받게 되지만 여기에는 당국의 책임도 적지않다.
어떻든 대우 회사채는 가속적으로 정크본드가 되어갔다.
98년만해도 대우회사채 금리는 삼성 현대 LG보다 1%포인트 높았을 뿐이었지만 99년초 2∼3%포인트로 올라갔고 패망 직전엔 10%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얹어도 거래가 되지 않았다.
● 경쟁적 자살
금융기관들의 여신 회수가 본격화되자 다급해진 쪽은 이헌재 금감위원장과 금감원이었다.
치밀한 사전대책도 없이 대우를 부도낼 엄두부터가 나지 않았다.
99년 2월께부터 금감원은 대우 여신 동향에 대한 '1일 점검' 체제로 들어갔다.
김상훈 부원장과 허만조 신용감독국장이 대우 여신을 회수한 투신사 경영진에게 직접 전화해 호통을 치는 일도 다반사였다.
허 국장과 실무자들은 금융기관들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협박 반,애원 반으로 대우 여신을 만기연장해주라고 닦달했다.
금감원 19층 신용감독국에선 매일저녁 전화기 두대를 양쪽 귀에 대고 금융기관들을 독려해대는 직원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됐다.
당시 A투신 사장의 회고.
"99년 3월 하순쯤 펀드매니저의 실수로 만기가 된 대우채권 8백억원을 연장하지 못하는 우발사태가 벌어졌다. 저녁 7시30분께 회식자리로 금감원에서 전화가 왔다. '그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다'는 압력이었다. 단순 사무착오라고 해명했지만 금감원은 이후 우리 회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집중적으로 감시했다"
금감원도 할 말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사실 누구라도 할 말은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들의 주장은 "금융기관들이 앞다퉈 여신을 회수하기 시작하면 멀쩡한 기업도 죽을 판인데 왜 경쟁적으로 먼저 죽으려 하느냐"는 것이었다.
이 금감위원장이 말한 소위 경쟁적 자살행위기도 했다.
금감원의 일일점검은 대우를 워크아웃에 넣어 금융기관 채무를 동결시킨 8월26일까지 계속됐다.
서근우 금감위 심의관은 "대우가 워크아웃에 들어가서야 두발 뻗고 잤다"고 말했다.
금융권의 자금 회수는 대우의 세계전략 만큼이나 속전속결이었다.
[ 특별취재팀 : 정규재 경제부장(팀장) 오형규 이익원 최명수 조일훈 김용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