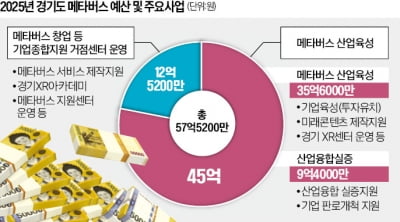'철철 넘치는 끼'...鐵 파는 미녀들 .. 동부제강 영업부 여성 6총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꽃이 아니라 쇠(鐵)를 파는 아가씨들".
그들은 당돌하기 짝이 없었다.
남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철강업계 영업직에 감히 자원했다.
전후좌우를 둘러봐도 거칠고 투박한 남자들뿐인 철강업계 영업직.
한마디로 "금녀구역"에 그들은 발을 들여놓았다.
주인공은 박혜원 김숙희 홍지선 정희경 이새롬 현승희씨.
동부제강 영업부의 당당한 철강 세일즈우먼이다.
그들이 동부제강의 문을 두드린 것은 지난 1월초.
윤대근 동부제강 사장이 콜럼부스적 발상으로 여성 영업사원을 선발키로 한데 따라 지원한 겁없는 신입사원들이다.
모두 96,97학번의 앳된 사회 초년병.
금속공학과 출신이라든지 뭔가 철강과 연결시킬 만한 구석은 한군데도 없다.
정치외교학 경영학 불문학 영어학 영어영문학 등을 전공했다.
입사직전까지만 해도 포항제철은 "제철"인데 왜 동부제강엔 "제강" 자가 붙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고개를 갸우뚱했던 왕초보들이었다.
이들의 입사 지원 소식이 전해지면서 회사안은 발칵 뒤집혔다.
특히 여사원을 받아본 적이 없는 일선 영업부서에선 난리가 났다.
"자동차나 보험영업도 아닌데..." "술접대는 어떡하고 야근은 어떻게 시키느냐" 등등 걱정이 태산같았다.
하물며 동부제강과 거래하는 수요처의 반응은 더했다.
"영업을 무슨 애들 장난으로 아느냐" "도대체 여자들을 어떻게 상대하라는 거냐"고.
과연 그럴까.
6총사의 의지와 야심은 강철보다 강하면 강했지 못하지 않다.
14명의 신입 여사원중 벌써 5명이 퇴사했지만 영업직에 자원한 그들중엔 한명의 낙오자도 없다.
수출영업부에서 아연도강판 제품을 담당하고 있는 김숙희씨는 "따분한 관리직보다 영업이 역동적이어서 지원했다"며 "영업직에 여자가 지원했다는게 뭐가 이상하냐, 정작 중요한 건 능력이 아니냐"고 당차게 되묻는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철강재를 사고 파는 정희경씨.
대학시절 동부제강 아산만 공장을 견학한 뒤 흠뻑 빠져 입사를 결심했단다.
"생산공장으로 순환근무도 시킨다는데..."라고 넌지시 으름장을 놓자 "경력이 쌓이면 해볼만 할 것"이라는 대답으로 말문을 막았다.
"생산현장 경험을 통해 제품라인이나 제품특성 등을 하나라도 더 알아야 더 잘 팔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내수 유통대리점 담당인 박혜원씨.
소주 2병쯤은 끄떡없다.
유통대리점에 대한 물량배분 등을 꼼꼼히 챙겨 나름대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우리 대리점은 제발 혜원씨가 맡게 해달라"고 대리점들로부터 로비가 들어올 정도다.
수출영업부 석도강판 제품을 담당하는 이새롬씨에겐 매월말이면 어김없이 야근이 찾아온다.
영업부서 특유의 월말 정산 작업이 산더미 같다.
오전 8시에 출근해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근무하는 26시간의 강행군이다.
그러나 웬걸.
"영업바닥에서 굴러봐야 어느 부서에 가든 잘할 수 있다"
똑 부러지는 그의 태도가 "여자가 과연 철강업계 영업을 제대로 해 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에 마침표를 찍는다.
중국 태국 등에서 쟁쟁한 여성 수입가들이 찾아올 땐 한껏 용기를 얻는다고 어깨를 으쓱거린다.
"여태까지 안 잘린 것 보면 자기몫 다한다는 증거 아니냐"
국내 석도강판 판매담당인 홍지선씨는 석도강판 "귀신"되기를 자처했다.
그에게 "장차 영업이사가 꿈이냐"고 묻는 것은 큰 실례다.
기왕에 시작했으니 장래 CEO(최고경영자)가 꿈이라는 것.
"고객의 클레임이 없고 수요예측이 맞아떨어지면 벌써 전문가가 다 된 기분"이라고 자랑한다.
동부제강 영업부의 "철의 여인들".
그들 6명은 철강업계 "여인천하"를 꿈꾸고 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