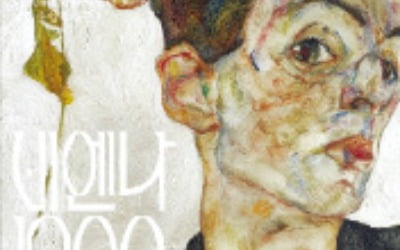[山中閑談] (9) '원담 스님(덕숭총림 방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만법(萬法)은 하나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그 하나는 무엇입니까"
"(엷은 미소와 함께 오른 주먹을 들어보이며)..."
"그게 무슨 뜻입니까"
"못 알아 듣겠으면 이리 와 봐(머리를 이리 대봐)"
하마터면 큰 꿀밤을 맞을 뻔 했다.
충남 예산의 덕숭산 수덕사 염화실(拈華室).
한국 선불교의 중흥조인 경허(1849~1912)스님과 만공(1871~1946) 스님의 선맥이 흐르는 덕숭총림 방장 원담(圓潭.75) 스님의 수행처다.
깨달음의 실체가 뭐냐고 묻자 원담 스님은 주먹을 들어 불립문자(不立文字)의 선지(禪旨)를 내보였다.
나다,너다 하는 분별과 집착을 끊어버린 자리가 견처(見處)라는 뜻으로 들렸다.
-스님은 어떤 화두를 들고 참선하셨습니까.
"일만법이 하나로 돌아갔으니 하나는 무엇인고(萬法歸一 一歸何處),그 뿐이여"
-참선을 통해 이른 견처는 어떤 곳입니까.
"못봤어.한 물건도 못봤어"
선지종찰(禪之宗刹)의 큰 어른에게 견처(깨친 자리)가 없다니….
뜨악한 표정을 짓고 있자 방장을 모시고 있는 시자 법보 스님이 "견성(見性)한 사람은 스스로 견성했노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귀띔해준다.
-그럼 선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요.
"한 물건도 볼 수 없는 곳을 찾는 것이 참선이지"
-그 곳이 참선으로 찾아집니까.
"그럼 찾아지지.
색(빛)에 물들지 않고,소리에 물들지 않고,냄새와 맛에도 물들지 않는 곳이 '한 물건'도 볼 수 없는 곳이야"
원담 스님은 여러가지 수행방법 중에서 참선만을 고집한다.
좋은 수행법이라며 이것저것 따지고 찾아다니는 것 자체가 "중생들의 망상일뿐"이라고 딱 자른다.
노장은 "만공 스님은 '달마가 견성하면 부처가 된다'고 했는데 경전이나 주력으로는 견성하기 어렵다"고 했다.
말이 나온 김에 만공 스님을 모셨던 이야기를 청하자 노장의 목소리가 더욱 커진다.
"만공 스님은 머리가 훌떡 벗어지고 키는 훌쩍 큰 분이었지.
다시 보기 어려운 대 선지식이요,대 도인이야.
그 어른의 가풍은 깊고 어렵거나 쉽고 편리한 데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그대로에 있어.
차 맛이 담담한 것처럼 언제나 여여(如如)한 그대로지.
무궁화꽃송이에 먹물을 묻혀 '세계일화(世界一花)'를 쓰시던 생각이 나는군.
세계는 한 송이 꽃이니 너와 내가 둘이 아니요,산천초목이 둘이 아니요,이 나라 저 나라가 둘이 아니라는 뜻이지"
노장이 출가한 건 12세 때다.
비구니였던 이모를 따라 수덕사에 왔다가 출가를 결심,만공 스님으로부터 사미계를 받았다.
5년간 만공 스님을 모시고 생사용단(生死勇斷)의 정진을 거듭해 마음자리가 허공과 같이 아무 것에도 끌리지 않고 물들지 않는 것임을 보았다.
이런 원담 스님에게 만공 스님은 '示眞性沙彌(시진성사미·진성사미에게 보이다)'라는 전법게를 내리고 법을 인가했다.
진성은 노장의 법명이고,원담은 법호(法號)다.
眞性本無性(진성본무성·참성품에는 본래 성품이 없고)
眞我元非我(진아원비아·참나는 원래 내가 아닐세)
無性非我法(무성비아법·성품도 없고 나도 아닌 인간이)
總攝一切行(총섭일체행·일체행을 모두 거두느니라)
선을 통해 생사를 초월할 수 있느냐고 묻자 노장은 주저없이 "물론"이라고 했다.
스스로 체험한 바 있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 잠도 자지 않고 수행하다 저승사자같은 괴물이 온 몸을 조여 죽음 직전까지 갔을 때 '만법귀일 일귀하처'의 화두를 들고 벗어났다는 것이다.
"화두를 들면 누가 나를 욕해도 화가 나지 않아.
내 마음 속에 미운 생각이 없으니 상대방이 싸우려해도 싸울 수가 없어.
일을 하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참선을 하면 미묘한 지혜가 생겨나.
내가 나를 찾으면 내 안의 갈등도,남과의 불화도 없어지고 안심(安心)의 경지에 이를 수 있어"
노장은 "나를 찾는 장소가 따로 있지 않다"며 "각자 자기 육신이 선방"이라고 강조했다.
참선은 깊은 산 속 선방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어디서든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얘기다.
노장에게 중생들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물었다.
"집착했기 때문이야.
아는 데 집착하고,모르는 데 집착하고,이런 건가 저런 건가 하며 분별해 내는 데 집착하고…"
노장은 "(자기를 찾지 않고)누구에게 의지해 복을 비는 것은 집착이며 미개구착(未開口錯)"이라고 했다.
흔히 선을 통한 깨달음,즉 불립문자의 경지를 말로 표현하면 원래 뜻을 그르친다는 의미로 개구즉착(開口卽錯)이라는 말을 쓰는데 누구에게 의지하겠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입을 열지 않고도 틀리게 된다는 뜻이다.
당대 최고의 선필(禪筆)로도 유명한 노장은 "공부할 땐 극악극독심(極惡極毒心)을 내야 한다"며 납자들을 혹독하게 다그치지만 손자뻘 되는 시자와 장난을 즐길 땐 천진불(天眞佛)같다.
사진을 찍기 위해 문밖으로 나올 때도 시자가 부축하자 "아야,아야야"라며 엄살(?)을 피웠다.
수덕사=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
![[이 아침의 화가] 작품 가장 비싼 생존작가…에드 루샤](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AA.39107774.3.jpg)
![[날씨] 월요일 출근길 눈·비…7일부터 '강추위'](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ZN.3910663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