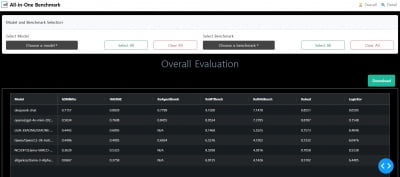['정치'를 바꿔야 '경제'가 산다] 1부 : (4) 건설업체 사장 푸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어느 건설업체 사장의 푸념 ]
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광고를 자세히 살펴보면 시공회사와 함께 '시행사'를 발견하게 된다.
시행사는 토지를 매입하고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건설공사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를 받는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다.
시행사는 일반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은 건설회사에 시공을 맡기는 대신 건설회사의 브랜드를 앞세워 분양에 나서는 게 일반적이다.
A사는 경기도 일산신도시 주변에서는 꽤나 알려진 시행사다.
A사 B 사장(41)은 95년초 시행회사를 설립, 실력을 인정받으면서 설립 2년만에 연간 1백억원안팎의 매출을 올렸다.
그에게 '정치권에 돈을 건네본 적이 있느냐'고 묻자 대답에 앞서 주위부터 살폈다.
그리곤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지난 97년 대통령 선거일(12월18일)을 한달쯤 앞둔 어느날이었다고 한다.
인.허가 업무 때문에 알고 지내는 구청 직원이 찾아와 "연말도 다가오는데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냈으면 좋겠다"며 성금 액수까지 제시했다.
'요구받은 성금액이 얼마냐'고 묻자 그는 다시 주위를 살폈다.
1천만원이라고 밝혔다.
B 사장은 구청직원이 다녀간후 같은 업계 사장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자 "선거철 아니냐, 나도 제의를 받았다"고 답했다고 했다.
B 사장은 결국 1천만원을 냈다.
당시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할 사안은 없었지만 돈을 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또 돈을 건네야만 할 것 같은 주변 분위기를 따를 수 밖에 없었다는게 B 사장의 솔직한 심정이다.
B 사장은 "당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란 명목으로 건넨 돈이 정치권으로 흘려들어갔을 것"이라고 지금도 확신하고 있다.
'떡값' 수준보다 금액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불우이웃돕기 모금시점도 아니었기 때문이라는게 그 이유다.
B 사장은 "우리같은 소규모 업체가 그랬다면 선거를 앞둔 당시에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돈을 냈겠냐"고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B 사장은 '성금제공' 사실을 잊어버리고 싶다며 얘기를 끊었다.
추가 질문에도 대답없이 손사래만 했다.
잠시의 침묵이 흐르는가 싶더니 그는 이렇게 물어왔다.
"앞으로도 선거때 마다 또 돈을 내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김호영 기자 h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