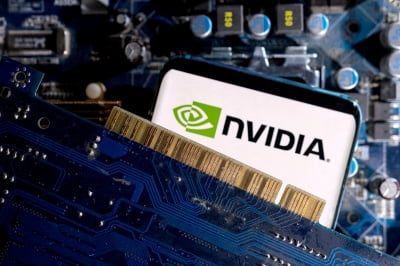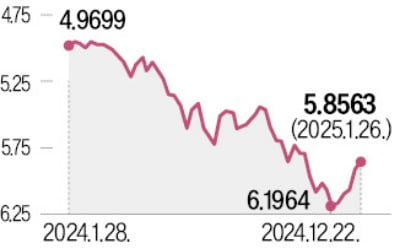[흔들리는 협상전선] (2) '수시로 바뀌는 협상팀'..실무팀 잦은 교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표로 나간 O국장은 부처통합 전 건설부 출신으로 교통문제는 제대로 알지 못했다. 이 때문에 실무 사무관이 그림자처럼 붙어 다녀야 했다. 반면 상대방은 국제항공 문제만 10년 이상 담당해온 ''전문가''였다. 그러니 처음부터 밀릴 수밖에 없었다"(건설교통부 관계자 몇년전 협상 회고)
이런 형편에서 한국은 아프리카 최빈국들과 나란히 항공안전 2등급 국가로 판정받는 수모까지 당했다.
협상단 대표는 종종 보직경력 불과 수개월짜리 국장,실무 사무관이랬자 불과 2년 남짓 관련업무를 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니 테이블 건너편에서 불쑥 제기되는 평범한 질문에 대응하느라 진땀을 흘리기 십상이었다.
협상결과는 보나마나.
"한국대표는 너무 자주 바뀌어 얼굴을 기억하기조차 힘들다"는 불평이 잇따라 들려오지만 그때 뿐.
각 부처 인사 때는 해묵은 관행이 되풀이 된다.
무슨 협상이든 한두달만 넘어가면 협상 담당자가 거의 바뀐다.
물론 이처럼 끊임없이 아마추어 협상가들이 양산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과장.국장급 정도만 되면 거의 모든 공무원들이 경력관리에 들어간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보다는 가급적 여러 개 보직을 두루 거쳐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이들을 괴롭힌다.
공직자 본인만 그런 것도 아니다.
조직(부처)에서도 "일 좀 한다"는 소위 에이스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력관리를 해준다.
이 과(課) 저 과로, 이 국(局) 저 국으로 자주 돌린다.
명분은 그럴듯하다.
순환근무를 통한 다양한 기회제공이 순환보직의 명분이다.
''제너널리스트가 되어야 차관도 되고 장관도 바라본다''
''스페셜리스트''는 누구도 원치 않는다.
특별한 수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승진인사에서도 자칫 찬밥이다.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갈 길도 별로 없다.
직위가 높아질수록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하다.
때문에 적당히 요직 위주로 경력을 걸친다.
현안에 대해서는 대충 소제목 정도만 파악할 만하면 다른 부서로 옮기려 애쓴다.
이번 현투증권-AIG컨소시엄 협상에서도 그랬다.
협상을 진두지휘해온 진동수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1급상당 공무원)은 협상을 한창 진행해 오다 지난해 7월 미국 워싱턴의 세계은행으로 파견 나갔다.
8월 체결된 양해각서(MOU)를 한달여 남겨둔 시점.
양측이 현투증권 등 3사에 대한 실사를 벌이는 등 막바지 협상이 속도를 더해 가던 때였다.
당시 진 위원 스스로도 파견근무를 원했고 조직(금감위)에서도 이를 원하는 상황이었다.
당장 1급 한자리가 더 생기면서 줄줄이 승진하면 여러사람이 덕을 보기 때문이었다.
뒤이어 이 자리를 이어받아 현투증권 매각을 지휘한 강권석 증선위원도 마찬가지.
지난해 12월 중순쯤부터 강 위원이 금융감독원 부원장으로 내정됐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양측의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 새해초에는 결실이 나올 것"이라는 당국자들의 장밋빛 전망이 이어질 때였다.
되돌아보면 AIG측은 내심 철수를 염두에 두고 퇴로를 모색하던 시점이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실제로 강 위원은 소문대로 최근 금감원 부원장으로 임명됐다.
당장의 협상보다는 ''승진자리 새로 하나 확보하는것''이 개인과 조직의 발전(?)에 더 중요했던 셈이다.
국제협상을 우습게 여기다 보니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진다.
산업자원부 K모 실장은 지난 19일 ''에너지 수출입국가 전문가회의''라는 국제회의에 참석하려 출국했으나 현지에 나가서야 행사가 1주일 연기된 것을 알고 하루만에 귀국하는 촌극까지 벌였다.
산하기관도 관을 따라하기는 매한가지다.
자산관리공사는 지난해 11월초 한보철강 재입찰준비를 하면서 당담 임원과 부장을 전원 교체했다.
한달뒤인 12월초에는 매각본부장과 담당팀장까지 바꿨다.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조(兆)규모의 자산을 팔면서 담당라인이 대거 바뀐 것.
대우자동차 매각을 맡은 산업은행도 마찬가지였다.
2000년 6월 포드와 우선협상때는 이근영 총재가, 2000년 9월 포드가 인수포기때는 엄낙용 총재가, 지난해 10월 GM과 MOU체결때는 정건용 총재가 대우차 매각 책임을 맡고 있었다.
그러니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턱이 없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