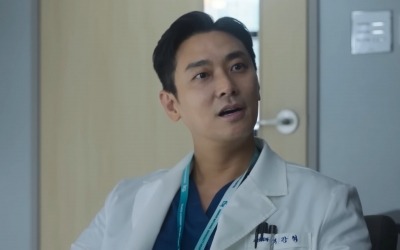미국 백악관의 올해 예산편성을 보면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지난해 무역적자가 4천억달러를 넘어선 점을 감안하면 미국은 다시 ''쌍둥이 적자(twin deficit)''시대를 맞게 되는 셈이다.
미국의 재정수지는 98회계연도부터 흑자를 보여 한때 흑자규모가 2천억달러를 넘기도 했다.
물론 백악관은 2004회계연도부터 다시 흑자로 반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미 의회예산국(CBO)은 2011회계연도까지 계획했던 3조4천억달러의 흑자규모를 1조6천억달러로 대폭 내려잡고 있다.
이처럼 재정수지가 당초 예상보다 빨리 악화되는 데에는 경기침체 요인이 가장 크다.
미국처럼 세수탄력도가 0.8 이상인 상태에서 지난해 이후 경제성장률은 1∼2%대로 재정흑자를 기록할 당시 4%대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부시 정부의 경제정책도 한몫 하고 있다. 정부의 경제간섭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를 지향했던 클린턴 시절과 달리 부시는 ''큰 정부(big government)''를 선호해 왔기 때문이다.
◇재정적자로 골치앓는 세계=재정적자는 비단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2000년 하반기 이후 지속된 세계경기 침체의 후유증이 본격화되면서 대부분 국가가 재정적자 문제로 골치를 썩이고 있다.
앞으로 세계증시를 포함한 국제금융시장의 많은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은 일본이다.
93년 하반기 이후 지속해온 대규모 경기부양대책으로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11%에 달하고 있다.
누적된 재정적자로 정부부채도 GDP의 1백32%다.
이는 세계최고 수준이다.
유럽도 재정적자가 한때 GDP의 1∼2%수준까지 개선돼 왔으나 경기가 가라앉기 시작한 지난해부터 다시 악화되고 있다.
일부 회원국은 GDP의 4%대까지 악화돼 유로존 참여때 충족시켰던 경제수렴조건을 위반하고 있는 상태다.
정도차가 있으나 개도국들은 선진국보다 사정이 더 안좋다.
◇재정적자에 따른 부작용=올 회계연도를 기점으로 미국의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경우 먼저 국채를 만기 이전에 상환하는 조기상환(buy-back)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CBO는 재정흑자를 이용해 오는 2010회계연도까지 약 10조달러에 이르는 국채를 조기에 상환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반면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올 회계연도의 경우 약 1천억달러 정도의 국채를 새로 발행해야 부시 정부의 재정계획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다.
물론 국채가 신규로 발행되면 미국의 시중금리는 장기금리를 중심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점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통화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효율적인 금리체계(interest system)를 유지할 의무를 갖고 있는 그린스펀 의장으로서는 장기금리가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정책금리를 내리는 우(愚)를 범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조만간 미국금리가 인상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완만한 경기와 증시회복=이런 여건들이 미국증시를 포함한 세계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일부에서는 이번 미국증시의 상승국면을 98년 9월말 미국의 금리인하 이후 약 2년 반동안 급등했던 시절과 비교하는 시각이 많다.
유념해야 할 것은 98년 9월말 이후에는 금리인하로 시중의 자금이 풍부한 상태에서 재정흑자가 유지돼 금리가 증시에 부담을 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수확체증의 법칙이 적용돼 경기가 상승하면 누적적인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정보기술(IT) 업종이 경제성장을 주도해 증시가 급등할 수밖에 없는 3박자가 갖춰진 상태였다.
반면 이번에는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경우 먼저 금리가 증시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시의 산업정책도 IT업종을 강조하는 신경제(new economy)에서 전통적인 제조업과 균형을 중시하는 융합경제(fusion economy)를 지향하고 있어 경기상승의 탄력과 속도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이번에는 ''V자형 경기회복과 증시급등론''보다는 ''U자형 경기회복과 완만하지만 장기간에 걸친 증시상승론''에 더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전문위원 schan@hankyung.com
- 글자크기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글자행간
-
- 1단계
- 2단계
- 3단계
공유하기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트위치 철수 효과 끝났나"…치지직에 밀린 SOOP 내리막길 [진영기의 찐개미 찐투자]](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99.39367791.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