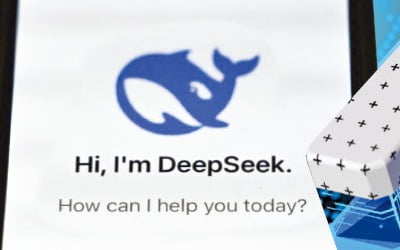[지방 테크노파크] 지역 일꾼들 : 이종현 <경북대 전자공대 교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테크노파크가 지방경제의 새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테크노파크란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차세대 특화산업단지를 지방특성에 맞게 곳곳에 육성하는 전략프로젝트.
지난 1997년말 산업자원부 주도로 추진됐으나 외환위기로 지지부진하다 벤처붐에 이어 경기가 호전되고 있는 요즈음 새삼 각광받고 있다.
자기지방의 미래가 걸린 테크노파크에 열정을 쏟는 일꾼을 소개한다.
-----------------------------------------------------------------
이종현 경북대 전자공대 교수(전 대구테크노파크 단장).
테크노파크란 명칭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주인공이다.
지난 94년 발표한 '국책공과대학육성 사업 보고서'가 정부에 채택되면서 보고서의 핵심인 '테크노파크 조성'이 국책과제가 된 것.
국내에서 테크노파크 조성 사업이 시작될 즈음인 지난 97년.
이 전 단장은 일본의 '가나가와 사이언스파크'와 영국의 '맨체스터 리스치파크' 등 20여개의 해외 테크노파크를 둘러봤다.
하지만 지역성이 유달리 강한 한국에 맞는 모델을 찾기는 힘들었다.
이 교수는 독자 모델 개발에 나섰다.
결과물이 바로 '파이플랜'.
동대구벤처밸리와 성서공단내 첨단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대학의 창업보육센터와 연구실을 함께 엮는 것을 골자로 한 이 플랜은 일본 중국 프랑스 등지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과학은 국적이 없지만 공학은 국적이 있어야 한다"는 이 교수의 평소 지론이 구현된 셈이었다.
지난 85년 프랑스 모대학 교수로 재직할 당시 자신이 연구한 반도체 기술이 프랑스 기업들에 이용되는 것을 보면서 귀국을 앞당기기로 결심하게 된다.
이 교수는 지난 90년 남들이 부러워하는 외국 교수직을 버리고 귀국했다.
경북대학 전자공대에 자리를 잡은 이 교수는 대학 주변에 별도 사무실을 차리고 젊은 교수들과 함께 'CATS'라는 벤처기업을 창업, 10여가지의 새로운 아이템을 쏟아냈다.
이중엔 LG하니웰과 함께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빌딩자동관리시스템'도 포함돼 있다.
이 교수는 '컴텍스' 'TIOS' 등의 기업을 설립하는 한편 경북대 내에 10여개의 '캠퍼스 벤처'를 만들기도 했다.
캠퍼스 벤처 역시 국내에선 이 교수가 처음 시작한 것이다.
이 교수는 지난 97년 대구테크노파크의 초대단장으로 임명돼 4년간 활동했다.
오는 11월 대구에서 열리는 '2002 아시아 사이언스파크협의회(ASPA 2002)'의 대회장직을 맡고 있다.
이 교수는 "ASPA를 통해 한국이 전 세계 벤처기업의 중심이 되도록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대구=신경원 기자 shi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