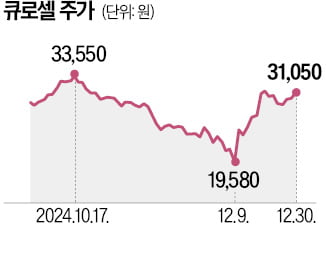['KT 민영화' 카운트 다운] (4) 바람직한 지배구조..포스코式 대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KT(옛 한국통신) 민영화의 핵심은 민영화뒤 누가 경영권을 쥐느냐란 문제로 집약된다.
정부 보유지분(28.37%)를 모두 팔고나면 KT 경영권은 시장에 맡겨야 할 일이라는 게 정부의 표면적 입장이다.
하지만 내심은 3~4개 대기업이 대주주로 참여하고 전문경영인이 경영을 책임지는 구조를 바라고 있다.
포스코(옛 포항제철)와 비슷한 소유.지배구조다.
KT의 덩치(자산기준 국내6위)가 워낙 커 특정 대기업이 경영권을 장악한다면 국민경제적으로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게 정부의 우려다.
정보통신부의 한 관계자는 "포스코처럼 완전 민영화하되 전문경영인이 경영을 맡는 방식이 경영효율성도 높이고 경제력 집중문제도 풀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포스코의 지배구조=포스코는 2000년 완전 민영화를 통해 국내 기업 중 가장 선진적 소유구조를 갖추게 됐다.
포항공대(3.24%) 포철교육재단(0.32%) 포철장학회(0.03%) 등이 최대주주다.
또 이사회 멤버(15명) 중 사외이사가 8명으로 절반을 넘고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돼 최고경영자(CEO)가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돕는다.
증권거래법 자체가 강력한 경영 견제장치를 요구하고 있어 그렇긴 하지만 포스코는 세계 어떤 기업과 비교해도 우수한 분산형 소유·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글로벌기업인 미국 GE도 2∼3% 지분을 갖고 있는 3개 기업이,AT&T도 3∼4% 지분을 가진 3개 대주주가 최대주주다.
IBM도 비슷한 수준이다.
◆견제장치 필요=전문가들은 공공적 특성이 강한 KT가 완전 민영화돼도 경제력 집중문제를 풀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부의 희망과는 달리 이번 정부 지분 매각에서 한 대기업이 10% 이상을 매입,1대주주로 부상하더라도 지배주주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지배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얘기다.
KT는 현재 13명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주주협의회와 각종 전문위원회의 견해를 구한 다음 중요 경영 의사결정을 내리고 CEO는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금까진 정부의 입김에 의해 경영이 좌지우지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영화 이후 이같은 지배구조가 명실상부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특히 사외이사의 역할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외이사 수를 현재(13명 중 7명)보다 2명 이상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이런 맥락이다.
미국 대기업의 경우 이사회 인원의 70∼90%가 사외이사다.
이와 함께 외국인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
또 CEO 보상과 관련,조성훈 한국증권연구원 연구위원은 "CEO의 개인적 이익과 기업가치를 일치시키기 위해 스톡옵션이나 제한부주식 등 주식을 이용한 보상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배구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사회와 CEO 외에 경쟁적 시장,규제권을 갖고 있는 정부,주주 등 3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 3자가 KT 경영을 적극 감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도 KT 민영화 성공의 한 조건이다.
오수근 이화여대 교수는 "경영진의 횡령이나 배임문제에 대해 주주들이 소송을 거는 사례가 많아지는 등 주주의 경영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다"며 "정부도 민영화 이후 제3자 입장에서 KT 경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규호 기자 sein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