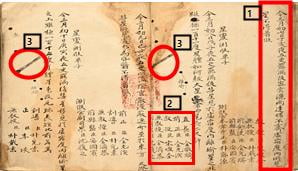[탈모증] 심은 머리카락 90% 이상 '쑥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30대인 K씨(서울 강남구 대치동)는 고민에 빠져 있다.
아침에 깨어나 베개 밑에 쌓인 머리칼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탈모증 탓에 아내와 함께 외출하는 것도 신경이 쓰인다.
갈수록 줄어가는 머리숱을 매만지며 마지막 남은 한 가닥이라도 지켜보겠다며 한약 양약을 복용하고 민간요법도 받아봤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탈모를 중단시킬 방법은 없는가.
머리카락을 심어 대머리 신세를 아예 벗어나게 할 수는 없을까.
최근 유행하고 있는 모발이식에 대해 알아본다.
◆ 왜 모발이식인가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공인한 탈모증치료제는 바르는 '미녹시딜'과 먹는 '피나스테라이드'이다.
이들 약은 정수리 부분에는 효과가 좋지만 앞머리쪽에는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성욱 서울 신사동 네오성형외과 원장은 "탈모치료제를 복용한 환자의 10% 정도에서만 앞머리에 모발이 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미용상 가장 중요한 것은 탈모증 환자의 앞머리 부분이므로 모발이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약물요법은 기대한 만큼 굵은 성모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약을 끊으면 수개월 후에 머리칼이 빠지거나 약해지는 증상을 보인다.
탈모증이 오래 돼 모발의 영양공급원이며 지지체인 모낭이 많이 상해 있을 경우 약물요법의 효과가 떨어진다.
따라서 반영구적인 치료효과를 얻기 위해 모발이식을 택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대머리 처방으로 가장 확실한 것은 역시 모발이식이라는 것.
◆ 모발이식의 과정 =건강한 모낭을 함유한 뒷머리의 피부조각을 떼어내 탈모가 일어난 부위에 이식한다.
뒷머리나 옆머리는 쉽게 탈모가 되지 않는데 이는 탈모를 유발하는 남성호르몬의 일종인 DHT가 앞머리와 정수리에 더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년에도 빠지지 않는 뒷머리카락을 이식하면 어디로 옮기더라도 원래 있던 뒷머리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한다.
모발이식은 잔디를 떼듯 정상모를 두피와 함께 띠모양으로 절개한뒤 모심듯이 탈모부위에 심는다.
머리카락 하나를 심는데 3천원이 들지만 최근에는 수술비용이 많이 떨어졌다.
병원에서 3천∼4천카락을 심는데 4백만∼1천만원 정도가 든다.
문제는 이식한 모발이 과연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느냐는 것.
심은 머리카락은 수술 후 2주가 되면서 서서히 빠지기 시작해 4∼5개월이 지나면 거의 다 탈락된다.
이중 10∼30%는 아예 빠져버리고 70∼90%는 다시 자라나기 시작한다.
많은 환자들이 불안해 하면서도 새로 자라나는 머리카락을 보고 신기하게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모발이식을 하려면 뒷머리의 두피를 넓게 벗기고 봉합하기 때문에 수술로 인한 출혈과 통증을 감수해야 한다.
뒷머리는 자라난 머리칼로 덮여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없다.
뒷머리 숱이 적으면 많이 이식하고 싶어도 마음껏 심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뒷머리는 직모이지만 이식한 앞부분의 머리는 반곱슬이 되는 수도 있다.
이식 후에는 발모효과를 높이기 위해 피나스테라이드를 복용하기도 한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