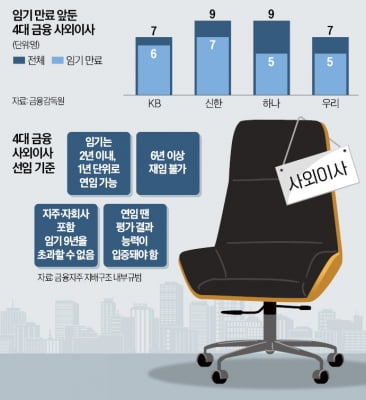"소니가 없어도 사는데는 지장이 없죠.소니의 주력사업은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부르는 반도체도,냉장고 세탁기 같은 기본 아이템도 아니니까요"
이명우 소니코리아 사장은 소니를 "즐거움"으로 정의한다.
이 사장은 "약간 비싸지만 분위기 좋고 특별한 경험을 주는 레스토랑 같은 존재"라는 말로 소니를 설명했다.
워크맨이 대표적인 사례다.
소니의 워크맨은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기능이 아니라 걸으면서 즐길 수 있다는 "플러스 알파"를 삶에 추가했다.
이 사장은 마찬가지로 엔터테인먼트기기 "바이오"를 노트북PC라고 부르기를 꺼린다.
바이오를 AV(오디오비디오)와 IT(정보기술)의 결합체로 보기 때문이다.
올해안에 책상 위에 설치하는 "바이오"도 국내 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다.
이처럼 소니 브랜드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진 이 사장이 삼성전자 북미 가전사업 총괄담당에서 소니코리아로 옮긴지 반년이 됐다.
소니코리아는 이후 많이 변했다.
장병석 명예회장이 첫 한국인 최고경영자로서 임기 2년간 "한국화"의 초석을 닦았다면 이 사장은 "글로벌화"로 이를 진화시켰다.
일본어 대신 영어가 회의석상의 공식 언어가 됐고 홍보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전략을 공표하는 데도 적극적이다.
"올해는 AS인프라를 강화하고 신상품 출시 시기를 일본과 맞춰 "타임 투 코리안마켓"을 실현할 것입니다" 소니코리아는 오는 8월 서울 강남에 AS센터를 새로 지을 계획이다.
현재 영등포에 AS본부를 갖고 있지만 소비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곳에 AS의 중심을 두기 위해서다.
소니 제품을 집중적으로 사는 고객에 대해선 별도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AS핫라인"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사실 지금까지 소비자가 느끼는 소니코리아의 AS는 만족스런 수준이 아니었다.
병행수입(외국에서 적법하게 유통되는 상품을 수입업자가 국내 상표권자 허락없이 들여오는 것)이나 밀수를 통해 소니 제품을 사용하거나 이삿짐으로 들여온 소비자가 워낙 많지만 이들은 무상 수리를 못받고 부품을 공수해오느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많다.
현재 소니코리아에 AS 의뢰가 들어오는 제품중 55% 이상은 소니코리아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회사측은 추정하고 있다.
이 사장은 "이 때문에 소니코리아가 마케팅의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광고 집행과 매출 확대 전략 이전에 유통부문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상적인 유통을 장려하기 위해 소니코리아를 통해 구입한 제품과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한 AS를 구별(differentiate)할 방침이다.
이 사장은 하지만 차별(discriminate)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소니코리아를 통해 구입한 상품에 대해서만 무상 수리를 해 주고 있지만 아닌 경우에 대해서도 소비자에게 최대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겠다는 것.이를 위해 AS요원 80여명을 최근 에버랜드내 서비스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게 했다.
"타임 투 코리안 마켓"도 병행수입과 밀수를 억제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다.
일본과 한국에서 동시에 상품을 출시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
여전히 일본에서 시판된지 6개월 후에나 한국에 늦깍이로 출시되는 경우가 있지만 올해안에 3개월 안으로 시차를 줄일 계획이다.
소니코리아는 지난해 반도체 부품 부문의 부진으로 소비가전과 방송용장비 부문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매출 성장률이 저조했다.
하지만 올해는 반도체 부품을 비롯한 전 부문에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3월까지 연간매출은 5천9백66억원이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
- 글자크기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글자행간
-
- 1단계
- 2단계
- 3단계
공유하기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