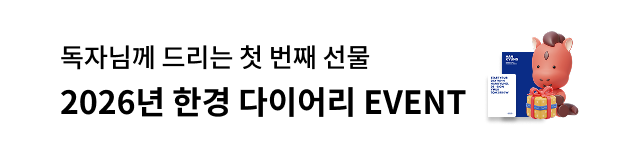남자가 생리를 한다면!
미국의 여성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넘은 "남자가 월경을 한다면"이란 저서에서 남자가 생리를 하면 생리통 연구를 전담하는 국립월경불순연구소가 설립되고,의회는 생리통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막는다며 연구비 예산을 책정하고,의사들은 심장마비보다 생리통 치료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마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것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생리는 여자의 몫이다.
생리는 가임의 상징인 만큼 그 중요성에 대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남성 중심사회는 오랫동안 남녀 모두 월경을 불결한 것,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기게끔 만들었다.
국내에선 지난 94년까지 생리대의 TV광고가 금지되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
국내에 휴대용 생리대가 나온 건 불과 30년 전인 1971년.
유한킴벌리의 '코텍스'가 시초였다.
1차 세계대전중 간호사들이 외과용 패드를 이용한 데서 규격형 생리대가 탄생된 지 반세기가 지나서였다.
그때까지 우리 여성들에게 생리는 고역 그 자체일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삶아서 부드럽게 만들었다고 해도 소창의 뻣뻣한 재질은 살갗을 부풀게 만들고 장시간 밖에 있을 경우 옆으로 샐까 봐 안절부절하는 건 물론 냄새때문에 얼굴을 붉히기 일쑤였다.
이러던 중에 나온 코텍스는 "누가 여성을 해방시켜 주는가"라는 광고문구를 빌릴 것도 없이 수많은 여성들을 자유롭게 했다.
생리대를 파는 약국이나 가게에 남자가 서있으면 달라고 하기가 영 민망해 쭈볏거리긴 했지만 그래도 쑥스러움이 편리함을 대체할 순 없었다.
물론 품질은 미흡했다.
흡수성이 떨어져 조금만 오래 돼도 새거나 끈적거리고 심한 이물감을 느끼게 하는가 하면 걸핏하면 솜층이 분리돼 너덜거렸다.
생리대에 획기적 변화가 생긴 건 89년 P&G가 국내 최초로 날개 달린 생리대 "위스퍼"를 내놓으면서부터다.
위스퍼에 밀린 유한킴벌리가 94년 '화이트'를 시판하면서 시장을 재탈환한 데 이어 99년 "좋은 느낌"을 내놓고,여기에 대한펄프(매직스 오키도키)와 유니참(쏘피)등 다른 업체가 가세하면서 생리대 전체가 달라졌다.
그 결과 생리대는 몰라보게 좋아졌다.
패드의 두께는 얇아진 반면 흡수력이 향상돼 기저귀 찬 듯한 느낌은 물론 새거나 흘러내리는 것도 적어지고 냄새도 대폭 감소됐다.
그러나 아직도 여성들은 한달중 적게는 3~4일 길게는 1주일이상 불편하고 불안하다.
게다가 생리나 생리대에 대한 공개적 논의나 주장은 여전히 꺼려진다.
물론 생리대의 경우 사용자에 따라 반응도 다르다.
상대적으로 약간 두툼한 게 편안하다는 사람도 있고 얇은 걸 선호하는 쪽도 있다.
젊은층은 팬티에 착 붙는 느낌과 뒷부분이 넓은 오버나이트가 좋다고 하고,약간 나이든 층은 면 느낌을 주는 제품이 낫다고 한다.
어쨌거나 생리대는 되도록 얇으면서도 빨리 흡수돼야 뜨뜻하고 축축한 이물감이 없다.
오래 착용하고 있어도 패드가 들뜨거나 뭉치지 않고 답답하거나 끈적이는 느낌 또한 없어야 한다.
흡수력과 착용감 외에 접착력과 포장도 중요하다.
팬티라이너 제품 가운데는 접착력이 약해 떨어지거나 도중에 접히는 게 있다.
내 경우 개인적으로 "좋은느낌"의 부드러운 느낌을 좋아하지만 포장을 뜯을 때마다 표시된 부분이 제대로 안뜯겨 언짢다.
젊은층 가운데는 너무 두툼하고 곡선 없이 획일화된 형태가 부담스럽다고도 얘기한다.
유한킴벌리가 "화이트"로 "위스퍼"에 빼앗겼던 고객을 되찾고 전체 시장의 50%이상을 유지하게 된 데는 다양한 기업이미지 제고와 마케팅도 한몫 했다지만 무엇보다 생리대의 감촉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남자임원이 볼에 생리대를 붙여보는 등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려는 치열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땅의 여성 모두가 "그날"인 사실조차 잊고 지낼 수 있는 생리대가 나오기를 기다려 본다.
박성희 논설위원 psh77@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