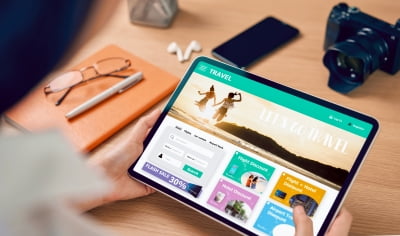증권사에는 두 부류의 영업사원이 일한다.
은행 투신 보험사 등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법인 브로커와 개인투자자를 상대하는 개인 브로커가 그들이다.
주식을 사고 팔아주면서 받는 수수료가 증권사의 가장 큰 수입원이라는 점에서 영업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능력만 있다면 수억대의 연봉을 받을 수도 있다.
법인 브로커는 본사에 근무하면서 기관 고객을 상대로 서비스한다.
기관고객이 브로커에게 주문을 내면 그에 따른 수수료가 떨어진다.
법인 브로커는 대부분 아침 6시30분께 출근, 전날 미국 증시 소식, 뉴스 등을 종합해 단골 기관고객에게 메신저를 통해 알려준다.
오전 7시~8시 사이에는 애널리스트 투자전략가 국제영업팀 등과 아침회의(홍콩, 뉴욕 현지법인과 연결해 생생한 현지소식을 듣기도 함)를 한 뒤 당일 이슈와 추천종목, 시황 등을 정리해 장이 열리기 전에 고객에 전해준다.
증시가 열리는 시간에도 각종 정보를 기관고객에게 빠르게 전달해야 한다.
이러느라 점심도 도시락으로 때우는 경우가 허다하다.
장이 끝나면 본격적인 영업이 시작된다.
기관을 찾아다니거나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매니저와 함께 기업탐방, 투자설명회, 기업설명회(IR) 등에 참석한다.
퇴근한 뒤에도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뉴스를 체크하고 밤 늦게까지 미국 증시를 본다.
그야말로 쉴 틈없이 빡빡한 생활이다.
한 법인 브로커는 "대규모 주문을 받을 때나 추천한 종목에서 큰 수익률이 나서 펀드 수익률이 좋아졌다는 말을 들을 때 열심히 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개인 브로커는 증권사에 가장 많은 직종이다.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법인브로커와 같으나 영업대상이 개인투자자라는 점이 다르다.
통상적으로 아침 7시께 출근해서 경제신문, 증권관련 인터넷사이트 등을 체크한 뒤 아침회의를 거쳐 추천종목을 정한다.
그 다음부터는 고객과의 이어지는 전화통화.
고객의 수가 많으니 손이 바쁘다.
특히 시장이 요동치는 날엔 장이 끝나고 밤 늦게까지도 고객과 대화를 나눈다.
장이 뜰때는 덩달아 기쁘지만 하락장에선 고객과 함께 가슴아파하기도 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 글자크기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글자행간
-
- 1단계
- 2단계
- 3단계
공유하기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지금이 기회" 이더리움 싹쓸이…트럼프 일가는 달랐다 [암호화폐 AtoZ]](https://img.hankyung.com/photo/202502/AA.38757505.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