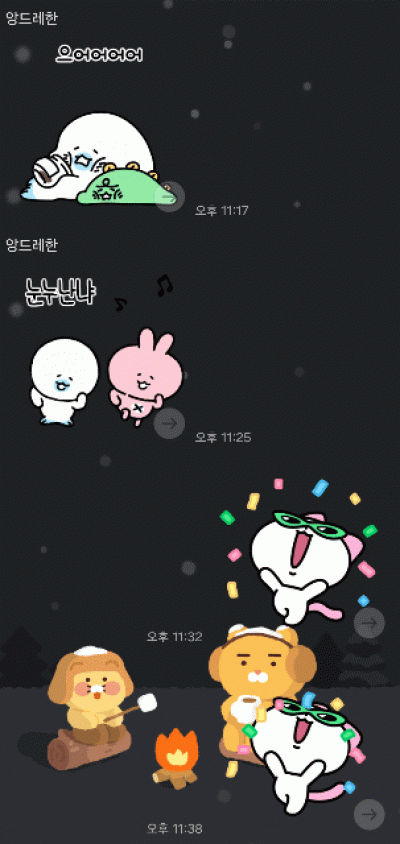[STRONG KOREA] 제1주제 : '이공계'를 살리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KAIST(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최성민 교수(38)는 지난 5월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부터 뜻밖의 편지를 받았다.
"과학자들이 국가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는데도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선생님께 들었다"며 위로하는 내용이었다.
위문편지를 받은 것이다.
과학기술분야 최고 두뇌집단이 초등학생들로 부터 위로의 글을 받아야하는 상황에 몰린 셈이다.
이공계 위기의 징후가 감지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학입시 지망생 가운데 자연계 비율은 20%대로 곤두박질쳤다.
고시공부에 매달리고 있는 서울대 공대 출신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서울대 이공계 대학원이 정원에 미달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서울대 공대 또한 3차례 모집끝에 간신히 정원을 채웠다.
◇ 테크노 헤게모니 시대 =이공계 위기를 더 이상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
과학기술과 고급두뇌가 나라의 운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게이오대 국제정치학교수(공대 출신) 야쿠시지 타이조는 '국가는 기술로 흥하고 망한다'는 '테크노 헤게모니론'을 통해 기술의 실체를 파헤쳤다.
결정적 인자는 다름아닌 인력이었다.
팍스 아메리카나시대도 우수인력의 이동에서 비롯됐다.
2차대전때 히틀러가 전선에 내보내지 않으려 했던 인력도 과학기술자였다.
미국과 맞섰던 구 소련(팍스 소비에티카)의 권위와 군사력도 과학기술 인력에서 나왔다.
57년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호 발사는 미국에 엄청난 충격을 줬다.
미국은 이공계 교육혁신으로 맞대응했다.
70∼80년대 일본이 뜨고 신흥공업국이 기지개를 켠 것도 이공계 인력에서 비롯됐다.
팍스 니포니카시대를 꿈꿨던 일본이 90년대 '잃어버린 10년'을 맞게된 것도 이공계 기피에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지금 나서야 한다 =이공계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과학기술분야의 고급두뇌 이탈도 가속화하고 있다.
스위스 IM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급두뇌가 국내에 남아 있기를 희망하는 정도인 두뇌유출지수가 4.70으로 나타났다.
수치 '10'은 전원이 국내에 남기를 희망하는 것이며 '1'은 전원이 빠져 나가려고 하는 것이다.
이미 유출쪽으로 기울어졌다는 얘기다.
미국도 '내부의 두뇌결핍'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다.
미래기술인 6T(정보 생명 나노 환경 우주 문화) 분야 인력의 질은 둘째치더라도 오는 2005년까지 18만6천명이 부족할 전망이다.
맥켄지컨설팅의 굽타 CEO는 "21세기는 인재확보 전쟁(The War for Talents)의 시대"라고 했다.
우수 이공계 인력이 국가의 명운을 좌우한다.
이공계 문제를 더이상 내버려 둘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안현실 논설ㆍ전문위원 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
--------------------------------------------------------------
< 특별 취재팀 >
팀장 =김경식 과학바이오팀장
팀원 =오춘호차장 최승욱차장 정종태 송태형 장경영기자(산업부 과학바이오팀) 조정애(산업부 생활경제팀) 박해영(경제부 금융팀) 송대섭(증권부) 장원락기자(산업부 IT팀) 김영우차장 허문찬기자(영상정보부)
해외특파원 =양승득(도쿄) 고광철(워싱턴) 정건수(실리콘밸리) 육동인(뉴욕) 강혜구(파리) 한우덕(베이징)
자문 =안현실 논설위원겸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