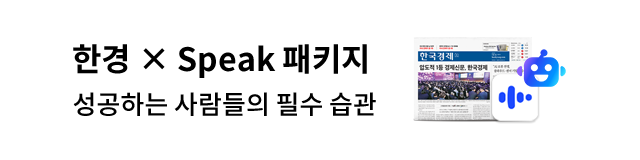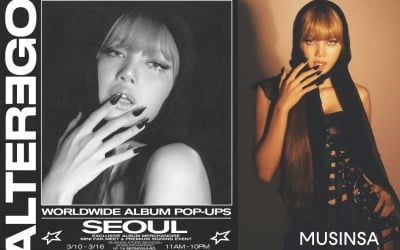'동북아 물류거점 자리를 확보해야 21세기 경제강국으로 도약한다.'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3개국이 물류 허브(hub)국가 자리를 놓고 사활을 건 한판 승부를 펼치고 있다.
한.중.일 3국이 동북아 물류허브를 표방하는 이유는 다국적 기업의 물류센터를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서다.
다국적 기업들이 물류센터를 세우면 공항 항만 등에서 환적 수수료를 거둬들여 경제적 이득을 챙길 수 있다.
물류센터 배후지역은 금융 정보통신 레저 등 고부가가치산업이 발달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다국적 기업 물류센터를 유치하면 관련 산업을 통째로 받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거두는 셈이다.
이런 계산법에 따라 동북아 3개국은 물류인프라 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재 동북아에는 아시아 전체를 총괄하는 물류센터를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이 하나도 없는 상태다.
그러나 다국적 기업 입장에서 동북아에 물류센터를 건설해야 할 필요성은 커져만 가고 있다.
한.중.일 3개국에서 다국적 기업의 숫자가 늘어나고 역내 무역량은 북미와 유럽 수준을 웃돌며 물류량도 중심축이 북미와 유럽에서 동북아로 옮겨가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다국적 기업은 최근 고객들의 다양한 소비패턴에 맞춰 제품 조립을 최대한 늦추다가 소비자의 요구사항에 맞춰 즉시 조립.배달하는 이른바 '연기전략(postponement configuration)'을 구사하고 있다.
바로 이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전략을 제대로 구사하려면 최종 소비지에 물류센터를 갖고 있어야만 한다.
다국적 기업들이 시장이 급팽창하고 있는 동북아에 조만간 물류센터를 건설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은 바로 여기서 비롯된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경쟁국인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은 항공과 선박을 연계해 물류거점으로서의 메리트를 극대화하려고 노력중이다.
홍콩은 첵랍콕 공항과 1천4백65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를 처리하는 홍콩항이 맞닿아 있다.
이점을 활용해 공항 근처에 선박 접안 컨테이너를 건설했으며 공항과 항만 관리권도 일원화했다.
일본도 나리타공항과 2백9만TEU를 처리하는 고베항이 연계돼 있다.
간사이공항은 2백20만TEU를 처리하는 간사이항과 연계망을 확보해 선박과 항공간 운송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최근에는 고베항의 화물 운송시간을 줄이기 위해 고베공항을 건설하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싱가포르는 창이공항과 1천5백10만TEU를 처리하는 싱가포르항만이 상호 운송연계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밖에 타이완도 가오슝 항만과 근처 공항의 운영을 통합했다.
경쟁국들은 공항이나 항만 인근에 자유무역지대를 운영하고 있다.
홍콩은 국가 전체가 자유무역지대로 지정돼 있다.
현재 첵랍콕 공항 안에 HACTL(Hong Kong Air Cargo Terminal)이라는 대규모 화물터미널이 있고 주변에 항만과 화물을 모두 취급하는 창고들이 발달돼 있다.
싱가포르는 창이공항 내 14만2천4백평 규모의 항공터미널지역 전체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 항공화물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싱가포르 항만 안에도 자유무역지대를 운영 중이다.
우리 정부도 최근 수도권을 '동북아 허브'의 전진기지로 만들기 위해 영종도 용유도 무의도에 인천공항과 연계된 국제물류단지를 건설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인천국제공항도 2단계 개발사업을 통해 홍콩 첵랍콕 공항이나 싱가포르 창이공항을 압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은 상태다.
정부는 한반도가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해 지리적으로 유리하고 인천공항의 시설사용료와 항만의 하역료 등도 경쟁국보다 저렴해 개발 여하에 따라선 충분히 동북아 물류거점 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상황은 우리에게 그리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동북아경제포럼(NEAEF)과 한국교통개발원이 최근 북미.유럽 소재 다국적기업 4백곳을 설문 조사하고 BMW 르노 시스코 등 33개 다국적 기업을 현장 인터뷰한 결과 이들은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상하이(푸동)를 꼽았다.
상하이는 매년 10% 이상의 고성장을 구가할 정도로 시장규모와 성장 잠재력이 무한하다는 점 때문에 후한 점수를 얻었다.
동북아 물류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중시하는 지리적 입지보다는 향후 상품의 수요와 물동량이 얼마나 증가하느냐가 관건임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례다.
전문가들은 인천공항이 일본의 간사이.나리타 공항이나 홍콩의 첵랍콕 공항에 비해 월등한 교통 연계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한국이 경쟁국들을 누르고 동북아 물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선 교통연계성과 시장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
- 글자크기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글자행간
-
- 1단계
- 2단계
- 3단계
공유하기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