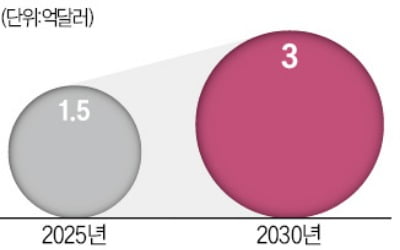[권영설 경영전문기자의 '경영 업그레이드'] 신뢰경영의 시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난 97년 경제위기 직전까지 우리 기업들이 매달린 목표는 '외형'이었다.
좋게 말해 시장영향력 확대지만 실상은 대출과 당좌를 늘리기 위해 덩치를 키우자는 것이었다.
알짜 중소기업보다는 껍데기뿐이라도 대기업이 사업하기에 훨씬 좋았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의 목표를 정반대 방향인 '수익성'으로 잡았다.
부채를 줄이고 부실사업을 내다팔아 알짜기업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산업의 왜소화와 국부유출을 우려하는 소리가 적지 않았지만 위기 극복이란 명분에 묻혔다.
지금의 산업계는 어떤가.
딱히 내세울 만한 방향성이 없다.
외형이 전부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일정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면 은행 거래가 당장 힘들어진다.
대기업이 수익성에만 집중하면 미래를 내다보는 투자는 위축된다.
실제로 중소기업들은 대출이 안돼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반면 대기업들은 넘쳐나는 돈을 쓸 곳이 없어 고민이다.
외형이나 수익성보다 상위 개념으로 기업들이 지표로 삼을 그 무엇인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 회계부정 사건 등 최근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서 실마리를 찾자면 그것은 '신뢰'다.
기업은 특히 신뢰를 쌓아야 할 곳이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간추려만 봐도 소비자 협력업체 종업원 등 세 부문을 들 수 있다.
대소비자 신뢰의 경우 우선 지난달부터 발효된 제조물책임(PL)법을 들 수 있다.
제품의 하자는 이제 과실이나 고의가 아니라도 제조업체의 책임이다.
피해자 몇 명과 합의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소비자들은 똑똑해졌고 집단화됐다.
집단화됐기 때문에 힘을 갖고 있다.
존슨&존슨사는 지난 82년 정신병자가 타이레놀 캡슐에 독극물을 넣어 8명이 사망한 사건이 일어나자 1억달러에 이르는 손해를 보면서까지 시판된 타이레놀을 전량 회수 폐기했다.
1억달러 이상의 신뢰를 얻었음은 물론이다.
협력업체와의 관계도 새로 정립해야 한다.
공급가만 싼 업체를 선호하다간 낭패를 당하기 십상이다.
지난 2000년 미국에서 대규모 리콜사태를 빚었던 타이어업체 파이어스톤 사건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은 회사중 하나가 바로 포드다.
자사의 자동차 '익스플로러'에 파이어스톤의 타이어가 장착돼 있었기 때문이다.
회사의 믿음성은 종업원들이 시장에 전달한다.
관리자와 부하 직원, 사원들간 신뢰가 없는 회사엔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일하기 좋은 포천 100'에 오른 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사내에 신뢰가 경영자산으로 뿌리내리고 있다는 점이다.
신뢰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기업 운명을 좌우하는 필수과목이다.
해야할 일이 많지만 출발은 간단하다.
소비자를 우습게가 아니라 무섭게 보는 자세면 충분하다.
< yskwo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