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 KOREA] 제1주제 : '기술선진국 가는 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국에서는 언제쯤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탄생할 수 있을까.
한국이 아직까지 타지 못한 상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노벨 과학상(물리 화학 생리의학)이다.
아시아에서 일본 중국 인도까지 수상한 노벨 과학상과 인연을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7차례나 수상했으며 중국에서도 두사람을 탄생시켰다.
인도에서는 1930년에 이미 과학상을 탔었다.
한국에서도 이제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나와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한다.
그러나 그 꿈이 실현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노벨상 선정기준인 기초과학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일궈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노벨상 과학상 수상'이란 꿈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를 살펴본다.
◆ 기초과학 지원 대폭 늘려야 =노벨과학상의 43%(2백8회)를 탄 미국은 지난 2000년에 8백33억달러의 과학.기술 예산 가운데 22.9%인 1백91억달러를 기초과학분야에 투자했다.
미국에 이어 노벨과학상 수상자(69회)를 많이 배출한 영국도 지난 98년에 연구개발예산의 31.5%인 18억5천만파운드를 기초분야에 쏟아부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지난해 전체 연구개발예산 4조1천억원중 17%인 7천2백억원을 기초과학연구에 투입했다.
기초분야투자의 절대 규모나 연구개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형편없다.
기초연구의 단위과제당 연구비도 크게 부족하다.
국내 연구지원기관의 과제당 평균 연구비는 2천5백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미국과학재단(NSF)은 연구과제당 10만5천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할 경우 한국의 기초과학 연구수준이 미국의 1990년 수준에 이르는데 앞으로 1백68년, 일본의 1998년 수준에 이르는 데도 70년이 걸릴 것이라는게 과학재단측의 분석이다.
기초과학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꾸준히 지원해 가는 것도 과제의 하나다.
미국의 허블 우주망원경 프로젝트는 시작에서부터 설계, 시험, 작동하는 데까지 무려 38년이 걸렸다.
과학기술부 관계자는 "기초과학이 육성되지 않고는 노벨과학상을 타기 어렵다"며 "정부 과학기술 예산을 늘리는 것은 물론 이 가운데 25% 이상을 기초연구에 꾸준히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글로벌 연구개발체제 갖춰야 =국제 공동연구개발 체제구축도 시급한 과제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송종국 연구원은 "한국 과학자의 노벨상 수상 가능성을 높이려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며 "국제 세미나 등을 통한 국제교류촉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내 연구개발 부문의 글로벌화는 선진국들에 비해 훨씬 뒤져 있다.
미국은 공과대학의 외국인 교수 비율이 37%, 대학원의 외국인 학생비율이 24%에 이르며 박사후과정의 50% 이상이 외국인 연구자다.
일본에서도 공과대학 박사학위 취득자중 외국인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공과대학 대학원의 외국인 학생 비율이 1%에도 못미치는 실정이다.
연구인력의 해외파견도 부진하다.
일본의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인력 해외파견수가 지난 89년 2천3백3명에서 99년엔 6천8백33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에 비해 한국은 지난 5년간 과학기술부의 지원으로 해외에 파견된 전체 연구인력이 2천명을 넘지 못했다.
따라서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학술지에 실리는 논문도 적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2000년 세계적인 과학전문지 네이처에 실린 연구논문 8백86편 가운데 한국의 연구기관이 기여한 것은 5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과학상 수상 지원체제 갖춰야 =정부 기업 연구소가 과학상 수상후보들을 지원해야 한다.
정부가 산.학.연과 공동으로 해외논문 게재 지원 등 과학상 수상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과 연구소에서도 노벨상 후보들을 위한 연구소 설립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노벨상 수상은 개인의 능력만으론 한계가 있다는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12월 노벨상 선정위원을 무료로 초청하려다 말썽을 빚기까지 했다.
특별취재팀 strong-korea@hankyung.com
[ 협찬 : 한국산업기술재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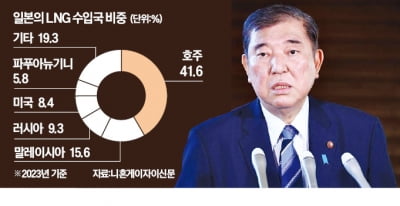
![[단독] 매그나칩반도체 4년 만에 매각 시동…LX·두산·DB 인수 후보](https://img.hankyung.com/photo/202502/AA.3938131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