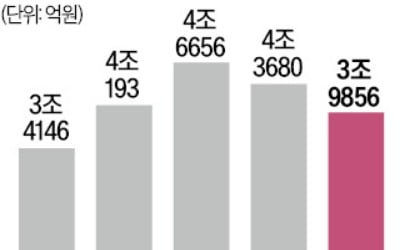['글로벌 환경' 돌파...영어회의가 지름길] '2중언어' 업무 줄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글로벌' 경영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영어 장벽을 정면 돌파하겠다고 나선 기업들이 있다.
아예 영어를 입에 물고 살기로 작심한 기업들이다.
해외 업무가 절반이 넘는데도 모든 업무 프로세스가 한국어로 진행돼서는 곤란하다는게 이들의 판단.
따라서 외부와의 업무에 영어를 사용하듯 내부에서도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영어로 해보자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무엇보다 영어를 사내회의의 공식 언어로 채택하는 곳이 많아졌다.
삼성석유화학은 매주 월요일 서울 본사에서 열리는 간부 회의를 영어로 진행한다.
'글로벌 시대에 맞춰 가야 한다'며 2000년부터 모든 보고서의 영문 작성을 지시했던 최성래 사장이 지난 6월 간부 회의도 영어로 하자고 제안한데 따른 것이다.
최 사장이야 삼성물산에서 해외 근무로 뼈가 굵어 전혀 무리가 없었다.
그러나 해외업무 경험이 적은 간부들에겐 고역이었다.
"외국인 간부가 회의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수출이나 구매 담당 간부는 경험이 많으니까 자연스러웠죠. 하지만 사무 간접 부문이야 어디 쉬웠겠습니까. 회의 날만 되면 초긴장 상태였지요."(김일환 재무팀 과장)
하지만 영국 BP.일본 미쓰이.삼성그룹이 지분을 나눠 갖고 있는 합작사가 외국인 임원들을 위해 따로 번역하고 통역하는 작업을 한다는게 소모적이라는 지적에 수긍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김 과장은 영어 회의를 3개월째 진행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한다.
회의 자리에서 즉각 정보 교류를 끝낼 수 있게 되면서 회의 후 외국인 임원을 위해 영문 보고서를 따로 만들어야 하는 골치 아픈 절차가 사라진 것.
"업무량이 확실히 줄었어요. 게다가 서로 영어 이름을 지어 부르다 보니 분위기가 부드러워지면서 회의가 토론 중심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울산 공장도 회의를 영어로 진행하고 있다.
매일 아침 영어 소모임을 갖고 있는 재무팀에는 이달 말부터 빌리 미첼 부사장의 부인이 매주 두번씩 영어 강사로 나오기로 했다.
영어 회의가 가져오는 '부대 효과'는 다른 기업들도 공감하는 부분이다.
LGCNS는 미국에서 공부한 류명환 상무(전략기획부문장)의 제안으로 올 초부터 전략기획부문 팀장 회의 때 영어를 쓰고 있다.
김희경 IT기획담당 차장은 "의사소통이 완벽하지 않다는게 단점이지만 존칭을 쓰지 않고 서로 실수하는 것도 보니까 벽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사내에 영어 환경을 조성하려면 삼성석유화학이나 LGCNS처럼 해외 경험이 많은 리더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적극적인 추진력은 그 다음이다.
그러나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 스스로 필요성을 느껴야 한다는 점.
제일기획 인터넷마케팅팀은 팀장이 제안해 7명이 영어 회의를 시작했지만 한달 반을 넘기지 못했다.
처음엔 회의때 무조건 영어만 쓰기로 했지만 심도있는 주제로 들어갈 때마다 한계에 부딪히자 심각한 토픽은 한국어로 얘기하기로 방침을 바꿨다가 결국 영어 회의 자체가 흐지부지됐다.
반면 SK텔레콤 글로벌사업개발팀처럼 니즈가 확실하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해외에서 사업 기회를 발굴하는 것이 주요 업무인 이 팀이 영어 회의를 도입한 것은 외국인들과의 컨퍼런스 콜에 대한 면역을 키우기 위해서였다.
박경수 부장은 "외국에 나가서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엇갈려 분위기가 살벌할 정도"라며 "연습을 게을리하면 한 마디도 끼어들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그는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더라도 말하려는 목적과 내용이 분명하다면 연습을 통해 실전 영어 실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LGCNS 김 차장은 처음 영어 회의를 한다는 건 매우 힘든 일이라고 말한다.
다들 쑥스러워하고 영어를 제법 할 줄 아는 사람만 말을 하기 때문이다.
영어로 '나중에 우리말로 따로 설명해 드리겠다'며 웃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비즈니스 환경에서 사용하는 영어의 패턴은 연습으로 충분히 익힐 수 있습니다. 영어 회의도 결코 어렵지 않다는 얘기지요."
영어 회의의 왕도(王道) 역시 노력일 뿐이라는게 김 차장의 결론이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