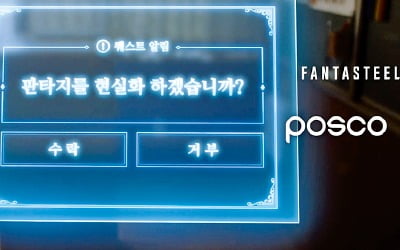[DJ 노믹스 5년] (2) '저금리, 성장의 약인가 독인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난 98년 2월 출범한 김대중 정부에 '발등의 불'로 떨어진 문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고금리 처방'이었다.
연 30%를 넘나드는 살인적인 고금리 탓에 98년 초 매달 3천여개 기업이 부도로 문을 닫고, 실업자가 하루 1만명씩 쏟아지는 극한 상황이었다.
그 해 6월 미국을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은 미셸 캉드쉬 당시 IMF 총재를 만나 "금리 인하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고, 이후 저금리 정책으로 급선회하게 된다.
저금리 정책은 기업의 금융비용(이자부담)을 낮춰 수익성을 높이고 개인소비를 부추겨 경기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됐다.
그러나 가계대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부동산시장에 거품이 끼는 등의 부작용은 'DJ 노믹스'에 적잖은 부담으로 돌아왔다.
◆ '초고금리'에서 '초저금리'로
IMF는 한국에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재정과 금융부문의 '초긴축'을 요구했다.
그 결과 금리가 연일 뜀박질, 97년 말에는 하루짜리 콜금리가 연 30%를 넘어섰다.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환율을 안정시키며 한계기업들을 과감히 정리하기 위해서는 고금리가 불가피하다는게 당시 IMF의 논리였다.
외환위기를 겪은 다른 개도국들에 고금리정책을 처방해 재미를 봤기 때문이라지만,제조업에 기반을 둔 한국에는 '잘못된 훈수'라는 비판이 거셌다.
결국 '초(超)고금리'는 불과 1년 만에 '사상 최저 수준의 저금리'로 바뀌었다.
한국은행이 돈줄을 풀면서 콜금리는 98년 말 연 6.48%, 회사채(3년만기) 금리는 연 8.0%로 내려갔다.
정부는 이후 대우사태, 경기침체, 해외경제 불안 등에 대응해 저금리 정책을 계속 밀어붙였다.
지난해 미국 9.11 테러 직후에는 콜금리를 사상 최저인 연 4.0%로 낮췄다.
올들어 한은은 콜금리 목표치를 연 4.25%로 올렸지만 96년 말(연 12.48%)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할 만큼 역사적인 초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 경기추락 막는 데는 기여
저금리는 유동성 위기로 인한 기업의 흑자 도산을 막고 투자와 소비를 회복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기업의 설비투자는 저금리가 본격화된 99년 30.9% 급증(전년 대비)했고 도소매판매도 13% 늘었다.
내수경기 부양효과도 뚜렷했다.
이인실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재정연구센터 소장은 "지난해 이후 세계 경기가 급속히 냉각되는 와중에 국내 경제가 연 6%대의 견실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건 내수 소비가 견조하게 버텨준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 가계대출 급증과 부동산 거품 양산
저금리 정책은 그러나 가계빚을 늘리고 부동산가격을 부추겨 경제를 다시 '고비용 구조'로 몰아넣고 있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저금리 정책이 당장은 경기활성화 효과를 내는 '약'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 동력을 갉아먹는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저금리로 인한 거품은 경제성장률이 10.9%를 기록한 99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갈 곳을 찾지 못한 돈이 주식시장으로 몰리면서 코스닥지수를 사상 최고치인 292.55(2000년 2월)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코스닥지수는 2000년 말 52.28로 최고치 대비 6분의 1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지난해 말부턴 시중의 넘치는 돈이 부동산쪽으로 몰리면서 집값이 크게 뛰었다.
물가도 덩달아 불안해지고 있다.
나동민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팀장은 "기업 부문에서는 돈이 남아도는 반면 가계 부문에선 저축률이 급락하고 있다"며 "가구당 부채가 2천7백20만원(6월 말 현재 총 3백97조원)에 달하는 가계빚 증가속도가 문제"라고 말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