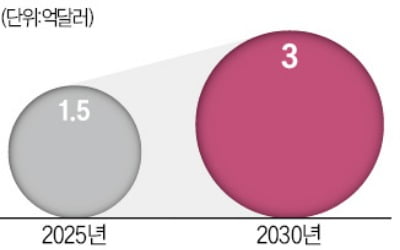[강창동 전문기자의 '유통 나들목'] 한국 소비자들은 '봉'인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최근 방한했던 영국 위스키업체 애들링턴 그룹의 이언 굿 회장은 "한국인들은 최고의 스카치에 최고의 값을 지불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는 찬사(?)를 던졌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최근호(11월25일자)에서 "세계적인 수요 감소로 고민중인 위스키 업계에 한국이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국내 위스키 소비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대한주류공업협회 집계에 따르면 올 1∼10월 중 위스키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3.5% 증가했다.
특히 최고급인 슈퍼프리미엄급은 무려 90% 늘었고 이보다 한 단계 낮은 디럭스급도 54%나 증가했다.
반면 가장 등급이 낮은 스탠더드급은 오히려 30% 정도 감소했다.
프랑스 와인 '보졸레 누보'에 대한 지나친 애착도 씁쓸하긴 마찬가지다.
이 술은 프랑스 남부 보졸레 지방에서 매년 8∼9월에 수확한 포도를 2∼3개월간 숙성시킨 레드와인이다.
숙성기간이 짧아 떫은 맛이 덜하고 과일향이 진해 칵테일 같은 느낌을 준다.
프랑스 정부는 이 와인을 매년 11월 셋째주 목요일 0시를 기해 팔도록 정했다.
특정일 이전에 팔지 못하게 금지한 이 방침 이면에는 "햇포도로 담근 와인을 맨먼저 맛본다"는 구호를 앞세워 다른 나라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려는 상술이 숨어 있다.
한국에서는 2년전부터 이 상술이 먹히기 시작했다.
유통업체들 사이에 물량확보 경쟁이 달아올랐고 곳곳에서 보졸레 누보 축제가 벌어졌다.
구미의 와인 애호가들한테 싸구려 취급을 당하는 상품이 한국에서 '스타' 대접을 받고 있는 셈이다.
루이뷔통으로 대표되는 한국 여성들의 '명품 선호'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명품계'가 조직되는가 하면 이젠 '명품깡'이란 신조어도 등장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신용카드로 명품을 사서 사채업자에게 갖다주면 선이자를 떼고 돈을 빌려주는 유사 금융행위다.
이탈리아산이나 프랑스산 명품은 백화점 매장 배치를 좌우할 뿐 아니라 경영진 인사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명품 유치에 실패한 임원은 살아남기 힘들 정도다.
한국 남성들이 최고급 위스키에 취하고 한국 여성들이 해외 명품에 푹 빠져있는 한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유럽 장사꾼들에게 만만한 '봉'으로 기억될게 틀림없다.
cd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