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 '시민단체'] (3) '기로에 선 NGO운동'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올해는 한국 사회에 시민운동의 첫 발을 내디딘 YMCA가 창립된지 꼭 1백주년이 되는 해다.
89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등장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한 시민운동은 기존 질서에 대한 본격적인 개혁 기치를 내건 참여연대(93년 출범)의 가세 등으로 우리 사회의 한 축(軸)으로 자리를 굳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90년대 이후엔 참여연대 외에도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분야별.직능별로 다양한 시민운동 단체들이 속속 출범했다.
작년 말 현재 8천1백90여개에 달하는 시민단체중 57.3%가 90년 이후 설립됐을 정도다.
작년 말 대통령 선거에서 '시민 파워'에 힘입은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으로 시민단체들의 영향력은 더 한층 커졌다.
시민단체들이 입법.행정.사법부와 언론기관에 이은 '제5 권부(權府)'로 떠올랐다는 소리도 듣는다.
하지만 외형 성장에 걸맞게끔 '권력 감시'와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 경실련에서 참여연대까지
1989년 7월 8일.
"모든 사회계층의 힘을 모아 경제정의를 실천하는 비폭력적인 시민운동을 지향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경실련이 출범했다.
경실련은 급진적인 사회변혁운동 대안으로 언론의 각광을 받으며 급성장했다.
당시 사회 여론주도층으로 급부상했던 교수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중산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유일한 창구였다는 점이 성공요인으로 분석된다.
경실련은 금융실명제와 부정부패추방운동 등을 통해 90년대를 대표하는 시민단체로 발돋움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일부 간부가 정치 스캔들에 연루되는 등 '압축 성장'의 후유증을 앓으면서 영향력이 급속히 쇠퇴했다.
경실련과 함께 90년대 초반을 대표하는 단체로는 재야 및 민중운동 진영의 연합체인 전국연합이 있었지만 사회주의 패망과 함께 이념적 좌표를 상실하면서 영향력도 빛을 잃어갔다.
이런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참여연대다.
참여연대는 급진적 민중운동진영인 전국연합과 현실에 파묻힌 경실련의 틈새에 '대안을 갖는 진보적 시민운동'이라는 깃발을 내걸었다.
교수, 변호사, 학생, 회사원 등 진보성향의 지식인들이 중심이 된 이 단체는 급진적 변혁보다 현실에서의 개혁을 강조해 왔다.
이밖에 지난 88년 결성된 민변은 양심수 문제와 인권감시에 주력하면서 현 정부들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단체로 성장했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도 동강댐 건설반대와 핵폐기장 건설 반대 등 환경에 대한 집중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영향력 있는 단체로 성장했다.
◆ 기로에 선 NGO
한국의 '제5 권부'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고도 성장가도를 질주해 온 시민운동계는 최근 새로운 숙제와 씨름 중이다.
한국의 시민운동이 지나치게 '대중영합적'으로 흐르고 있지 않느냐는 비판 때문이다.
참여연대의 이태호 정책실장은 "대다수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현재 발생하는 사건"을 참여연대의 활동 대상으로 규정했다.
그럼에도 일부 시민단체의 '권력화'에 대한 세간의 비판은 따갑다.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의 정부 참여가 늘면서 권력감시 역할이 무뎌질 수 있다는 것도 시민단체들엔 고민거리다.
특히 참여정부가 시민단체를 파트너로 삼고 싶어 한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도 당분간 뜨거운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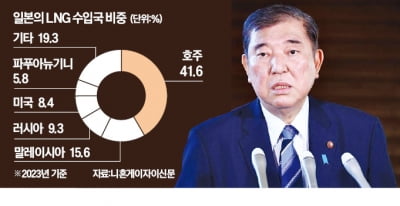
![[단독] 매그나칩반도체 4년 만에 매각 시동…LX·두산·DB 인수 후보](https://img.hankyung.com/photo/202502/AA.3938131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