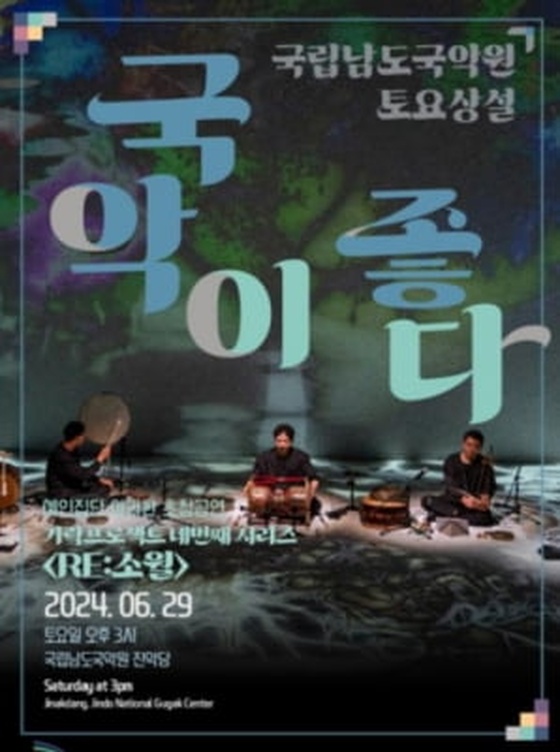입력2006.04.03 22:23
수정2006.04.03 22:26
북한 주민 2명이 4일 서해상을 통해 탈북에 성공함으로써 북한판 '보트피플'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그간 탈북은 주로 중국 등 제3국을 경유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해상 탈출은 지난 97년 이후 한건도 없다가 지난해 8월 서해 옹진군 앞바다, 지난 4월 동해 주문진 앞바다를 통해 탈북자들이 불과 1년도 안된 짧은 기간에 집중 귀순했기 때문이다.
탈북자 관련 민간 단체들을 "육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해상 탈북이 최근 잇따르는 것은 북한의 사회통제 기능이 약화됐기 때문" 이라면서 "북한판 보트피플의 시작 조짐으로 정부가 서둘러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더욱이 이날 탈북한 북한 주민들이 택한 항로는 두번이나 남북간 교전이 발생한 곳으로 북한 해군의 경계가 여느 해역에 비해 철저한 북방한계선(NLL) 선상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위험을 무릅쓴 남행이 이어질 가능성을 예고한다는 것이다.
지난 4월 주문진 앞바다의 경우 한국전 정전 이후 북한 주민이 배를 타고 동해안으로 귀순한 첫 사례로 꼽혀 주목 받았다.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사무총장은 "정부가 육상은 물론 해상을 통한 대량 탈북에 대비한 제대로 된 플랜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남으로 오는 해상 탈북자들은 남한 사회적응 능력이 떨어져 특별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경제난과 체제이완 등 내부 상황에 비춰볼때 해상 탈북이 증가할 개연성이 커 적극 대비해야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난해 8월 옹진군 앞바다에서 북한 주민 21명이 집단 귀순하자 여야 정치인들은 보트피플형 귀순이 새로운 탈북 유형으로 자리잡을지 모른다며 해상 경유를 포함한 대규모 탈북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미국 등 서방 언론들도 육상과 해상을 통한 탈북 러시와 관련, "북한이 경제체제붕괴와 주민들의 생활고로 베를린장벽 붕괴 직전의 동독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분석하며 상당히 진지하게 보고 있다 그러나 정보 당국은 아직 일회성 사건들로 판단하며 두고봐야 한다는 분위기이다.
한 관계자는 "최근의 해상 탈출은 아직까지는 조직적이 아닌 어쩌다 벌어진 개별적 사건으로 보트 피플의 신호탄은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섭 기자 leess@yna.co.kr


![한동훈 37.9% 나경원 13.5% 원희룡 9.4% 윤상현 8.5% [에이스리서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ZN.37125989.3.jpg)


![뉴욕증시, PCE 대기하며 강보합...네이버웹툰 10%↑ [출근전 꼭 글로벌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B2024062806225664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