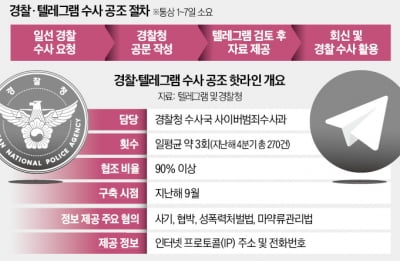지자체 특화상품 '브랜드 만들기' 열풍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들이 무형자산 브랜드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농ㆍ수산물 등 지방 고유 특산물에 의존하던 데에서 나아가 고래 진흙 나비 등 지방 토종 상징물과 동ㆍ식물 등을 상품화하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
다른 지역과 차별적인 상품으로 관광 수입 등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난달 말까지 특허청에 출원한 상표가 무려 3천3백22건에 이른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포항시는 지난 2000년 1월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포항 호미곶 해맞이 광장에서 채화한 '새천년 영원의 불'을 브랜드로 만들어 상품화했다.
이 불은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공식 성화로 결정됐다.
포항시는 오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도 호미곶 불이 그리스 아테네의 성화와 합화해 공식 성화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방위 홍보전에 들어갔다.
포항시 관계자는 "호미곶 불이 세계의 주요 행사 때마다 성화로 활용되면 홍보 효과와 대규모 관광객 유치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고래잡이 기지였던 장생포항을 내세워 최근 '2005년 IWC(세계고래총회)'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이를 통해 1백억원 이상의 관광 수입과 친환경 도시로의 이미지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충남 보령시는 청정 갯벌에서 나오는 진흙으로 각광받고 있다.
지난 19일 개막된 '보령 머드축제'는 진흙이 피부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외 관광객들로 초만원을 이루고 있다.
전북 무주군은 개똥벌레(반딧불이)를 지역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결정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연결하는데 성공, 연간 3백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가 특화 상품 개발로 재미를 보자 다른 자치단체들도 브랜드화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경남 함양군은 경남도농업기술원 등과 함께 병곡면 등 군내 4개 지역 1백25만평을 내년 초까지 약초재배단지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간 2백여억원 이상의 관광 수입을 거두겠다는 전략이다.
농업기술원 약초연구팀 김만배 팀장은 "주5일 근무시대를 맞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약초특구'로 승부를 걸 작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부 지자체에선 무형자산을 무리하게 브랜드로 만들려다 예산만 낭비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서근태 울산발전연구원장은 "지자체의 특화 브랜드는 지역의 역사 문화 미래 등을 함축한 이미지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때에만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