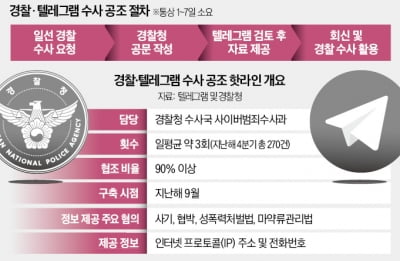[현대車 임단협 쟁점 의견접근] 주5일ㆍ비정규직 처우개선 막판 줄다리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현대자동차 노사가 합의한 '노조의 경영참여 허용'은 표면적으로는 지난 2001년 단체협상안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지만 실제론 엄청난 파장을 몰고올 것이라는 게 노동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 2001년 노사가 합의한 단협안은 신기술 도입 및 신차종 개발,차종 이전,공장 이전 등 경영상 또는 기술상 사정으로 인한 인력 전환배치시 조합에 통보하고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심의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다 조합원들의 고용에 불안요인이 발생할 경우 조합에 즉시 통보하고 공동으로 심의 의결하도록 돼 있다.
올 임단협에선 여기에 △신차종과 공장이전 등에 대해선 '90일 전' 조합에 통보하고 △해외 현지공장 설립이나 이전시 노사가 공동 심의결정하며 정리해고와 희망퇴직을 임의로 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노사는 또 국내외 경기 변동으로 인한 판매부진 및 해외 공장 건설과 운영을 이유로 조합과 공동결정 없이 일방적인 정리해고,희망퇴직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회사는 △국내공장의 생산물량을 2003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이에 따른 제반 시설과 연구시설을 유지,보장하는 한편 △수요부족과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국내 생산공장을 노사공동위원회의 심의 의결 없이 축소 및 폐쇄할 수 없으며 △정규인력은 58세까지 정년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
다만 노조가 올해 임단협에서 최대 쟁점으로 내건 △노조대표의 이사회 참여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생산통제권 확보 등 사실상의 경영참여 문구는 합의안에서 빠졌다.
결론적으로 노조는 주5일 근무제와 함께 경영참여를 핵심요구안으로 내걸고 이를 통해 해외공장 신설에 따른 고용불안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전략적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다.
현대차 노사의 이번 합의는 사측이 고유권한인 경영권을 일부 포기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노조는 회사측의 구조조정으로 빚어진 근로조건과 고용의 불안정을 막는 게 일차적 목적이라는 점에서 자칫하면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노조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2001년 단체협약에서 노조의 경영 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나타난 대표적 부작용 사례로 다임러 크라이슬러와의 합작문제를 꼽고 있다.
이미 합작법인 설립이나 공장 이전 등을 결정할 때 노조의 협의를 거치도록 합의함으로써 현대차는 다임러크라이슬러와 4억유로(약 5천2백억원)에 이르는 상용차부문 투자합작사업에 합의하고도 지금까지 법인을 설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파업 피해에 시달린 회사측이 고용,구조조정 등 경영 고유 영역에 참여권을 인정해달라는 노조 요구를 사실상 허용함으로써 앞으로 대형 사업장 전반에 경직된 고용관계가 더욱 고착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