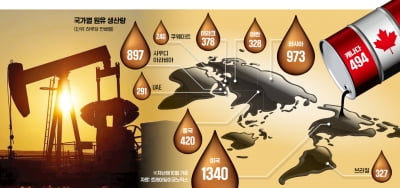올해초 21년간 다니던 직장에서 명예퇴직한 이모씨(52).
그는 지난 7월 퇴직금 일부를 갖고 MCS로직이라는 회사의 공모주를 청약했다.
주식이라곤 '주'자도 몰랐지만 공모주가 돈이 된다는 말에 가족 이름까지 합쳐 5천1백84주(증거금 2천만원)를 청약한 것.
그러나 웬걸.
그에게 배정된 주식은 18주에 불과했다.
경쟁률이 무려 2천8백38대 1에 달한 탓이었다.
이씨가 받은 퇴직금은 3억여원.
처음엔 장사를 하려고 했다.
그러나 경기가 워낙 좋지 않아 시기를 미뤘다.
'뜬다'는 부동산도 기웃거려 봤으나 이리저리 저울질만 하다 타이밍을 놓쳤다.
은행을 알아 봤지만 금리가 성에 차지 않았다.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가 고작 연 4.7%(세전).
돈 들어갈 데가 많은 그로서는 '코끼리 비스켓'에 불과했다.
비단 이씨만이 아니다.
"돈있는 사람들이 더 고민이 많은 것 같다. 작년엔 부동산에 열심히 투자했으나 올들어 각종 조치로 부동산 투자 메리트가 사라졌다. 그렇다고 증시에 뛰어 들자니 아직은 불안해 한다. 이런 와중에 금리는 계속 떨어지다보니 상당히 조급해 한다."(서종한 하나은행 화곡지점장)
한국은행이 올들어 두차례나 콜금리를 인하한 가운데 시중 유동성은 계속 풀리고만 있으니 금융권 금리 하락세가 이어지는 건 당연하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4조5천억원이상을 푼데다 올들어 경상수지 흑자로 들어온 돈만도 8억5천만달러에 이른다.
시중 자금수위를 나타내는 총유동성(M3)은 1천조원을 웃돈다.
그러나 경기부진을 반영하듯 M3 증가율은 작년 12월 13.3%에서 올 6월엔 9.1%로 떨어졌다.
돈을 엄청나게 풀었지만 실물경기와 밀접한 돈이 도는 속도는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와 한은이 추경을 편성하고 콜금리를 낮춘 것은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기업들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 투자를 하면 소비도 살아날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아니다.
잔뜩 움츠러든 기업들이 투자하려는 생각은 아직 없다.
이런 현상은 자연스럽게 시중자금의 단기 부동화로 나타나고 있다.
은행 투신사 종금사 등에 단기(만기 6개월미만)로 예치된 돈은 3백67조원(한은 추산, 5월말).
이들 회사 전체 수신(7백76조원)의 47%에 달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이처럼 단기 부동자금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증시와 부동산 시장에서 이상 과열 현상이 초래되고 있으며 돌발 악재가 발생할 때마다 단기 부동자금이 즉각 이동하면서 금융시장 전체로 불안이 확산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물론 단기성자금이 모두 부동자금은 아니다.
기업들의 일시적인 운전자금도 상당하다.
그러나 단기자금이 많아진다는 것 자체가 자금의 선순환이 아닌 악순환을 뜻하는 건 분명하다.
시중 자금이 산업부문으로 흘러가지 못하면서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돈맥경화'를 호소하는 기현상은 좀체 해결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
- 글자크기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글자행간
-
- 1단계
- 2단계
- 3단계
공유하기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