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밭벌 서쪽 8백40만평 부지에 자리잡은 대덕연구단지.
한국의 과학기술 메카이자 연구개발의 요람인 대덕연구단지가 조성된지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
대덕연구단지의 30년 역사는 한국 과학기술의 역사라 해도 조금도 지나치지 않다.
우선 초대형 투자를 꼽을 수 있다.
대덕단지내 연구동 도로 숙박시설 등 설비 건설을 위해 4조5천억원이 투입됐다.
단지내 정부 출연연구소들은 연구개발을 위해 어림잡아 50조원 정도를 투자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대덕단지는 또 고급 두뇌의 산실이면서 요람 역할을 해왔다.
KAIST에서 배출된 과학두뇌는 박사 5천8백30명을 비롯해 석사 1만4천8백명 등 2만6천명에 이른다.
고급 두뇌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곳도 바로 대덕이다.
이 곳에 몸담고 있는 연구 인력은 1만8천4백여명에 이른다.
이들 중 박사급만 4천8백50명에 이른다.
국내 전체 이공계 박사의 10%가 넘는 고급 두뇌들이 대덕에 몰려 있는 셈이다.
대덕연구단지는 기술개발의 역사를 이끌어 왔다.
기술개발을 통해 70년대 한국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된 중화학공업에 성장 동인을 제공했다.
반도체 CDMA(부호분할다중접속) 개발 등을 통해 80∼90년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전자통신 산업 발전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대덕연구단지는 이처럼 기술 자립의 일등공신으로 공인받고 있다.
대덕연구단지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한국의 과학기술이 지금보다 10년 이상 퇴보했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대덕단지는 이제 나라 밖으로부터도 성공적인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제3세계 국가들이 대덕단지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그러나 대덕연구단지의 오늘이 있기까지 우여곡절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30년 동안 무려 17번이나 관련 법령과 제도가 바뀌었다.
그 과정에서 출연연구소 주관 기관이 몇 차례 바뀌는 홍역을 치렀다.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로 인한 후폭풍은 대덕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구조조정 한파가 몰아닥치면서 연구원들이 대거 보금자리를 떠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연구원들이 구조조정 대상 1순위로 푸대접 받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벤처 붐이 일면서 몰아닥친 'IT(정보기술) 열풍'으로 또 한 번 연구원들의 엑소더스가 일어나기도 했다.
참여정부 들어서도 정부출연연구소 개혁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연구개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현재의 출연연구소 체제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다.
과학기술특구 지정을 둘러싸고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대덕연구단지는 글로벌 시대의 연구개발 주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출연연구소들은 기술융합시대를 맞아 인력 교류와 공동 연구를 가속화하고 있다.
BIT(생명정보기술) 시대에 대비해 생명공학연구원과 전자통신연구원이 공동 연구에 나서고 있다.
표준연구원과 KAIST는 NBT(나노바이오기술) 분야 교류를 본격화하고 있다.
연구소의 성과를 상품화ㆍ사업화하기 위한 시스템도 잇따라 구축되고 있다.
출연연구소가 연구원 출신들과 손잡고 벤처기업 집적단지인 IT밸리와 원자력밸리 BT밸리 등을 설립하고 있다.
대덕단지 내 창업보육 기업이 이미 4백개를 넘어섰으며 대덕에 설립된 벤처도 1천개를 돌파했다.
"대학 출연연구소 기업의 3각 연구개발 체제도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물론 대덕단지가 안고 있는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글로벌 시대에 맞춰 해외 연구기관을 유치하고 인력도 국제화해야 한다"는 게 과학기술계의 주문이다.
과학기술 분야 고급 두뇌 양성과 배출을 위한 '인력 저수지' 기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또 "과학출연연구기관의 분소나 분원 설립 등을 통해 대덕의 연구개발 역량을 다른 지방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덕연구단지의 공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출연연구소의 개혁에 대해서도 사람에 따라 해법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대덕단지만큼 경쟁력을 갖춘 연구단지가 없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당분간 대덕단지를 추월할 수 있는 연구단지가 태어나기를 기대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그 해법은 분명하다.
대덕단지를 세계적인 연구단지로 키워내는 것이다.
체제개편 구조조정 등 개혁도 바로 이같은 큰 틀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개혁을 성공시킬 수 없으며 '국민소득 2만달러'도 달성할 수 없다.
대덕연구단지가 살아야 한국이 강해진다는 것이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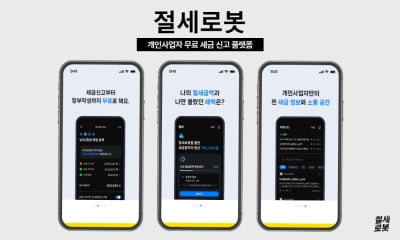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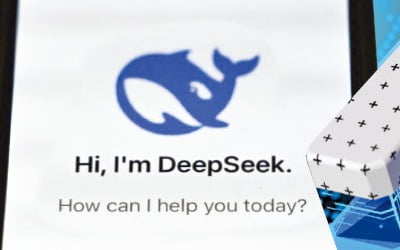




![[한경 오늘의 운세] 2025년 1월 30일 오늘의 띠별 운세](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1.37643756.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