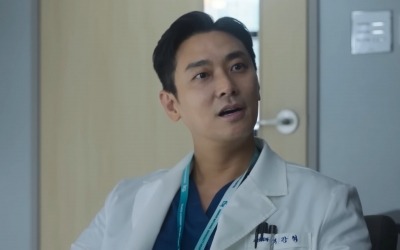[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원.엔 환율 '디커플링' 가능한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국경제의 차별화(decoupling) 논의가 활발하다.
최근처럼 대외여건이 좋을 때 동조화를 보여야할 실물경기는 차별화를 보이고 있는 반면 대외가격변수가 불리하게 돌아갈 때 차별화를 보여야할 국내 금융변수는 오히려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원화 환율이 엔화 환율에 의해 전적으로 움직이는 원·엔 동조화 현상이 심한 것이 우려된다.
지난달 이후 원·엔 동조화 계수는 0.90을 상회하고 있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시장참여자들의 훈련이 안돼 있는 점이 가장 큰 요인이다.
최근처럼 금융시장이 불안하면 시장참여자들이 참고지표로 우리 경제여건보다는 엔화 환율을 감안해 외화를 운영하기 때문이다.
경제구조적인 면에서도 아직까지 일본에 의존하는 체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커다란 요인이다.
통상 우리 경제구조를 말할 때 일본과 '안항적(雁行的) 혹은 천수답(天水畓) 구조'로 돼있다고 한다.
실제로 우리 수출증가율과 경제성장률,주가상승률은 엔고(高)율과 대비시켜 보면 정확히 일치한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개설해 놓은 원·엔 직거래 시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원·엔 동조화 정도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달러화 일변도의 외화보유 방식이 개선되지 않음에 따라 원·엔 시장의 필요성을 그만큼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원·엔 동조화 현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갈수록 이에 따른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처럼 대외환경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체질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완충능력과 우리 경제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진다.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
전제는 훈련된 시장참여자들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거래규모와 환율결정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
경계해야할 것은 정책당국자의 섣부른 환율에 대한 언급이다.
아직도 시장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환율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정책당국자부터 훈련이 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원화의 국제화 과제도 중요하다.
이 점에 있어서는 원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급선무다.
효과면에서 커다란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세계 11∼12위의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가 여전히 달러당 네자릿대의 환율체계를 갖고서는 곤란하다.
외환거래 단위를 축소하는 원화의 디노미네이션을 중장기적인 과제로 생각해 볼 시점이다.
경제구조를 다변화하는 과제도 시급하다.
여전히 대일 편향적인 수출품목과 수출시장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수출구조도 단순히 환율경쟁력에 의존하는 추세에서 품질·디자인·기술과 같은 가격 이외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일본을 비롯한 인접국가와의 공동화폐 등도 구상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도적으로는 달러화 일변도의 외화운용 관행을 개선시켜 원·엔 직거래 시장에 대한 수요를 늘려야 한다.
이 점은 그동안 누차에 걸쳐 강조해 왔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
대안이 있다면 환율변동보험 지급이나 금융기관의 건전성 평가시 외화보유 구성의 다변화 정도를 하나의 심사기준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이종(異種)통화 중에서는 엔화에 대해서만 직거래 시장이 개설돼 있으나 앞으로는 유로화 등에 대해서도 직거래 시장을 개설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논설·전문위원 schan@hankyung.com
!["트위치 철수 효과 끝났나"…치지직에 밀린 SOOP 내리막길 [진영기의 찐개미 찐투자]](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99.39367791.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