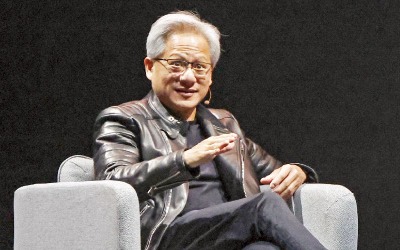[中國 과속성장 부작용] 국내 화섬社는 '희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중국의 섬유공장들이 전력난 용수난 등으로 가동률이 떨어지자 국내 섬유업계가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공급 과잉과 원자재값 폭등이라는 화섬업계의 두 가지 악재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의 원단·직물 업체들이 불규칙한 공장 가동으로 납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자 중국으로 몰렸던 해외 바이어들의 발길이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다.
4일 섬유업계에 따르면 최근 폴리에스터 나일론 등을 생산하는 중국 화섬업체들의 공장가동률은 60% 정도에 머물고 있다.
전력난 용수난이 심화되고 있는 탓이다.
이에 따라 화섬제품의 세계적인 공급 과잉 현상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의 폭발적인 공장 증설에 따른 수요 증가로 큰 폭으로 오르던 TPA(고순도테레프탈산) EG(에틸렌글리콜) 등 원자재가격 상승세도 한풀 꺾이고 있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장 설립은 1년이면 가능하지만 전기 용수와 같은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데는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분간은 화섬업체에 불어닥치던 중국발 악재가 사그러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원단·직물 업체들도 '중국의 불행이 한국의 행복이 됐다'며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싼 가격만 보고 중국으로 몰려 갔던 해외 바이어들이 한국 등 전통적인 섬유 생산국들로 유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직물업체 대표는 "전력 공급이 일정하게 이뤄지지 않아 중국산 제품의 품질과 납기 문제에 대한 바이어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며 "이에 따라 한국 업체들이 반대급부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