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국가 기간산업체의 경영권 보호 장치는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며 "외국 사례 가운데 국내 실정에 맞는 대응책을 벤치마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외국에서 시행 중인 경영권 방어 장치의 대표적인 예는 황금주(golden stock) 제도다.
황금주는 주요 의사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특별주식'으로, 주로 정부가 기간산업을 민영화하면서 국가의 이익에 중대한 침해를 주거나 사회 후생에 크게 어긋나는 사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 발행한다.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이 공기업 민영화를 진행하면서 공기업을 외국인이나 헤지펀드가 적대적으로 M&A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은 차등의결권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국가 기간산업체가 경영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보통주보다 최고 1천배의 의결권을 갖는 특별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게 골자다.
네덜란드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은 공공재 산업체가 적대적 M&A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일반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의결권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자사주 매입 제한을 철폐, 적대적 M&A 시도에 기존 대주주가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국 연방법은 상장 기업의 자사주 취득과 관련해 아무런 규제도 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일부 주에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며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는 주에 소재하는 상장 기업은 자사주를 무제한 매입함으로써 적대적 M&A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놨다"고 말했다.
이같은 제도를 당장 국내에 그대로 도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우선 국가기간산업, 공공재산업, 국가전략산업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있지 않다.
차등의결권 등 제도를 도입할 경우 특정 주주에 대한 '특혜'로 비쳐질 소지도 있다.
공기업 및 민영화된 일부 기업의 경우 해당 산업 특별법으로 외국인의 지분 매입을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기도 하다.
하지만 국내 간판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면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정부도 심각성을 인정해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 글자크기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글자행간
-
- 1단계
- 2단계
- 3단계
공유하기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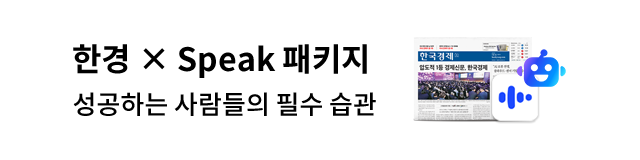
![[마켓칼럼] 숨 고르는 韓증시…"현금 비중 높이고 변화에 대응"](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01.39221529.3.jpg)

![해피블록 "'디지털 증권사'…법인 가상자산 OTC·중개 서비스 제공" [인터뷰+]](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01.3969958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