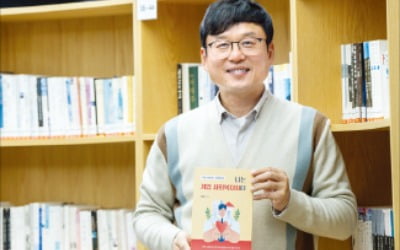어느 노동조합에서 제기했다는 '기업 순이익의 일부를 떼어내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자'는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왠지 찜찜하다.
기업의 자연스런 발전과정에서 자율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라면 또 모르겠지만 그 밑바닥에는 솔직히 말해 반기업정서가 강하게 깔려 있다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누구는 '윤리경영이 기업의 경쟁력'이라 하고,또 누구는 '사회적 책임 경영이 기업의 경쟁력'이라고 한다.
그럴듯한 통계나 사례도 제시한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자칫 기본적인 문제를 간과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윤리경영을 들먹일 정도면,또 사회적 책임을 말할 정도의 기업이면 기업이 존재하는 본질적 이유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일 공산이 크다고 봐야 한다.
이윤도 못내고,고용창출도 못하는 기업이 윤리경영을 강조한다고,또 사회적 책임을 주장한다고 없던 경쟁력이 갑자기 생긴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는 없다는 얘기다.
법도 지키지 못하면서 윤리경영을 주장하고,경제적 책임도 다하지 못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말해야 한다면 그야말로 웃기는 일이 될지 모른다.
'주주중시 경영이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경영이 돼야 한다'는 주장 역시 마찬가지다.
주주중시 경영도 못해 본 기업이 이해관계자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무엇이 기본이고,순서가 어떻게 돼야 하는지를 무시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혼란만 야기할 뿐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과연 어디까지여야 하느냐에 관해서는 물론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윤극대화가 유일한 사회적 책임이라고 말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사회공헌 등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을 주장하는 이도 있다.
전자(前者)는 완전경쟁이라든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國富論) 등을 이론적 출발점으로 삼는 경제학자들이다.
반면 후자(後者)는 현실적으로 완전경쟁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출발한다.
예컨대 독과점이라든지 기업과 소비자간 정보의 차이(정보의 비대칭성) 등을 감안할 때 기업의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 수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사회적 책임밖에 없느냐는 반론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하나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범위를 어떻게 보든 '왜 사회적 책임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접점(接點)이 있다는 사실이다.
사회공헌 등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을 주장하는 이들도 기업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목적이 장기적으로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데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제임스 울펀슨 세계은행 총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단순한 자선 차원이 아니라 기업 자신의 이익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을 수행한다는 필립스 등 외국 기업들이 장기적인 수익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고백 아닌 고백'을 하더라도 하등 이상할게 없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범위가 어떠하든 기업이 존재하는 본질적인 이유와 결코 무관할 수 없음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기 때문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말하는 건 좋다.
하지만 그 범위가 어디까지여야 하는지는 지금 우리 사회가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을 더 절실히 요구하느냐에 달린 문제다.
투자인가,사회공헌 활동인가.
사회공헌 활동이라고 답하는 이들도 그것이 기업의 이윤 극대화와 무관할 수 없다는 점만은 간과하지 마시길….
안현실 논설위원ㆍ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