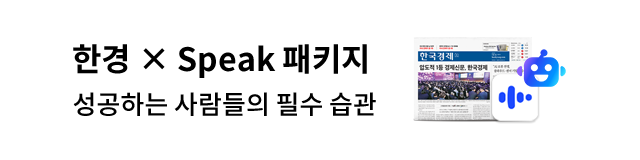미국에서 변호사 출신 최고경영자(CEO)들이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
지배구조 개선 등 기업개혁의 칼바람이 휘몰아치고,다양한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소송 제기가 빈번해지자 미 기업들은 법률 지식으로 무장한 변호사들을 CEO로 적극 영입하고 있다.
비즈니스위크 최근호는 "법적 분쟁이 수시로 발생하는 시대에 변호사 출신 CEO는 기업 입장에서 큰 재산이 되고 있다"며 "미국 S&P500 지수에 편입된 5백개 대기업중 10.8%에 해당하는 54개사가 변호사 출신을 CEO로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혼란스러운 시대엔 변호사 CEO가 안성맞춤=지난 10월 세계 최대 보험중개 회사인 마시앤드맥레넌은 검사 출신 마이클 체르카스키를 CEO로 영입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 회사는 담합 입찰과 부당 수수료 문제로 사법 당국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엘리어트 스피처 뉴욕주 검찰총장의 절친한 직장 친구 체르카스키를 기업 총수로 모셔온 것이다.
판검사를 비롯 변호사 출신 CEO 영입 열풍은 산업 분야를 가리지 않고 확산되는 추세다.
특히 정부 규제가 많은 금융 항공·운수 원자력발전 등의 산업에서는 변호사 출신 CEO가 흔하다.
사법 당국과의 격렬한 분쟁에 휘말렸을 때 충실한 '방패막이' 역할을 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시되는 분위기 속에서 이들 CEO는 법률을 최대한 활용해 주주,고객,종업원,언론,의회 등과의 복잡한 관계를 쉽게 풀어나가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
이들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나 내부 감사 강화 등 기업 개혁에도 적임자라고 미 재계는 보고 있다.
비즈니스위크는 "경영학석사(MBA) 과정이 보편화되기 이전인 20세기 초에는 로스쿨(law school)이 기업 지도자 양성소였다"며 "기업의 신뢰 회복에도 원리원칙을 중시하는 변호사 출신들이 많은 도움을 준다"고 평가했다.
◆변호사 출신이 만능은 아니다=변호사 출신 CEO들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들은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금융 지식이 부족하다는 약점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변호사 출신 CEO들은 회계학이나 재무관리 가정교사를 채용하고,학원강의를 들어가며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다.
리더십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변호사들은 '고독한 예술가'라고 불릴 정도로 혼자 일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다. 대형 인수·합병(M&A)을 성사시킨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10명 내외의 직원을 통솔한 경험밖에 없다.
변호사 출신들은 특히 '자문역'으로서 오랜 기간 활동해 왔기 때문에 실제 행동에 나서는 데는 지극히 보수적 경향이 강하다.
언제나 '위험 회피'에 우선 순위를 두기 때문에 기업간 치열한 경쟁에서 과감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기업금융 전문 업체 수터힐의 제임스 가이드 이사는 "MBA 출신이 대박을 꿈꾸고 있다면 로스쿨 출신은 안정된 연봉을 바라는 사람들"이라며 "불확실성과 마주쳤을 때 대담한 결단을 보여주지 못하는 게 변호사 출신 CEO들의 최대 단점"이라고 말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
- 글자크기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글자행간
-
- 1단계
- 2단계
- 3단계
공유하기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