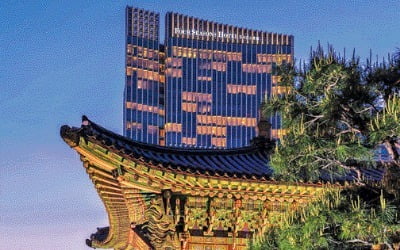[한상춘의 퀴즈경제] 친디아(Chindia)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베이징올림픽이 예정된 해는?
(가) 2006년 (나) 2008년 (다) 2010년 (라) 2012년
[2]지난해 인도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한 비중은?
(가) 15% (나) 25% (다) 35% (라) 45%
[3]올해 중국과 인도간의 예상 교역규모는?
(가) 1백억달러 (나) 1백50억달러 (다) 2백억달러 (라) 2백50억달러
---------------------------------------------------------------------------
지난해 전세계인들 사이에 가장 많이 오르내렸던 경제용어를 하나 꼽으라면 단연 '브릭스(BRICs)'가 떠오른다.
올해에는 어떤 용어가 유행할까.
지금까지 발표된 올해를 예상하는 각종 전망보고서를 총망라해 보면 '친디아(Chindia)'라는 용어가 단연 눈에 띈다.
'친디아'는 영국의 시사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중국(China)과 인도(India)의 머리글자와 끝글자를 따서 만든 합성어다.
대부분 예측기관들은 올해 세계 경제의 지각변동을 일으킬 진원지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상당 기간 세계 경제를 이끌 경제단위로 '친디아'를 꼽고 있다.
경제성장률만 놓고 보면 중국과 인도는 가장 높은 국가군에 속한다.
2003년 이후 2년 연속 중국과 인도 경제는 각각 9%,5%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했다.
올해도 양국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도 중국은 2008년에 예정된 베이징 올림픽을 전후로 유로랜드를,오는 2020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으로 부각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같은 기간 중 인도도 세계 4∼5위의 경제대국으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대부분 전망기관들은 내다보고 있다.
경제력 부상과 비례해 중국과 인도의 국제적인 위상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미 중국과 인도는 사람과 상품,자본의 이동 등으로 파악되는 세계관심도지수로 볼 때 일본과 한국을 제치고 아시아의 양대국으로 부상했다.
2010년 이후에는 영국과 이탈리아 등 일부 유럽국가를 밀어내고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7개국(G7)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목해야 할 것은 1962년 영토분쟁을 계기로 소원했던 양국간의 경제관계도 전쟁 이후 꼭 40년만인 2002년을 계기로 급속히 호전되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 인도를 방문했던 주룽지 중국 총리는 인도인들에게 "당신들은 소프트웨어의 1인자이고 우리는 하드웨어의 1인자다.
이 두가지를 합친다면 세계 최고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발언이 있었던 2002년에는 국제사회에서 허황된 자만(自慢)으로 비춰졌으나 불과 2년이 지난 지금은 빠른 속도로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해와 같은 추세라면 올해에는 양국간의 교역 규모가 1백5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계적으로 중국과 인도는 상호 보완적 경제구조를 가진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중국은 제조업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 서비스 분야는 취약하다.
인도는 그 반대다.
인도 경제의 부흥은 전적으로 서비스 분야에서 비롯되고 있다.
지난해 인도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한 비중은 15%에 불과하다.
재미있는 현상은 중국과 인도,양국 모두가 세계 시장을 하드웨어로 나누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앞으로 상당 기간 경쟁분야 없이 협력할 여지가 많음을 시사한다.
대부분 예측기관들은 양국간의 경제협력 움직임이 올해를 계기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단계까지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런 만큼 '친디아'의 등장은 한국에도 상당히 중요하다.
다행인 것은 양국이 모두 한국식 경제성장 모델을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인도는 한국 기업의 진출이나 한국 제품의 수출면에서 까다로워지고 있는 중국의 대체시장으로 매우 중요하다.
반면 친디아의 등장과 궁극적으로 중화(中華) 경제권,화인(華人) 경제권이 확대 발전될 경우 이들 경제블록이 세계 어느 경제권보다 자급자족적 성격이 강한 점을 감안하면 역외국 중에서는 한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책당국자와 국내 기업들은 '친디아'로 상징되는 중국과 인도간의 경제적 유대관계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올해 대외정책의 핵심과제인 주요 교역국가들과의 FTA 정책을 추진할 때 '친디아'와의 FTA 체결방안도 빼놓지 말고 검토해야 한다.
논설·전문위원 schan@hankyung.com
----------------------------------------------------------------
[ 정답 ] [1](나) [2](가) [3](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