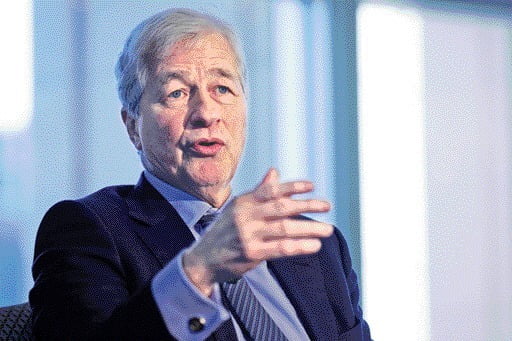[테크노 파워시대] 테크노CEO가 세계경제 이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1세기 세계를 움직이는 힘." 기술(Technology)과 경영(Management)을 겸비한 엔지니어 출신의 경영자 행정가 정치가를 일컫는 "테크노 파워"(Techno Power)의 위상이다.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혁신의 바람 속에서 이공계 출신들이 사회 각계에 변화를 주도할 "엘리트" 그룹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사회.경제 분야에서 테크노 파워의 확산은 단순한 "붐"을 넘어 거센 "흐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회 각 분야에서 드러나고 있는 현상이 이를 증명한다.
기술경영자인 테크노 CEO(최고경영자)들은 이미 산업계 곳곳에 포진,국가 경제를 움직이고 있다.
일류로 도약한 기업치고 뛰어난 테크노 CEO를 보유하지 않은 곳은 별로 없다.
공직사회도 마찬가지다.
이공계 출신 관료인 테크노크라트(Technocrat)들이 전문성으로 무장하고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정계에서도 이공계 출신 의원들이 국가 정치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21세기는 흔히 '기술주도형 사회' 혹은 '혁신주도형 사회'로 불린다.
기술과 스피드가 경제를 지배하고 혁신을 통한 사회 전반의 효율화가 한 국가의 역량을 좌우한다는 의미에서다.
그리고 이 같은 혁신의 중심에서 과학기술 마인드를 가진 테크노 파워가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흐름에 대해 전문가들은 과학기술이 경제발전을 위한 일종의 '도구'에서 사회를 리드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해석한다.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철학을 담은 저서 '초일류로 가는 생각'에서 "과학기술은 산업을 발전시키고 국가와 기업의 흥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역사를 보는 관점 자체가 기술 중심으로 바뀌어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테크노 파워가 주목받는 것은 우선 기술을 아는 전문성 때문이다.
지금은 첨단기술 하나가 기업과 한 나라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시대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세계 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마이크로소프트나 반도체로 한국 경제를 먹여살리는 삼성전자의 경우 독보적인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그리고 이들 기업이 초일류로 성장한 데에는 기술 흐름을 정확히 짚어내 기술과 시장을 연결시킨 걸출한 기술경영자가 있었기 때문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것이 기술경영자가 요구되고 있는 이유다.
테크노 파워는 또 효율성과 창조성을 중시하는 과학기술 마인드로 무장돼 있다는 점에서 기업이나 국가 시스템의 혁신에 최적임자로 꼽힌다.
우리나라를 비롯 선진 각국들이 국가 혁신시스템 구축에 나서면서 그 가장 중심에 과학기술을 두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테크노 파워의 위력은 이미 산업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경련이 지난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50대 기업의 CEO와 임원 중 이공계 출신은 각각 44%와 51%에 달한다.
특히 제조업의 CEO 중 이공계 출신 비율은 68.7%에 이른다.
국내 대표기업인 삼성의 경우 사장단의 40% 이상이,LG의 경우 50% 이상이 이공계 출신 테크노 CEO다.
국내 간판급 테크노 CEO로는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김쌍수 LG전자 부회장,조정남 SK텔레콤 부회장,김동진 현대자동차 부회장,강창오 포스코 사장,이용경 KT 사장,허영섭 녹십자 회장,이상운 효성 사장,변대규 휴맥스 사장,이재웅 다음커뮤니케이션 사장 등을 꼽을 수 있다.
외국에서도 테크노 파워의 활약상은 두드러진다.
제너럴일렉트릭(GE)의 잭 웰치 전 회장은 테크노 CEO의 전형으로 손꼽히며 GE의 제프리 이멜트 회장,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인텔의 크레이그 배럿 회장,오라클의 래리 앨리슨 CEO,시스코시스템즈의 존 챔버스 회장,도요타자동차의 도요다 쇼이치로 명예회장,BMW의 헬무트 판케 회장,닛산의 카를로스 곤 사장,노키아의 요르마 올릴라 회장,딩레이 넷이즈 사장 등은 기술경영으로 세계적 기업을 일궈낸 테크노 CEO들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기술을 잘 아는 전문가이면서도 일찍이 경영에 남다른 관심을 가졌다는 점이다.
세계적인 CEO들 가운데 대학에서 이공계 전공 후 MBA 과정 등을 통해 경영을 배운 인물이 많다는 점은 기술과 경영의 조화로운 접목이 중요함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다.
공직사회에서 이공계 출신들의 등장은 이제 새로운 뉴스거리가 아니다.
행정이나 정치에도 기술 흐름을 아는 전문성이 중요해진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오명 과학기술부총리를 비롯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서울대 전자공학과 출신이며 곽결호 환경부 장관은 영남대 토목공학과를 나왔다.
박기영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은 연세대 생물학과 출신이다.
홍창선·서상기·김명자 의원 등은 국회에서 활약하고 있다.
테크노크라트를 말할 때 중국을 빼놓을 수 없다.
장쩌민 전 주석과 후진타오 주석을 비롯해 우방궈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원자바오 국무원 총리 등이 이공계 출신이다.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9명의 경우 모두가 이공계 대학을 나왔다.
장원락 기자 wrjang@hankyung.com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혁신의 바람 속에서 이공계 출신들이 사회 각계에 변화를 주도할 "엘리트" 그룹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사회.경제 분야에서 테크노 파워의 확산은 단순한 "붐"을 넘어 거센 "흐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회 각 분야에서 드러나고 있는 현상이 이를 증명한다.
기술경영자인 테크노 CEO(최고경영자)들은 이미 산업계 곳곳에 포진,국가 경제를 움직이고 있다.
일류로 도약한 기업치고 뛰어난 테크노 CEO를 보유하지 않은 곳은 별로 없다.
공직사회도 마찬가지다.
이공계 출신 관료인 테크노크라트(Technocrat)들이 전문성으로 무장하고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정계에서도 이공계 출신 의원들이 국가 정치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21세기는 흔히 '기술주도형 사회' 혹은 '혁신주도형 사회'로 불린다.
기술과 스피드가 경제를 지배하고 혁신을 통한 사회 전반의 효율화가 한 국가의 역량을 좌우한다는 의미에서다.
그리고 이 같은 혁신의 중심에서 과학기술 마인드를 가진 테크노 파워가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흐름에 대해 전문가들은 과학기술이 경제발전을 위한 일종의 '도구'에서 사회를 리드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해석한다.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철학을 담은 저서 '초일류로 가는 생각'에서 "과학기술은 산업을 발전시키고 국가와 기업의 흥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역사를 보는 관점 자체가 기술 중심으로 바뀌어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테크노 파워가 주목받는 것은 우선 기술을 아는 전문성 때문이다.
지금은 첨단기술 하나가 기업과 한 나라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시대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세계 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마이크로소프트나 반도체로 한국 경제를 먹여살리는 삼성전자의 경우 독보적인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그리고 이들 기업이 초일류로 성장한 데에는 기술 흐름을 정확히 짚어내 기술과 시장을 연결시킨 걸출한 기술경영자가 있었기 때문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것이 기술경영자가 요구되고 있는 이유다.
테크노 파워는 또 효율성과 창조성을 중시하는 과학기술 마인드로 무장돼 있다는 점에서 기업이나 국가 시스템의 혁신에 최적임자로 꼽힌다.
우리나라를 비롯 선진 각국들이 국가 혁신시스템 구축에 나서면서 그 가장 중심에 과학기술을 두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테크노 파워의 위력은 이미 산업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경련이 지난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50대 기업의 CEO와 임원 중 이공계 출신은 각각 44%와 51%에 달한다.
특히 제조업의 CEO 중 이공계 출신 비율은 68.7%에 이른다.
국내 대표기업인 삼성의 경우 사장단의 40% 이상이,LG의 경우 50% 이상이 이공계 출신 테크노 CEO다.
국내 간판급 테크노 CEO로는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김쌍수 LG전자 부회장,조정남 SK텔레콤 부회장,김동진 현대자동차 부회장,강창오 포스코 사장,이용경 KT 사장,허영섭 녹십자 회장,이상운 효성 사장,변대규 휴맥스 사장,이재웅 다음커뮤니케이션 사장 등을 꼽을 수 있다.
외국에서도 테크노 파워의 활약상은 두드러진다.
제너럴일렉트릭(GE)의 잭 웰치 전 회장은 테크노 CEO의 전형으로 손꼽히며 GE의 제프리 이멜트 회장,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인텔의 크레이그 배럿 회장,오라클의 래리 앨리슨 CEO,시스코시스템즈의 존 챔버스 회장,도요타자동차의 도요다 쇼이치로 명예회장,BMW의 헬무트 판케 회장,닛산의 카를로스 곤 사장,노키아의 요르마 올릴라 회장,딩레이 넷이즈 사장 등은 기술경영으로 세계적 기업을 일궈낸 테크노 CEO들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기술을 잘 아는 전문가이면서도 일찍이 경영에 남다른 관심을 가졌다는 점이다.
세계적인 CEO들 가운데 대학에서 이공계 전공 후 MBA 과정 등을 통해 경영을 배운 인물이 많다는 점은 기술과 경영의 조화로운 접목이 중요함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다.
공직사회에서 이공계 출신들의 등장은 이제 새로운 뉴스거리가 아니다.
행정이나 정치에도 기술 흐름을 아는 전문성이 중요해진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오명 과학기술부총리를 비롯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서울대 전자공학과 출신이며 곽결호 환경부 장관은 영남대 토목공학과를 나왔다.
박기영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은 연세대 생물학과 출신이다.
홍창선·서상기·김명자 의원 등은 국회에서 활약하고 있다.
테크노크라트를 말할 때 중국을 빼놓을 수 없다.
장쩌민 전 주석과 후진타오 주석을 비롯해 우방궈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원자바오 국무원 총리 등이 이공계 출신이다.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9명의 경우 모두가 이공계 대학을 나왔다.
장원락 기자 wrjang@hankyung.com
![[속보] 일본은행, 기준금리 0.5%로 인상](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1.39313506.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