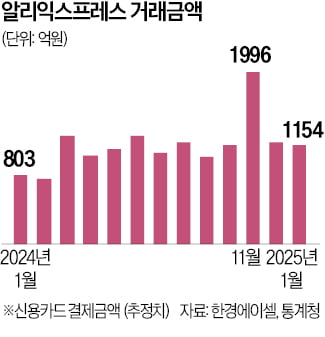[차이나 버블 경고등] (중) 재정풀어 성장률 높이기 부작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주룽지(朱鎔基)총리의 중국 판 뉴딜정책이 불러온 후폭풍인가." '세계 공장'이라는 중국의 경제 현안을 분석하면서 갖게 되는 의문이다.
중국경제의 여러 문제점이 주 총리 시기 단행됐던 확대재정 정책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은 이렇다.
중국은 지난 92년 덩샤오핑(鄧小平)의 남순강화(南巡講話) 발표를 계기로 과열투자 시기로 진입하게 된다.
92년에서 95년 사이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연 평균 무려 36%에 달했다.
지난 89년 톈안먼(天安門)사태이후 움츠러들었던 기업들의 투자욕구가 분출한 것이다.
게다가 90년대 초부터 외국투자가 중국으로 밀려 들어왔다.
당시 건설됐던 공장들은 90년대 후반 들어 제품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소비는 한정되어 있었다.
시장에 물품이 넘쳐나면서 내수시장은 디플레 현상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위축됐다.
지금도 중국 주요 상품 6백개 중 90%가 공급과잉 상태다.
주 총리가 선택한 것은 재정자금을 푸는 것이다.
98년이후 매년 약 1천억위안의 건설국채를 발행,내수살리기에 나섰다.
그렇게 풀린 돈이 작년까지 8천억위안을 넘는다.
덕택에 중국경제는 아시아금융위기 속에서도 '독야청청',8%안팎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풀린 돈은 고스란히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국이 공사장'으로 변하면서 철강 시멘트 비철금속 등의 가격이 올랐고,이는 곧 이 분야의 과열투자를 불렀다.
건설경기 호황은 부동산시장 버블로 이어지기도 했다.
2003∼2004년 중국경제가 경험했던 일이다.
이 과정에서 경제는 '투자의존형 성장'패턴으로 굳어졌다.
소비 투자 순수출 등으로 구성된 국내총생산(GDP) 구조를 보면 명확하다.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투자 비율은 40%가 넘는다.
세계 평균 22∼23%의 두 배에 가까운 비율이다.
반면 소비 비율은 55% 로 세계 평균 70%에 턱없이 모자란다.
결국 지난 10여년간 투자가 중국경제를 먹여 살렸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