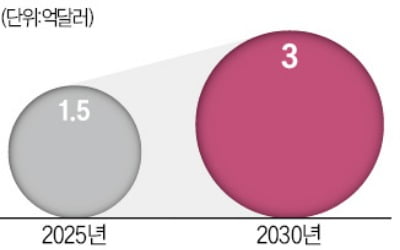[권영설의 '경영 업그레이드'] 혁신가가 되려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혁신의 궁극적 목표는 조직 구성원 개인마다 혁신가가 되는 일이다. 거창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마음가짐에 달린 것임을 알면 길이 쉽게 보인다. 사례 몇 가지가 있다. 먼저 월급쟁이 케이스. 자기가 평범한 사원감인지 아니면 장래 사장감인지를 진단하려면 평소에 달력의 어떤 날을 기다리는지 보면 된다. 월급쟁이는 빨간 날 즉 휴일을 기다리지만 장래 사장감은 까만 날 즉 평일을 기다린다. 일에서 벗어나는 휴일을 좋아하는가,아니면 고객이 움직이고 시장이 열리는 평일을 좋아하는가. 그런 차이를 남들이 느낄 정도가 되면 한 사람의 직장 인생 판도가 바뀐다.
두번째는 건달 이야기. 건달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제일 낮은 급수부터 보면 양아치,깡패,조폭,큰형님이다. 묘한 것은 이 네 종류의 건달들끼리 실제로 주먹을 겨루면 그 '실력'의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는 점이다. 그럼 왜 이런 급수의 차이가 날까. 바로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다. 스스로를 '양아치'로 생각하는 사람은 고등학교 때부터 동네 초등학생들의 코묻은 돈을 뜯어왔고 자신을 큰형님으로 생각하는 친구는 어린 시절부터 행동 하나, 말 하나에 조심하며 '폼' 잡고 살아온 차이다.
마지막으로 청년,중년,노인도 나이가 아니라 그들이 하는 말로 구별된다. 과거를 얘기하면 노인이요, 현재를 말하면 중년이며 미래를 꿈꾸면 그가 바로 청년이다. 대학생이 "중학교 때는 내가 공부로 날렸는데…" 하는 식의 얘기를 입에 달고 살면 그는 내일이 없는 노인이다. 여든이 됐어도 "5년 뒤에는 중국에 팔리는 휴대폰이 5억개는 될 텐데…" 하며 사업계획을 키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청년인 것이다.
이렇듯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느냐에 따라 혁신가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라는 물음이 모든 혁신의 출발점이다.
세계적 디자이너인 김영세 이노디자인 사장은 "일반인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경우 찾다가 없으면 포기하고 혁신가는 찾다가 없으면 자기 혼자 쓰기 위해서라도 만드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일본 품질혁명에 불을 댕긴 미국의 통계학자 에드워즈 데밍은 "소비자는 아무 것도 모른다. 누가 에디슨에게 전구를 발명해 달라고 했던가?"고 물은 적도 있다. 혁신가가 만들어서 세상에 던지고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그러니 스스로 물어볼 일이다. 나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 꼭 발명처럼 거창한 것을 떠올릴 필요도 없다. "왜 시골 사람들이 2~3시간씩 차를 타고 도시까지 쇼핑하러 나와야 할까?"를 물었던 사람이 바로 월마트의 창업자 샘 월튼이다. 그가 만든 첫 월마트는 인구 5000명이 채 안되는 고향 마을에 세워졌다. "왜 사람들은 직접 컴퓨터회사에 주문하면 되지 중간 판매상을 통해 사야 하는가?"고 물었던 질문이 바로 세계 최대의 컴퓨터회사 델을 만들었다. "지금 필요한 데도 세상에 없는 서비스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평소부터 갖는 훈련을 하는 것이 좋다.
보통의 경우는 어떤가. 혁신이든 개혁이든 변화든 싫어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잃을까봐,변화에 따른 피해자가 될까봐 그런 것이다. 세미나 등에 초청받아 가보면 참석자들의 상당수가 그 자리에 끌려나왔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려울 때가 여전히 많다.
혁신가가 되려는 사람들까지도 의욕이 꺾이는 일이 생길까 두려울 정도다. 하기야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이 혁신가의 길이라면 오히려 지금이 혁신가들이 많이 나오기 좋은 풍토인 것도 같다.
?? 가치혁신연구소장 yskw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