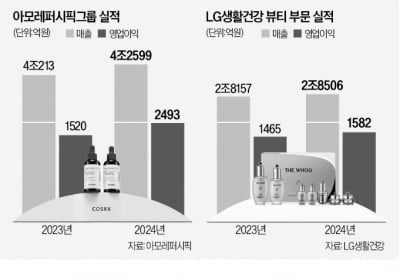[대우패망 재조명] (2) 김우중의 카리스마..개척자인가 독재자인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우패망과 관련한 여러 의문 가운데 하나는 1997년 말 위환위기가 터진 뒤 김우중 전 대우 회장과 경영진들이 지혜를 모아 적절히 대처했다면 대우가 살아날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다.
지난 일을 가정해본다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일이지만 대우맨들 사이엔 외환위기 직후 서둘러 자구노력에 나섰더라면 그룹 해체라는 최악의 상황만은 모면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외환위기가 터지고 모든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나섰지만 대우만은 소극적이었다.
금융사들이 발빠르게 자금 회수에 들어갔지만 대우는 1년 넘게 대책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1998년 하반기 들어 대우 주력 계열사 사장들은 빚을 돌려막느라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였다.
이런 상황은 물론 김 회장에게도 보고됐다.
하지만 그 때마다 김 회장은 "알았다.
잘 될 거다"라는 반응만을 보였다.
전문경영인들은 뭔가 손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카리스마가 강한 김 회장의 말에 토를 달 수 없었다.
김 회장의 경영스타일은 늘 이런 식이었다.
모든 사항을 자신이 결정했다.
당연히 회장 결제를 받기 위한 줄은 길어졌다.
동유럽 진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소리에도 김 회장은 귀를 닫았다.
김 회장과 논쟁을 벌여 이길 수 있는 전문경영인은 없었다.
대우 주요 계열사 CEO들이 검찰 조사에서 모든 것이 김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답한 것도 대우의 의사 결정이 김 회장 단독에 의해 이뤄졌기 때문이었다.
1999년 들어 김 회장 측근인 장병주 전 ㈜대우(현 대우인터내셔널) 사장과 추호석 전 대우중공업 사장 등이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역설했다.
"서둘러 구조조정을 추진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위기감도 전달했다.
김 회장은 이 때도 외환위기 국면만 벗어나면 '대우호'는 다시 순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해 6월 김 회장의 안일한 현실 인식에 항의라도 하듯,대우 사장단 전원은 사표를 제출했다.
시장과 금융당국에서 대우 목을 죄어 오는 상황에서도 김 회장은 "GM에 자동차 사업을 넘겨 50억달러가 유입되면 자금 문제가 일거에 해결된다"는 말만 거듭했다.
겨우 양해각서를 맺은 단계에서 김 회장이 GM에 거는 기대는 너무 컸다.
가격을 후려치려는 GM과의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김 회장은 1999년 7월 들어서야 자구 노력에 나섰다.
자신의 재산도 모두 담보로 내놓았다.
그러나 때는 늦었다.
금융 당국은 채권단과 대우를 워크아웃에 넣기로 의견을 모아갔다.
김 회장은 뒤늦게 권력 실세 등에 도움을 요청하지만 반응이 없었다.
한번 상황이 꼬이자 모든 게 대우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독선과 아집에 빠진 김 회장은 세상이 변한 것을 너무 늦게 알았던 것이다.
역설적인 얘기지만 김 회장의 '뚝심 있는 독선'은 빠른 성장의 밑거름이기도 했다.
부실 기업을 과감하게 인수해 정상화시킬 수 있는 힘도 여기서 나왔다.
1973년 영진토건을 인수해 건설업에 뛰어들고 1976년에는 한국기계를 흡수해 대우조선과 묶어 대우중공업을 만들었다.
1983년에는 동양증권과 삼보증권을 사들여 대우증권으로 금융사업에 나선다.
인수 과정에서 타당성 검토는 물론 자금 계획까지 김 회장 스스로 결정했다.
다른 재벌 총수와 비교해 금융과 해외영업에서 남다른 수완을 발휘했다.
정치적 감각도 탁월했다.
시련은 뚫고,역경은 딛고 서면 된다고 생각한 풍운아였다.
그런 기질 덕분에 1980년과 1985년 두 차례에 걸친 유동성 위기 때도 정권 실세를 움직여 자금지원을 끌어낼 수 있었다.
항상 성공의 길을 달려온 김 회장은 타고난 낙천적 성격에 자신감까지 더해져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도 반드시 있다'는 신념을 얻기에 이른다.
김 회장의 경영스타일이 대우 성장의 원동력이었지만 환란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선 오히려 지속가능 경영의 걸림돌이 되고 말았던 셈이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
!["기재부 덕분에 빌딩 올렸죠"…세종 인쇄소의 위엄 [관가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502/01.38303859.3.jpg)